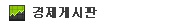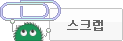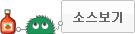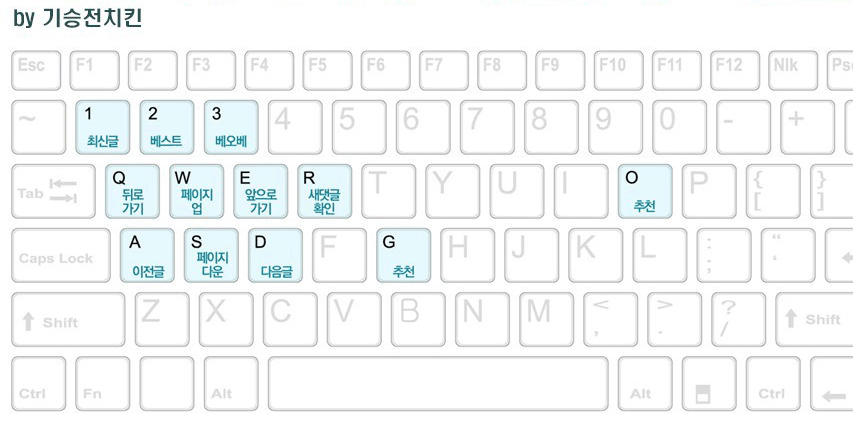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105060108424?RIGHT_REPLY=R18 한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은 정말 유별나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통계는 언제나 독보적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가치를 모두 합치면 국내 총생산(GDP)의 4.1배나 된다. 이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가치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부동산 버블을 겪었던 일본은 이 비율이 2.4배로 떨어졌고, 부동산 버블로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미국의 경우 1.2배에 불과하다. 결국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독보적으로 비싼 나라는 한국이다.
이같은 통계에 대해 부동산 불패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전혀 없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인구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의 총 토지가치는 국내총생산의 1.6배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인구밀도가 전세계 193개국 가운데 191위로 세계 최하위권인 호주의 경우 토지가치 총액이 일본보다도 높은 2.5배나 된다.
이렇게 토지자산이 과대평가된 덕분에 한국인들은 자신이 번 돈에 비해 과분한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GDP대비 국민 순자산 비율은 무려 7.7배로 세계에서 가장 절약하는 나라인 일본의 6.4배는 물론, 캐나다의 3.5배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오른 탓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실제로 2000년대 선진국에 나가본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대가없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더구나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은 버블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버블이 터졌을 때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한국인이 번 돈보다 더 부자가 된 이유
우리가 번 돈에 비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투자의 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패'라는 위험한 믿음을 심어준 '폰지 사기극(Ponzi Scheme)'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중략)
수요가 사라진 부동산에 미래는 없다
그 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경제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용연한이 있는 다른 재화들은 모두 감가상각이 적용되지만, 아파트는 오히려 오래된 집이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이 수십 년 계속되자 한 번 오른 부동산 가격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의 믿음까지 생겨났다.
2000년 중반까지 집값이 치솟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을 사는 나이 대인 25~49세인 핵심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핵심생산가능 인구는 1980년 1173만 명에서 2005년 1993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집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났고, '부동산 불패'라는 착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집값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진데다 그나마 성장의 과실을 모두 기업이 독차지한 탓에,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07년 이후 5년 동안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2.3%나 감소하였다. 더구나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결국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소득과 인구가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중략)
폰지 사기를 닮은 부동산 부양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 전체에 비상이 걸린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 임기만 피하고 보자'는 님티(NIMTE; Not In My Term)의 유혹에 빠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폰지 사기극을 벌이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도 바로 이런 위험한 도박 속에서 탄생하였다. 2000년 IT버블이 붕괴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단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6.5%에서 1.25%로 끌어내렸다. 이에 대해 거품 경제를 우려한 경제학자들이 2003년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미국 연준은 이를 비웃듯 금리를 1%로 내려버렸다.
이렇게 금리를 낮추자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부동산 투자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웬만한 중산층까지 거의 다 집을 소유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집을 사줄 신규 수요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자신이 후원하는 보증업체(페니메이와 프레디맥)를 총동원하여 신용이 부족해 집을 사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에 보증을 서서 집을 사도록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모두 집을 갖는 사회(Ownership society)'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며, 집을 살 때 먼저 집값의 일정액을 내는 선수금(Down payment)제도까지 철폐해 버렸다. 덕분에 당장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서민들이 빌린 돈만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정책을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서민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집값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폰지 사기극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까지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인 뒤에는 더 이상 미국에서 폰지 사기극에 끌어들일 새로운 수요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한 순간에 사라지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금융위기의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다. 그리고 폰지 사기극의 특성상 가장 마지막에 뛰어든 저소득층이 가장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산 탓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진정한 부동산 부양책은 폰지 사기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양책이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의 마지막 폰지 사기가 주로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바로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성세대가 줄어들자 청년들에게 장기 저리 집값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자칫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