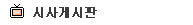김주하가 말하는 '김주하 팬덤현상'
[한국일보 2004-09-15 19:00]
"사생활보단 일로 평가받고 싶어요"
"계순희 선수 인터뷰 논란은 억울
결혼해도 앵커로 남고 싶어"
“김주하씨는 문화 권력자다.” 얼마 전 한 인터넷 논객이 MBC ‘뉴스데스크’ 김주하(31) 앵커에 관해 쓴 글이 논란을 불렀다.
아테네 올림픽 당시 북한 유도선수 계순희를 인터뷰한 김씨의 질문 내용을 비판했다가 일부 네티즌의 뭇매를 맞은 이 논객은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파를 타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젊은 여성들은 그녀를 선망하고,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그녀의 능력과 미모에 빠져있는” 현상을 두고 이렇게 규정했다.
‘문화 권력자’란 거친 표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지적한 ‘현상’만큼은 사실이다. 9시뉴스 앵커가 ‘가장 닮고 싶은 여성’으로 꼽히는 것이야 1990년대 백지연씨 이래 계속돼온 일이지만, 김씨를 둘러싼 팬덤 현상은 좀더 극성스럽다. 최근에는 아나운서에서 기자로의 전직, 갑작스레 알려진 결혼(10월9일) 소식 등으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흥미로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14일 저녁, 뉴스 진행을 위한 분장을 막 마친 김씨는 무척 피곤해 보였다. 6월부터 영등포 경찰서 등을 맡은 ‘사건기자’로 뛰고 있는 그녀는 새벽부터 현장을 누비고 밤에는 뉴스 진행과 준비, 기사 작성에 매달리느라 많아야 하루 4시간, 적게는 2시간밖에 자지 못한단다.
연예인 못지않은 팬덤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거 좋은 얘기 아니죠”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왜 그렇게 제게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기자들도 작품과 연기로 주목 받아야지 ‘누가 뭐 했대’ 식으로 뉴스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어렵게 취재한 뉴스가 나갔을 때 참 잘했다, 고생 많았겠다,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요.”
김씨는 팬 카페에 가끔 들러 뉴스 모니터 글을 챙겨보지만 개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사양한다면서 “그런 분들, 훌륭한 네티즌은 아니죠”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계순희 인터뷰 논란으로 적잖이 마음고생을 한 듯 했다. “계 선수를 좋아하는 남한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봤느냐”고 물었다가, ‘북한 실정도 모르는 무례한 질문’이라는 비난을 들은 것.
“실수한 거 아니에요. 북한 선수단을 취재해보니 ‘우리도 인터넷 다 한다’고 하더군요. 꼼꼼히 준비해서 질문한 건데, 욕을 먹어 황당했죠. 비판 기사 쓰려면 제게 한 번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기사의 기본은 정확한 사실 확인 아닌가요.”
입사 4년차인 2000년 10월 ‘뉴스데스크’ 앵커로 발탁된 김씨는 편집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앵커 멘트를 직접 쓰고 예고편 제작을 전담하는 등 열의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로 40대 중견 기자들이 맡는 남성 앵커와 달리, 젊고 예쁜 아나운서 차지였던 여성 앵커를 ‘꽃’에 비유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새벽부터 뛰느라 잠도 못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요. 꽃으로 남겠다면 1시간이라도 더 자고 마사지도 받고 그랬겠죠.”
여성 아나운서의 앵커 발탁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도 “앵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방송진행 능력이지 취재 능력이 아니다”며 “방송을 잘 하는가는 제쳐두고 외모와 나이만 따지는 것 자체가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의 뉴스 진행 원칙 1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전달하는 것”. KBS에 비해 시청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뉴스데스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일각의 편향성 비판에 대해서도 “치우쳤다기보다는 시대를 앞서간다고 생각한다. 더러 정치권 등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도 시청률을 의식해 피해가지 않고 정도를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최윤영 아나운서가 김씨와 하루 차이로 결혼하게 되자, 앵커 교체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예외도 있지만, ‘유부녀 앵커’가 아직은 낯선 까닭이다.
그녀는 “윗분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서 “힘들겠지만 (예비남편이) 많이 도와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녀가 깔끔한 진행 솜씨에 취재 능력까지 두루 갖춘 유능한 앵커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희정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