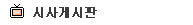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회사 소유 시설 사용, 학자금 등 복지 개선에 관해 단체협상에서 함께 제시해보자고 수년 째 정규직 노조에 이야기해도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란 여덟 글자로 올라갈 뿐이에요. 결국 실현되는 건 아무 것도 없죠.”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A씨) “노조가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 만도 사측에게 온전히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거기까지 신경 써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대기업 노조 임원 출신 B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에 하나 둘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영자들의 전향적 자세가 가장 먼저 요구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내부의 벽’이 있다.
노동자들 권리 신장의 선봉에 서왔지만 이제는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한 특권 계층이 돼버린 ‘노동조합’이다. 30년 전인 1987년 6ㆍ10 민주항쟁의 바람을 타고 현재의 기틀을 잡은 노조운동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규직 노조에 대해 가장 벽을 느끼는 것은 더 이상 사측이 아니라, 그들보다 하위계층으로 굳어진 비정규직이다. 지방의 한 대기업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C씨는 공장 밖 주차장에 차를 대고 회사로 걸어서 출근한다.
공장 내 주차장은 오직 정규직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C씨는 “차 댈 곳이 부족해 공장 인근에 차를 대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동료들이 허다하다”며 “하청업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처우 개선 문제들은 정규직 노조와 함께 제기하고 싶지만 노조 측은 하청은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고 선을 그어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린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매달 모여 사측에 건의할 사항 등을 논의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화됐다. 기아차노조가 지난 4월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하는 총투표를 강행하고 분리를 확정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하상수 기아차노조 전 위원장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 주체로서 둘 다 같은 노동자”라며 “특히 비정규직은 사측의 탄압을 저지하고 권리를 높이기 위해 정규직과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
약자 코스프레, 노조의 탈을 뒤집어 쓴 적폐들도 뚝배기를 깨버려야 제 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