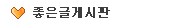***
그대에게 드리는 꿈
4. 쥐새끼들(2)
그러나 우리나라가 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을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후에 그 나라들에게 주권을 침해받게 될 개연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주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외교만이 독립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성만이 너무 싫었다.
북경까지는 하루 반이 걸렸다. 출발하면서부터 그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 뻬이징 박에게 들러야 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구실을 떠올렸다. 이시이가 4일 후에 왜국에서 돌아온다고 했으니 시간 여유는 있었다. 리덩칭에게 접선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가방을 들고 내릴 채비를 했다. 샤오가 의아해했다.
“볼일이 있소.”
“무슨 볼일인데요?”
“여자는 알 필요가 없는 일이오.”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리고 지금 임무 중이란 걸 잊었나요?”
“이 일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알고 내리시오.”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아직 4일이나 남아 있소.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잔다고 해도 일정에 아무런 지장도 없소.”
9월이 중순으로 접어들었다고는 해도 햇볕이 내리퍼붓는 오후라 살갗이 따끔거릴 정도로 더웠다. 땡볕이 머리를 뜨겁게 하는 역 광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여사로 들어갔다. 해가 빠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대낮이라고 해도 여자와 단둘이 한방에서 지낸다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더욱이 그녀는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내내 자는 척했다. OSS대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강성종은 군인이었다. 병적엔 전사로 처리됐지만 엄연히 광복군 장교였다. 한인애국단의 단원이 되고부터 군인이었던 것이다. 그 자신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왜놈들과 전쟁 중이었다. 전시의 군인이 긴장을 푼다는 것은 죽음과 포옹하는 것이었다. 여자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도 한참 지나서야 어둠살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제법 깊어지자 그는 홍등가로 향했다. 짐작했던 대로 그녀가 미행을 했다.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더라도 예정에 없던 행동을 하니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만약 그가 변심이라도 한다면 그녀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홍등가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노려보았다. 보수를 여자들에게 다 뿌려 버리는 것으로 소문난 그였다. 한 여자와 방으로 들어간 그는 샤오가 여사까지 돌아갔을 시간이 돼서 나왔다.
정해진 거처가 없는 뻬이징 박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박은 북경 뒷골목을 한 손에 움켜 쥔 무뢰배 도꼭지답게 유흥가 어디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술집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쉬운 방법이 있었다. 지체 없이 제일 큰 술집으로 들어갔다. 큰 술집이라면 무뢰배를 쓰기 마련이었고, 중국인이든 왜나라 낭인이든 북경의 무뢰배들은 전부 뻬이징 박의 똘마니들이라 할 수 있었다. 문을 지키는 사내에게 말했다.
“...... 고향에서 여섯째 형님이 왔다고 전해주시오!”
‘고향에서 온 여섯째 형님’은 그가 박을 찾을 때 쓰는 암호였다. 한참 후, 박이 헐레벌떡 뛰어와 고개를 꾸벅였다.
“아이고, 형님 왔소?”
“그래, 아우님은 그동안 잘 지냈나?”
“나야 늘 좋지요.”
둘은 악수를 하고 어둠침침한 방에 자리를 잡았다.
“아우님이 이번에 중경으로 누구를 한번 보내야 되겠네. 고생 좀 해주게.”
목소리를 낮춘 그가 품에서 돈과 최근의 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든 봉투를 꺼내 박에게 건넸다.
돈은 몇 달간 아껴서 모은 것이었다. OSS에서도 최고의 보수를 받는 그였다. 그 돈이면 임정에 적게나마 보탬이 될 터였다. 거기에 자신이 곧 경성으로 가게 될 거라는 소식도 보탰다.
뻬이징 박은 그를 만난 뒤부터 임정의 연락책이 됐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연락책이었다. 북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무뢰배인 박은 의심을 피하기에 그만이었다. 임정에 적지 않은 자금도 대오고 있었다. 공개 대결에서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져줌으로써 체면을 한껏 살려준 후로 박은 두 살이 많은 그를 깎듯이 형님으로 모시고, 죽기 살기로 따르는 것이었다.
잽싸게 봉투를 품에 넣은 박이 은근하게 물었다.
“왜국 영사관, 그거 형님이 한 거 아니오?”
대답 대신 그가 빙그레 웃었다. 박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다.
“역시 우리 형님은 최고야. 왜놈의 새끼들 정신이 없었겠구만. 찢어죽일 놈들!”
“곧 망하게 될 놈들이니 그렇게 미워하지는 말게.”
“그건 맞는 말이오.”
둘은 껄껄거리며 웃었다. 얼마 되지 않는 논밭마저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만주로 강제이주 당한 집의 자식인 박도 왜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다.
“형님도 들었수, 건국연맹 이야기?”
“건국연맹이라니?”
“아직 못 들었구랴. 몽양 선생님이 국내의 독립운동가들 전부를 모으는 일을 착수했다고 그럽니다. 임정의 한 조직으로 말이오. 김인수 형님이 중경에 갔다가 여기 들렀습디다.”
“그게 정말인가?”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그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독립운동조직들의 완전한 통합은 김구의 꿈이자 임정의 목표였다. 여운형이 나섰다면 그건 싹이 아니라 이미 잎을 피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기다 형님과 주석 각하가 여망하는 무장투쟁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하오. 임정은 국외 조직의 통합에 나설 거라고 합디다. 왜놈들이 항복하기 전에 국내와 만주에서 동시에 봉기하고 진공할 계획이랍니다. 잘 된 일이지요?”
“그럼, 잘 된 일이고 말고.”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뻤다. 서로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둘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해방의 기쁨에 출렁이는 태극기 물결이 아른거렸다. 이제 곧 국내로 들어가면 미약하나마 자신의 힘이 무장투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었다. 아니, 큰 힘이 될 수도 있었다. 임정과 건국연맹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그랬다. 그리고 OSS의 자금도 얼마간 쓸 수 있을 것이니 더 좋았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둘은 밤을 새우 다시피 했다.
샤오는 밤이 새도록 자지 못하고 있었다. 불안도 했고, 분하기도 했다. 그를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자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 그런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 자신을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흥, 볼일이 있다더니 고작 그런 여자들에게 가는 거였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오? 미행을 했었소? 사실은 술도 마셨소.”
아침에야 여사에 들어간 그는 예상대로 화가 잔뜩 난 그녀를 보면서 남아 있는 술기운을 빌어 능청을 떨었다.
“그대로 보고할 거예요!”
“보고하시오. 누가 겁낼 줄 아시오? 아직도 임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모르시오?”
주먹을 쥐고 파르르 떠는 그녀를 보며 미안한 마음을 떨쳐 버려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코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녀가 자신에게 가진 감정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리라 마음먹었다.
“임무를 위해서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소! 당신때문에 욕구가 생겼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소?”
사람도 예사로 죽이는 첩보원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여자였다. 이 대목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다.
“생겨버린 욕구는 해소해야 되지 않겠소?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말이오.”
능청스럽게 웃고 있는 그에게 그녀는 할말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크게 싸운 부부처럼 해서 열차에 올랐다. 어쩔 수 없이 같은 자리에 앉긴 했으나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갑자기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당황한 그는 귓속말로 화를 냈다.
“아니, 임무를 잊은 거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뭣 때문에 이러는 거요?”
“당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낮지만 앙칼진 그녀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 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잠이 막 들려고 하는 그를 그녀가 거칠게 흔들었다. 얼굴에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