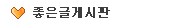한동안 잠잠한가 싶더니 며칠 전 한국방송에서 또 한 편의 ‘검사’ 드라마를 시작했다. 검사를 우려먹다 못해 이번에는 검사와 여고생의 결혼 이야기란다. 신파극 ‘검사와 여선생’에서 시작된 유구한 ‘검사’ 드라마의 전통이 마침내 ‘검사와 여고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안 봐도 뻔하다, 이번 드라마에 등장하는 젊은이도 분명히 권총 들고 직접 범인을 잡으러 다니며, 각종 격투기와 검도에 능한 ‘엘리트 검사’일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강력계 형사의 몫이지 강력부 검사의 역할은 아니건만, 드라마에서는 줄기차게 이런 이상한 ‘엘리트 검사’들만 그려댄다. 법조계에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데 유독 검사만 ‘드라마의 꽃’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폼 나니까! 평범한 사람이 한 순간에 권력을 틀어쥐는 ‘인생 역전’을 그리는데 검사만큼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다른 권력자들과 달리 검사는 젊기까지 해서 예쁜 주인공과 연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업무와 상관없이 허구한 날 연애만 할 것이 분명한 주인공 직업을 굳이 검사로 고정시킨 ‘엘리트’ 작가들의 게으름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야 이상한 것이 어디 엘리트주의에 찌든 ‘검사’ 드라마뿐이랴.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바로 기억상실증이 되고, 심심하면 불치병도 걸린다. 세상에 가득 찬 것은 이복 남매뿐이고 그 이복 남매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랑에 빠지고야 만다. 이복 남매가 있으니 지옥에서도 찾기 힘들 악독한 새어머니와 이복 자매가 등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드라마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귀한 사건들로 가득 찬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검사가 안 나온 것만 해도 신선하고, 깡패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역사왜곡도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위해야 할까.
정말이지 나는 이제 검사, 깡패, 재벌 자녀, 이복 남매, 불치병, 불륜 말고 다른 소재를 다룬 드라마도 좀 보고 싶다. 내 주변의 법조계만 둘러봐도 좋은 소재는 얼마든지 있다. 김병로, 이인, 허헌 같은 일제 시대의 3총사 항일 변호사 이야기도 좋고, 황인철, 조준희, 이돈명, 홍성우 같은 70년대의 4인방 인권 변호사 이야기도 좋다. 집단소송의 효시가 된 80년대 망원동 수재사건의 조영래 변호사 한 명만 모델로 해도 드라마 열 편은 만들 수 있다. 이게 너무 옛날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성매매를 강요당한 필리핀 출신 여성들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이상희나 장애인 인권운동에 열심인 안선영, 박종운처럼 아예 새로운 세대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괜찮다. 한 달에 80만원씩 받아가며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시민단체 간사들이나,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정신지체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공회 신부 유찬호와 다큐멘터리 감독 류미례 부부의 만남 이야기 등도 멋진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웃을 위한 이들의 삶은 똥 폼 잡는 ‘엘리트’ 검사 이야기보다 훨씬 깊은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인상 쓰고 구호만 외치는 걸로 이들의 이미지를 고정시키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것도 나의 바람이다. 드라마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려지는 운동권 출신들의 지나치게 엄숙한 얼굴을 참아주는데 시청자도 지쳤을 뿐 아니라, 그런 선입견은 지난 시절 살벌한 현실 속에서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던 운동가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잘 만든 한 편의 드라마는 <인물 현대사>,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모두 합친 것 이상의 영향력을 갖는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멋진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이 나만의 소망이 아닌 이상, 좋은 소재를 발굴하여 잘 꾸미기만 한다면 시청률에서도 실패할 리 없다. 그러니 제발 드라마 좋아한다는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부터 솔선하여 피디와 작가들에게 책 사 볼 돈을 넉넉히 지급하라.
취재하고 책 살 돈이 얼마나 부족하면 매번 그런 똑같은 드라마들만 만들겠는가 김두식/한동대 교수, 변호사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