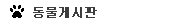물론 제 눈에는 세상에 둘밖에 없는 예쁜 내 새끼들이지만 내새끼들의 장단점을 확실히 직시해야 좋은
집사및 호구 주인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는 시도때도 없이 기대고 비비고 즈려밟고 올라오는 애교 만점 개냥이에, 다른 한 마리는 새침하고 우아한 도도냥이라고 쉴드를 쳐도, 그들에겐 고양이 키우기의 로망인 무릎앉기를 제발 물려달라 청하게 만드는 가공할 몸무게와 모든 아기냥이들은 예쁘다는 만고의 법칙을 과감히 깨부신 흑역사가 있는 것을요.
첫째 도이를 입양한 건 약 4년 전. 가끔 동게에 5-6키로 나가는 귀여운 사이즈의 냥이들을 뚱땡이라 칭하시는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저는 여자 몸무게가 50키로 넘으면 돼지라는 소릴 들을 때와 비슷한 혼란을 느낍니다. 5-6 키로라니! 그 정도면 표준 사이즈 아닌가요? 품에 쏙 들어가지 않나요?

첫째 도이. 몸무게 11키로의 위엄을 자랑합니다. 무릎에 올라오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다리저림은 둘째 치고 무릎에 온전히 올라앉지 못하는 비운의 고양입니다. 엉덩이를 안착시키면 앞다리가 삐져나오고 가슴팍을 내려놓으면 엉덩이가 삐져나오는 퀄리티의 체구를 가졌습니다.

바다 코끼리 아닙니다. 고양이 맞습니다.

필살 발라당을 시전했는데도 예쁘다 쓰담쓰담 해 주지 않으면 저런 불만스런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나 제가 멀쩡한 고양이를 데려다가 저런 털난 해양생물로 만든게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변명하자면, 도이는 3살 때 제가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때도 10키로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정말 애교 넘치고 사람을 따르는 모습에 반해 데려왔구요. 지난 2년간 밥을 제 그릇에 주지 못 하고 정량보다 약간 적은 양을 쫓아가며 굴려야 몇알 씩 나오는 간식공에 넣어 먹일 정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은 워낙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안 빠지더라구요. 놀아주려고 하면 귀찮은 거 시킨다고 자리를 피합니다;; 사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제외하고는 도이의 외양에 불만은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고양이들이 너무 작아 보일 정도로 적응한 걸요. 그리고 도이도 지난 4년간 가벼운 감기 두 번 빼고는 앓은 적 없이 건강합니다.
첫째를 성묘일 때 데려온 터라 제겐 꼬물꼬물한 아기냥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 고양이를 둘째로 데려오게 됩니다. 거기 있던 고양이들 중 제일 못 생기고,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바싹 마른데다, 털길이도 들쑥날쑥에, 서구권에서는 재수없다는 미신이 팽배해 입양이 잘 안 되는 검은 고양이를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아기 고양이라고 해서 심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넓고, 그 세상 어딘가엔 못.생.긴. 아기냥이가 존재합니다.

둘째 케이. 처음 데려왔을 때 사진입니다. 다들 예쁜 어린시절 사진을 많이 찍어두라고 하시는데, 케이는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아쉽네요. 물론 못생겨서 안 찍은 건 아니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아깽이 시절이 지나갔다고 할까요.

거묘 첫째와의 비교샷.

다행이 첫째가 둘째를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오히려 첫날부터 '아저씨가 사탕줄까?'모드로 들이대는 첫째에게 둘째가 하악질하느라 바빴지요.

손바닥 위에 올라올 정도로 작았던 케이는...

점점 길어지더니...

짠! 털빨 훌륭한 도도냥이 되었습니다. 아기땐 장모와 단모가 섞였었는데, 지금도 장모인지 단모인지 애매합니다. 털결이 토끼털 비슷합니다.

만지면 부러질까 겁날 정도로 말랐던 체구도 이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토실토실해졌습니다; 첫째에게 살찌는 훈육이라도 받은 걸까요.

부엌에서 뭔가 요리를 할라치면 두 마리 다 기가 막히게 낌새를 느끼고 달려옵니다.
못생겼든, 뚱뚱하든, 세상의 모든 냥이들은 다 사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