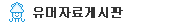"연희야."
힘이 없어보이는 남편의 부름에 자고 있던 눈을 황급히 뜬다.
눈을 뜨자 병실 천장이 바로 들어온다. 아직 밖이 어둡지 않은 것으로 봐서,
난 잠에 든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연희..야."
남편, 남편의 목소리다. 그리고 나는 황급히 간병인용 침대에서 일어나서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내 남편의 손을 덥썩 잡는다.
"응 자기야! 일어난거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남편이다. 지금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남편이다. 많이 수척해지긴 했지만, 아니 이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만이 어울리는 형태이지만, 남편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건 꿈이 아니라 진짜다.
남편은 정확히, 사고가 있은지 1개월만에 깨어났다.
"...연희야. 부탁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깨어나자마자 나를 보고 부탁을 하려고 한다.
무슨 부탁이길래, 이 사람을 한 달만에 일어나게 만든 것일까.
"응. 응 자기야."
"연희야.. 넌 전에부터 피부에 빗물이 닿으면... 안되는 병이 있었지..."
갑자기 남편은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 그래, 나는 피부에 빗물이 닿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병이 있다.
그래서 난 정해진 지역의 수돗물에서만 세수를 할 수 있었고, 외출을 할 때도 언제나 조심해야 했다.
비오는 날이면 언제나 남편은 나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고는 했다.
하지만, 왜 지금?
"응, 응. 자기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내 말을... 들어봐."
남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는 나의 손을 힘겹게 잡는다. 그리고 나를 본다.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눈빛에는 무언가 결의가 있어보였다.
그것은, 나에게 청혼을 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이제.. 나는 비오는.. 날에 너를 차로 데려다주지.. 못해."
"무슨..소리야... 바보야.."
그런 말 하지마. 그리고 내 손을 잡는 너의 손, 자꾸 힘빼려 하지 마.
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란 말이야.
"연희야.. 나 죽으면, 우리 집 안방 서랍.. 맨 위쪽을 열어봐."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남편은 그 후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나를 잡고 있던 손의 힘은 완전히 빠진 상태였다.
그리고, 보름 후 남편의 생명유지장치가 몸에서 거두어지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
장례 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그 일정동안, 나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깨어나고, 절하고, 혼절하고. 다시 깨어나고, 절하고, 혼절하고.
마음을 독하게 잡아야 한다고 친정 엄마가 양쪽 어깨를 붙잡고 이야기해주었지만,
난 그 나를 보는 눈조차도 기억이 안났다.
"..."
그리고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밖에는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이가 떠난 후, 비가 오는 날은 내가 나갈 수 없는 날이 되어있었다.
하릴없이 마루를 청소하던 나는 문득 그이가 말한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첫번째 서랍을 열어본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나무 서랍이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이상한 형태의 물체가 나를 맞는다.
그리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 나의 두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아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이가 말한 마지막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안 순간,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난 그 서랍 안에 있던 그 물건을 꺼내 조심스레 펴본다. 떨리는 손이 방해가 되었지만,
이내 나는 그 물건을 잡아서 펴는데 성공한다.
펴진 형태는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이걸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도 예상이 된다.
"..."
하지만 난 이걸 편 상태 그대로, 겉옷을 입고 문을 나선다.
딱히 행선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그이가 없는 세상에 내가 갈 행선지는 없다.
"자기야..."
하지만, 하지만 - 생각을 고쳐먹으며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아낸다.
미안해, 자기야. 나, 자기의 이 물건을 쓰면 절대로 비를 맞지 않을거야.
그래, 고마워. 나, 이걸 쓸 동안은 절대로 울지 않을게.
당신의 마지막 선물, 나는 행복하게 쓰겠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