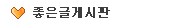우산과 장화
비오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비만 내렸답니다. 그 곳에는 비를 막아주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산과 장화도 꽤 오래 이 나라에 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우산도 장화도 쓸모없는 물건이었거든요. 어느날 우산과 장화가 비오는 거리에서 마주쳤어요.
“안녕 우산아.”
“안녕 장화야.”
둘은 인사만 하고 서로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러다 우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장화야. 너는 오늘도 물이 가득하구나.”
“맞아, 너무 무거워 죽겠어. 내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너무 무거워. 밑창이 터져나갈 것 같아. 너무 힘들면 한 번씩 자빠져서 물을 비우곤 하는데, 사실 넘어지는 건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조심 걷기는 하지만 얼마나 더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산은 장화를 다시 보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장화 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우산아, 너는 손잡이가 왜 그래. 온통 진흙이 묻어 있잖아.”
“나도 어디 가기가 힘들어. 거리에만 나오면 온갖것들이 손잡이에 와서 달라 붙은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 내리는 빗물로 씻고 싶은데 나는 온통 비를 막아버리기만 하니까…...”
우산과 장화는 자기 얘기를 하고 나자 시무룩해졌어요. 둘은 길가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마냥 내리는 비를 보고 있었지요.
우산이 장화를 힐끗 보았어요.
‘떨어지는 빗물을 막아주면 장화에 물이 차지 않을텐데.’
잠깐 이런 생각을 한 뒤 다시 바를 보았지요.
장화도 우산을 힐끗 보았어요.
‘손잡이를 감쌀 수 있으면 깨끗하게 다닐 수 있을텐데.’
잠깐 이런 생각을 한 뒤 다시 비를 보았지요. 우산과 장화는 내리는 비를 바라보다 서로를 동시에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의 동시에 서로를 불렀죠.
“장화야.”
“우산아.”
둘은 부끄러워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산은 말 없이 장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반도 다가가지 않았는데 벌써 비가 가려져 장화에 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어이쿠”
오른쪽 장화가 넘어져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장화는 왼쪽 장화에 든 물을 우산의 손잡이에 왈칵 부어버렸지요. 손잡이는 금새 깨끗해졌어요. 장화는 얼른 말했어요.
“우산아 진흙이 묻기 전에 얼른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네 발에 더러운 게 묻는 걸 막아 줄 께.”
우산은 망설였어요.
“저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폐가 되지 않을까? 나를 들고 다녀야 하잖아.”
“괜찮아 우산아. 물을 이고 다니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가벼워. 나는 네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너는 빗물을 막아주니까.”
우산은 얼굴이 발그레 해졌어요.
“그럼, 실례할께.”
우산은 조심스레 손잡이를 장화 안에 쏙 넣었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포근한 느낌이 들었죠. 장화에게도 우산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무언가 꽉 차오는 느낌이 빗물이 찰랑이는 것과는 사뭇 달렸죠. 장화는 신이 나서 가벼워진 몸으로 잘방찰방 물을 차며 걸었어요.
“정말 네 말대로 흙이 하나도 묻지 않아. 너무 고마워 장화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제 아무리 걸어도 물이 차오르지 않을 거야. 항상 이렇게 가볍게 다닐 수 있겠어.”
그렇게 장화와 우산은 신나게 빗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 장화와 우산이구나. 이걸 신고 이걸 들면 비에 젖지 않겠어.”
한 듬직한 어르신이 조심스레 장화에 발을 넣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우산의 손잡이를 잡아 들었죠. 우산은 어르신의 머리 위에서, 장화는 어르신의 발 밑에서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우산은 장화를 보며 찡긋 눈웃음을 날렸어요. 장화도 씽긋 웃으며 화답했지요. 비오는 거리에 물이 가득했지만 장화도 우산도 어르신도 모두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끝-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