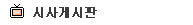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군인도 대통령 잘 만나야 돼”
“군인도 대통령 잘 만나야 돼.” 오늘 오후에 들은 얘기다. 그것도 스쳐들었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46명 용사들의 분향소를 둘러볼 때였다.
길게 늘어선 줄을 헤치고 나가는데 줄에서 누군가 이 얘기를 했다. 얼핏 살피니 50줄은 넘어 보이는 신사였다. 마주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무슨 얘기를 나누는 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틀 전 전화를 받았다.홍천에서 온 전화였다. “잘 지내지요? 여전히 바빠요?”
박남준씨.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에서 그는 큰 아들을 잃었다. 박동혁 병장이다.
박 병장은 당시 적과 싸웠던 참수리 357정의 의무병이었다.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였다.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었다.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인사성도 밝아 동네 어른들 모두 좋아했다. 해군 의무병에 지원했을 때도 걱정하는 엄마에게 “의무병은 배 안 타요”라고 안심시키던 아들이었다.
북한 684함이 참수리 357정에 집중사격을 퍼부었던 그 10여 분, 박동혁 병장은 피격당한 윤영하 정장과 이희완 부정장 등을 돌보느라 정신 차릴 틈이 없었다. 22포로 다가갔을 때 얼굴의 3분의 1이 없어진 황도현 하사가 보였다. 죽어서도 방아쇠를 놓지 않은 모습이었다.
황 하사를 밖으로 끌어내는 순간 적탄 하나가 박동혁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허벅지를 움켜쥐고 일어났다. 그때 다시 적의 포탄 하나가 옆에서 터졌다.박 병장은 겨우 몸을 지탱하고 62포로 기어가 방아쇠를 당겼다. 적함으로 탄환이 날아갔다. 또 다시 적탄이 오른 팔을 때렸다. 너덜너덜한 오른 팔을 간신히 움직이며 사격을 계속했다. 62포 포신이 빨갛게 달궈졌다. 갈수록 혼미해지는 정신을 애써 추스르는 순간 '파파팍' 적탄이 온몸을 꿰뚫었다. 온몸이 누더기처럼 찢겼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국군수도병원 병상에서 만난 박남준씨가 만난 아들은 처참했다. 베드를 둘러싼 링거 병이 22개. 병원에서 빼낸 포탄 파편만 100여 개였다. 그렇게 84일을 보냈다.
추석 다음날 화장(火葬)을 했다. 유골 상자와 함께 작은 상자가 전해졌다.
“고인의 몸에서 나온 쇠붙이입니다.”상자 안에는 아들의 전신을 찢고 할퀸 총탄이며 포탄 조각들이 담겨있었다.“쇳조각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처음 봅니다. 3㎏이나 나왔어요. 3㎏.”
박남준씨는 그 한 마디가 애써 추스르던 마음을 산산조각 찢어놓았다고 기억했다.
지난해 2차 연평해전 7주년을 앞두고 홍천 집을 찾았을 때 박 병장의 어머니 이경진씨는 ‘불쌍한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팠니?’라고 울먹이고 있었다.마주 앉은 기자도 참 많이 울었다.
자식 앞세운 부모 마음은 이렇듯 숱검정이 된다. 그런데 까맣게 타들어간 가슴을 당시 정부는, 사회는 끝없이 건드리고 자극했다.수사기관에선 미행에 도청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근황을 묻고 갔다.
혹시 무슨 말이라도 하고 다닐까봐 범인 대하듯 했다. 그래서 정든 안산을 버리고 홍천 산골로 거처를 옮겼다.자식 나라에 바친 게 죄가 된 세상이었다.
2차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장례식엔 정부 고위관계자 누구도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다.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성남비행장에서 일본으로 떠났다. 그 옆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이들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다.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도 불참한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북한 땅도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영토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참수리 357 용사들이 목숨과 바꾼 NLL을 군 통수권자가 허무는 발언이었다.
박남준씨는 천안함 사고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정말 다시는 동혁이같은 희생이 없기를 바랐는데”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똑같이 숭고한 희생이라면 참수리 357의 용사들에게도 뒤늦게나마 제대로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돈이 아니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아무도 그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 국화 한 송이 제대로 영전에 올리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