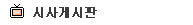얼마전 까지만 해도 평화시위는 한계가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있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그걸 원할거라고. 저렇게 촛불 들고 외치다 하나 둘,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갈거라는 확신으로 가득차 있을거라고.
결국 아침은 다시 밝고,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할것이며,
주부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챙길 것이며,
직장인은 일터로 돌아가 주어진 업무에 파묻혀 살아갈 것이며,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빨갱이'니 '좌빨'이니 하며 닳고 닳아진 입술에 다시금 혈기를 띄울것이며,
그러는 동안, 저 위의 높으신 분들은 지금껏 하던대로 국민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탐욕을 채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층 풀린 날씨였지만 그래도 겨울 문턱을 느낄 수 있었던 오늘, 우연히 일이 있어 나간 광화문에서 발길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지금껏 어느 한 구석이 꽉 막혀서 답답했던 내 마음도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로 뚫려버렸습니다.
교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거리에 나와있는 소년, 소녀들.
과잠바를 맞춰입고 모여든 대학생들.
아직 조여맨 넥타이 조차 풀어버리지 못한 직장인들.
가족들의 저녁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습진으로 손이 부르터버린 주부들.
휠체어를 끌고, 지팡이를 집고서 굽어진 허리를 한껏 세우고 서있는 어르신들.
어느 지방에서 차를 끌고 급하게 올라왔다던 사람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나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아이들 까지.
그들이 모두 모여 한 목소리를 외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에, 주책맞지만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역사의 산물이라며 마음속에 묻고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하고 살던 제게,
그 광경은 차마 내 두눈에, 내 마음속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벅찬 물결로 밀려왔습니다.
반성하게 했습니다.
참회하게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금 심어주었습니다.
"정치는 저 높으신 윗분들의 일이라, 나에게서 저들이 필요로 하는건 내 표 하나와 매번 내는 세금일 뿐,
저들과 나는 커다란 괴리에 놓여있다." 라고 생각했던 저를 가장 포근하지만 아픈 매로 다스려 주었습니다.
하나 둘씩 단상에 올라가 자신의 생각을 외칠 때마다 환호하던 그 함성,
어린 친구의 목소리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목소리까지.
그 소리들은, 지금껏 들었던 어느 소리보다도 힘차고, 아름답고, 숭고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물나도록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들로부터
그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진실을 감추던 철옹성에 금이 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커다란 분노에 가득차 있지만, 그럼에도 감출 수 없는 맑은 눈동자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울분과 억압에 몰리고 몰리다 절규처럼 내뱉은 그 처절함 뒤에 가장 깨끗한 음성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같이 울고 포효하다가도, 같이 한 얼굴로 웃음기를 머금던 그 아름다운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각들이 모여, 결국 정의를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보았던 어린 아이들은, 미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작은 새싹일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앳된 청소년들은, 머지않은 날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일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청년들은, 이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게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일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은, 희미해져가던 민주주의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새운 횃불일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왔던 민주화의 역사를 온전히 후세에 전달해줄 메신저일 것입니다.
하룻 밤 자고 일어나도 어제와 같던 대한민국의 매일에,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신선한 바람이 불고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속에 묻혀져 가던 민주주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렇게 또 눈부신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이제, 그 가슴 벅차오르는 역사의 현장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써내려 가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