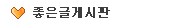그는 언젠가 내게, "내가 없는 곳에서 울지마" 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났다.
나는 그가 떠난 자리에서 빨래를 개키기도하고, 해가 기우는 방향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혹시나 그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방향으로 귀를 쫑긋 거리기도 하고. 생각 없이 책을 폈다가 덮기를 반복. 반복. 반복.
네가 없는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펴보기도 하고, 쏟아지는 햇살에 게슴츠레 눈을 떠보기도 하고, 의미없는 것들을 눈으로 살피다가, 잊었다가, 떠올렸다가, 결국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가만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연필을 사각사각 깎고는, 편지를 쓰고. 그것마저 또 다시 지우고. 지우고.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덩그러니 남은 눈동자로 거울을 바라보다가 너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표정으로 웃어야 제일 예쁠까를 고민하고.
그래도 내 곁에 네가 없으므로
눈물은 절대 흘리지 않는 걸로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한 마지막 약속이었으므로.
-
그는 아침에 울리는 전화벨을 싫어했다. 아침에 찾아오는 소식은 대부분 두려운 것들이라고. 무서운 것들은 꼭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그것들은 순식간에 머릿속을 잠식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자면, 아마 그의 눈물은 부드러웠던 그의 척추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뒷모습으로 우니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목을 꼭 끌어안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종종 숨이 막혀했던 것 같다.
내가 잘못했어. 매달리지 않고 쓰다듬어 주었어야 했었는데, 라고 나즈막히 이야기해보지만 그에게는 그저 야옹-하는 울음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겠지.
누군가가 내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것들은 꼭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나는 문득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두려워져서,
앉은 자리에서 입술을 꼭꼭 씹는다.
-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남는다.
남아서, 먼지가 덮인 채 삭아간다.
삭.삭.삭. 나는 이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보다가, 내 귓가로 들리는 이 글자의 소리가 왠지 좋다고 생각한다.
삭아가는 모든 것들은 울지 않는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자리는 고요하다.
때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들보다 아무 말 없이 죽어있는 것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고요가, 어둠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 없이 조용히, 그 날의 네 무릎 위에 앉는다.
그렇게 침묵에 익숙해지기로 한다.
-
날이 춥다. 이제 곧 눈이 올 것이다.
나는 이 곳에서 눈을 맞고.
그렇게 앉은자리에서 덩그러니 덮히고.
네가 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침잠하고.
고요하게 소멸되고, 침묵하고, 잊혀지고.
어느 봄날에 나를 발견할 너와
눈을 마주치는 상상을 하지만
오늘의 나는 네 눈동자 뒤에 서 있어서
도저히 보이질 않은채로 그렇게,
잊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