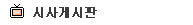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4년도분 신문 발행부수를 보면, 조선일보 160만, 중앙일보 100만, 동아일보 90만, 한걸레 24만이다.
신문의 1면이 아닌 지면에 정치 칼럼이 실렸을 때 얼마나 많은 독자가 읽을까? 가정에 배달되면 2인 이상 읽을 것이고, 사무실에 배달되면 어림잡아 5인 이상 펼쳐 볼 것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발행부수의 반절 정도는 읽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근데, 읽기는 읽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칼럼이 실리기를 고대하고, 그 칼럼이 실리자마자 부랴부랴 찾아서 읽은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열독률(熱讀率)은 높지 않다는 이야기다.
팟캐스트나 김어준의 파파이스는 어느 정도 청취할까. 정봉주의 전국구 '우병우, 이 남자가 사는 법' 편이 무려 120만의 조횟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런 데에는 그 음원에서 출연진이 우병우와 법대 동기 동기여서 보다 사적인 정보를 폭로(?)할 수 있어서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20만명의 청취자는 직접 ‘정봉주의 전국구’를 찾아서 클릭하고 꼼꼼히 들은 열성적인 네티즌들이다. 조횟수에 있어서는 조선일보에 실린 우병우 비판 칼럼을 읽은 독자수와 엇비슷하다고 하겠지만, 그 열독성(熱讀性)에서는 팟캐스트가 단연 앞서리라는 판단은 어렵지 않다.
‘김어준의 파파이스’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싣는 것으로 공표하는데, 조횟수가 공개되는 장점이 있다. 조회수를 찾아 보면, 가장 최근의 111회 '건국절 그리고 그랜드 개집' 편은 209,781회이고, 약 1개월 전의 106회 '사드 그리고 우장창창'은 319,656회이다. 그렇다면 평균 30만회 이상이다. 이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발행부수보다 확연히 높은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조횟수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파파이스를 청취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스스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청취한 네티즌이 대부분이므로 열독률로 치면, 한겨레, 경향보다 갑절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늘 팟캐스트 1위를 달리는데, 조횟수의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정봉주의 전국구' 특정 회차의 조횟수, 파파이스의 평균 조횟수를 감안하면, 최소 30만에서 최대 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 50만이라고 한다면, 열독률에서 동아일보와 맞먹는 영향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팟캐스트나 파파이스의 조횟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붙는 광고의 효과가 클 것이고, 그러기에 운영자의 광고 수익도 다른 직업 없이 충분히 살아갈 정도는 된다고 추정한다. 또, 열혈 시청자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도 꽤 될 것이다.
진보의 맏형이라는 어떤 신문이 있다. 이 신문은 언제부터 맛 간지는 모르나 중앙 언론이면서 지역당 대변지를 자처해서 그 정당을 빨아주기에 여념이 없다. 반면에 제1 야당이 잘 되면,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지역당이 혹여 비틀거릴까봐 제1야당을 교묘히 디스하기에 열심이다.
최근에 더민주당 경선 대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니까 이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사사건건 그러나 은밀하게 흠잡는다. 친문 일색이어서 문재인 대선 가도에 독이 된다는 논지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공통 프레임이어서 기본 옵션으로 깔린다. 추미애 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시절 날치가 통과한 노동 악법을 힐난하는 노동 운동가 박점규 씨의 칼럼을 느닷없이 실어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이 칼럼 하나만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주장 자체가 옳으니...
심지어 정당의 주요 행사가 있고 나서 으례 하는 국립묘지 참배 행사도 딴지 걸어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극소수의 소속 의원이 SNS에서 불만을 터트린 것을 두고는 벌써부터 파열음을 낸다며 원고지 200자 기준 37장의 장문의 기사인지 잡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글을 인터넷판에 올리고 메인 화면에 링크를 걸어놓는다. 기사 하나하나만을 두고는 나름의 언론 본연의 비판 정신으로 그랬다고 변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류의 기사를 떼거지로 싣는 것을 종합하면, 이는 분명 의도적인 것이다.
마이너 언론이 정글이나 다를 바 없는 언론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정'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일개 팟캐스트의 영향력도 없는 신문이, 보수 언론의 1/6 발행부수도 안 되는 신문이 편집인과 정치부 기자의 개인적 정치 취향을 여과 없이 배설해놓는 지면 사유화로 어떻게 살아남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