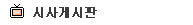안녕하세요 오유 유저 여러분,
맨날 눈팅만 하다가 조언을 좀 구합니다.
아래 글을 광주에 내려가서 유인물로 돌리려고 하는데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직접적인 지지글을 선거운동원만 돌릴 수 있는 걸 알지만,
아래와 같은 선거 독려글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0.
선거 때만 되면 무려 24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김대중 - 김영삼 후보가 맞붙었던 대통령 선거날 아침이었죠.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2학년 교실은 평소보다도 어수선하고 시끌시끌한 분위기였습니다. 뭣 모르는 코흘리개들이지만 오늘이 우리나라 대장을 뽑는 중요한 날이란 건 다들 어련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에서 짱을 먹던 녀석은 교실 앞에서 '김대중'을 연호할 정도였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그저 지켜만 보고만 있었습니다. 다들 울 아부지와 같은 후보를 응원하는 분위기에 왠지 모를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김대중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이게 웬걸. 선거가 끝난 뒤 TV를 보니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우리 지역만 녹색이고 나머진 다 시퍼런 것이 아니겠어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 그런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날.
그날이 저에게 정치, 하면 떠오르는 최초의 기억입니다.
두번째 기억은 그로부터 5년 뒤, 김대중 -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대통령 선거 전날 밤에 시작됩니다. IMF가 터진 직후였고 여전히 정치는 총풍-세풍-병풍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단어들로 가득한, 저와는 동떨어진 어른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래도 선거 전날이라고 다들 싱숭생숭했나 봅니다. 한 친구가 학원 선생님께 내일 누구 찍으실 거냐는, (광주에선) 답이 너무도 뻔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선생님께선 묘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부터 찍었던 후보를, 여러분이 다 아는 그 후보를 또 찍을 거라고, 내가 찍은 후보는 아직까지 된 적이 없고 아마 이번에도 안 되겠지만, 된다고 해도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겠지만...
뭔가 표현하기 힘든 어투와 표정으로 담담히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모습.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죠.
그날 밤 전남도청 앞이 광주 시민들로 가득 찼다고 들었습니다. 80년 5월 18일 이후 살아남은 이들이 가슴 속에서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던,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속 부채가 그렇게나마 덜어졌을까요.
작년 겨울, 12년이 넘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을 떠나면서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어요. 좋은 직장 그만두고 왜 돌아가냐고, 왜 돌아왔냐고. 다들 탈조선을 외치는 마당에 '빠꾸' 했으니 이상할 만도 하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그냥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영화 <동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가혹한 시절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어 / 대학 노트를 끼고 /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려" 가는 것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을, 함께 나고 자란 친구 몽규는 이 시대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작 글이나 끄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저 또한, 어떤 부끄러움이 저를 끌어당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기업의 개발자로 편히 일하는 게,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를 향해 쉽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이 '빠꾸'하기 전에 직접 겪어보고 부딪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노무현과 세월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을 줄 알았던 노무현이 그렇게 황망히 가버렸을 때. 쉬이 데려오리라 믿었던 세월호의 아이들을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에게 노무현이 필요했듯 노무현도 우리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기장 밖의 관객이 아니라 안에서 함께 뛰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버거워하고 서울살이에 허덕이는 보통의 개발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씁니다. 꿀 같은 주말을 반납하고 광주행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80년 5월 도청을 지켰던 광주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는 그런 세상",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좀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저 역시 꿈꾸기 때문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 몸입니다. 그는 노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광주는 김대중과 노무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둘을, 광주를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주의 정신보다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마음이 앞선 분들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느껴지시거든, 조금만 더 자세히, 조금만 더 가까이 바라봐 주십시오. 어떤 후보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정당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으면 80년 5월의 영령들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 또한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