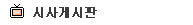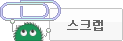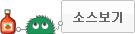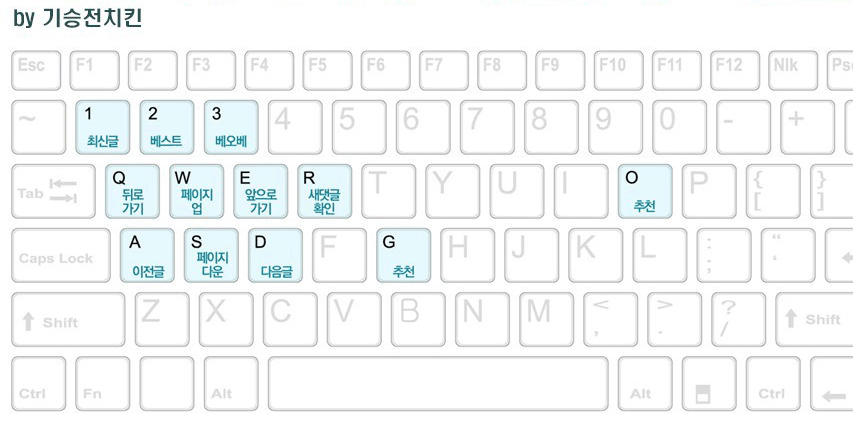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전략)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의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제민주화 일부만 파편적으로 전달해서 혼란만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법 조항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넣기 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국회 헌법특위 경제조장 분과위원장'을 맡으니 즉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반응이 오더군요. 재계 대표 격인 전경련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홍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헌법 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경련에서 로비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비상 상황이 벌어지는 쉽지 않은 와중에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민주화 논쟁과 관련해 헌법 119조 1항이 주요 내용이고 2항이 부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어요.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면 그 국가는 파탄 나고 맙니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말처럼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본주의적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원래 모형은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 같은 소리지요. 원형대로 움직이면 시장경제도 계획경제도 다 망가집니다. 계획경제의 원형은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욕구를 억눌러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시장경제의 원형은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시장경제도 무너집니다.
간단한 예로 2008년 월가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1929년 같은 대공황 사태가 왔지요. 2008년 월가 붕괴로 인해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실물 부문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계속 굴러가게 하려면 절제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도적으로 절제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룰을 정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 삼아 오늘날 전 세계 15위라는 경제 대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장경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계획경제 요소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다만 근본적인 계획경제와 다른 점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소비 선택의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었지요. 자원을 배분해주고,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계획경제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들이 경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당시에는 정치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 자원도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었고 시장규제도 철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업을 제대로 키우려다 보니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재벌입니다. 그 와중에 재벌들의 경제력은 막강해지고 세력이 상당히 커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감히 토를 못 달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무얼 하려고 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를 능가하려는 경우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힘이 떨어지게 된 거지요.
(후략)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에서 발췌
이 책 정말 쉽게 쓰였습니다. 대체 경제민주화가 뭔데? 싶으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실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