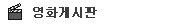저는 과연 2017년, 남은 5개월 안에 이 영화처럼 관객을 영화 현장 속에 내려놓는 영화가 과연 나올까.
과거 히치콕이나 스탠리 큐브릭의 시대에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시대에 살고 있음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덩케르크>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군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영국으로 퇴각하는 40만명의 군인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5가지 포인트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크리스토퍼 놀란, <덩케르크>에 <메멘토>라는 옷을 입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21세기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후세의 사람들은 당연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도전정신이 <덩케르크>라는 대작을 만들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계속해서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매번 새로운 장르를 수집하고 있고
그 완성도는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번 <덩케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B TV’에서 방영 중인 ‘영화당’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메멘토>에 대해 언급해주는 부분을 보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번 <덩케르크>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메멘토>에서 사용했던 플롯 기법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멘토>를 설명했던 이동진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영화 속에서 관객에게 영화 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주인공과 같은 선상에서 영화의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덩케르크>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물론 역사가 스포일러이지만, 덩케르크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당시 ‘덩케르크 해변’에 있었던 병사들 뿐 일 것입니다.
덩케르크 해변에서의 철수를 알고 있지만 그 내부에 상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개봉한 <군함도>도 마찬가지죠.
다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이 때문에 현재 군함도가 많은 비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관객이 <군함도>에서 원한 것은 ‘군함도 사건’에 대한 감정이입이었지
액션활극을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군함도>와는 달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는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캐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덩케르크> 관람 3분 안에
관객을 ‘덩케르크 해변’으로 소환시키는 어메이징한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대사나 어떤 상황 설명 없이
덩케르크 해변에서 죽지 않기 위한 병사들의 모습을 제 3의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러닝타임이 흘러갈수록 마치 블랙홀에 빠진 우주선마냥
점점 '덩케르크 해변'으로 소환되는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로 인해 <메멘토> 때처럼 관객이 등장인물과 같은 선상에서 영화의 끝으로 달려가게 하여
전쟁이라는 참혹한 생지옥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만들어줍니다.
2.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감옥. 덩케르크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덩케르크>는 영화 상영 3분 안에 관객을 덩케르크 해변으로 소환시킵니다.
영화 시작과 함께 총소리와 그 총소리에 도망가는 영국병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며 이 영화가
‘살고싶다.’
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시계태엽 오렌지>나 <풀 메탈 자켓> 처럼 영화 시작부분에 주제의식을 밝히는
교과서적인 부분도 잘 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총격 소리에 놀라 살기 위해 도망친 주인공 ‘토미’는
진지를 구축한 타국의 군인들에 의해 덩케르크 해변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카메라가 줌 아웃을 하면서 두 개의 국기봉 사이로
'덩케르크 해변'에서 배를 기다리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의 제목이 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란 감독이 바라본 덩케르크 해변은
살기 위해 쏟아지는 총알을 뚫고 살기 위해 달려온 ‘생존의 공간’ 임과 동시에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감옥’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묘사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를 통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덩케르크는 생지옥이었다.”
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지옥 속에서 누가 쉽게 입을 열 수 있을까?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조차 망각한 채
오직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만 떠올리는 이곳에 수다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도 구하러 오지 못하는 감옥. 덩케르크 해변
오히려 소리 지르면 적에게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곳. 덩케르크 해변.
그러나 영국군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덩케르크 해변.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 죽은 군인의 군화를 빼앗는 것도,
비행기가 떨어트리는 포탄에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이상할리 없는 곳.
크리스토퍼 놀란은 덩케르크 해변을 그렇게 그려냈다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3. 죽기 싫은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영화 <덩케르크>는 ‘죽고 싶지 않다.’는 인간의 본연적 감성을 최대치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심장에 ‘죽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마치 드라큘라의 심장에 말뚝을 박듯,
잠시 숨을 돌리 때마다 비수처럼 꽂아 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게 당시 덩케르크 해변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덩케르크>가 고증 이상의 고증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적인 설정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본능’을 너무도 잘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군인들은 살기 위해 별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인간의 살고자하는 본성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경험을 했든,
누구와 있든 결국 누구나 ‘나의 생존’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극한으로 갔을 때
얼마나 비굴하고,
악마같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다가 얼마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 본성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고 있어서 비판하거나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도 타당한 이유라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래. 저게 인간 본성이지. 나도 다를 바 없어. 나도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어느 순간 관객을 덩케르크 해변에서 퇴각을 바라는 병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덩케르크>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