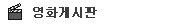*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네마스코프 문구와 함께 스크린 위에 다시 가상의 스크린이 입혀지고,
지금 당신이 보고있는 것은 완벽한 허구의 이야기라며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렇기에 어떤 꿈이라도 꿀 수 있고,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이 모여드는 곳,
라라랜드의 이야기.
어느 겨울의 깜깜한 밤, 그 옛날 할리우드 스타들을 지나쳐 터덜터덜 길을 걷던 미아는
갑자기 들려오는 세바스찬의 피아노 연주에 홀린 듯이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마치 비현실적인 공간 속으로 초대받는 듯한 미아.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러 세바스찬이 그녀의 그림을 지나
자신의 클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변주, 반복되고
그때 다시 소환되는 이 공간은 변화무쌍한 재즈의 율조처럼
이들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상상의 음표 위에 옮겨놓는다.
세바스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극장에서 불쑥 스크린 앞으로 나온 미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다른 관객들, 단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세바스찬만이 반응할 뿐이다.
그의 연주를 미아가 먼저 알아주었던 것처럼, 배우를 꿈꾸는 그녀를 응원하는 세바스찬.
하지만 현실의 그늘에 낭만이 점차 지워져 나가면서,
미아를 지켜봐야 할 그의 자리 역시 비어있게 된다.
흡사 고전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던 주인공(잉그리드 버그만)을 연상시키는 미아.
이 순간 그녀는 어떤 경외의 대상, 현실의 테두리를 벗어난 존재의 느낌을 가진다.
미아와 세바스찬 두 연인의 사랑의 행로는,
이별로 끝난 <카사블랑카>의 그들
(잉그리드 버그만과 험프리 보가트)과 닮을 수밖에 없다고 예감케 하는 듯도 싶다.
<이유 없는 반항>의 천문대에서 우주 공간으로 떠올라 날아가는 세바스찬과 미아. 영화는 꿈을 좇는 이들이 먼저 수놓은 별자리에 두 사람을 데려다놓는다.
현실과 상상이 혼재하는 이 장면은 결국 바스라질 수밖에 없을
완전한 허구 속에 이들의 로맨스를 자리하게 만드는 것만 같다.
그 판타지가 무너지고 나면,
그들의 필름 역시 열화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공원의 주차장에서 미아를 먼저 보내고 길을 돌아갔던 세바스찬, 미아에게는 계속해서 바라던 길을 가라고 외치지만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는 정작 자신의 꿈을 유보한다.
무심코 바라본 방 안 벽지의 얼룩처럼 어느샌가 현실이란 이방인이 틈입하고,
영원히 낭만 속에 머물러야 할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환상과 낭만으로 가득해야 할 세계는 불현듯 일상의 공기로 채워지고,
어쩌면 홀로 서야 하는 꿈을 좇으며 사랑을 시작했듯이,
미아와 세바스찬은 서서히 작별을 준비한다.
영화는 이 판타지의 정점을 이루었던 천문대의 보잘것없는 풍경으로,
그들을 지탱하던 신기루와 같던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없음을 얘기한다.
어느 겨울에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열정을 연주하는 세바스찬을 발견했던 미아,
다음번 겨울이 왔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다.
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했고,
다시 여기에서 끝맺는다.
집으로 향하는 미아의 발을 잡아 이끌었던, 원치 않는 식사 자리를 박차고
세바스찬이 기다리는 극장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마술과도 같은 멜로디가 시작되면,
마침내 영화는 이 이야기를 허구의 허구 속으로 더욱 끌고 들어간다.
세바스찬 또는 미아의 상상, 아니면 혹시 관객의 상상을 보여주는 걸까.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안의 영화로 들어가듯, 못다 이룬 그들의 사랑을 새롭게 써나간다.
지나간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 등은 표백되어 다시 채색되고,
두 사람은 파리를 배경으로 한 연인이 되거나,
할리우드의 화려한 세트장으로 초대되고,
홈비디오(그것조차도 그들 스스로 관객이 되어 바라본다) 속 다정한 부부가 된다.
낭만을 좇으며 서로의 길잡이가 돼줬던 두 사람.
꿈을 찾아서 헤매던 이들이 만나 사랑을 했고,
애틋하고 씁쓸한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연주를 시작해야만 한다.
작년 12월 개봉 당시 하도 입소문이 퍼져서... 영화가 얼마나 괜찮길래 싶어 호기심에 본 뒤로,
1월에 한 번 더 보고, 고맙게도 장기 상영을 해주는 바람에 지난 3월에 또 보러 갔던 <라라랜드>.
영화 하나 때문에 최근에 극장을 이렇게 자주 찾은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ㅎㅎ
아무튼 저한테는 이 영화는 정말, 일년 내내 극장에 찾아가 만나고픈 그런 영화들 중 하나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의 시작을 기다리던 것마저도 어찌다 행복하고 즐겁던지...
'시네마스코프'를 내세우며 화면이 전환되고, 도로 위 정체된 차량에서 한 사람씩 등장하며 차례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아, 너무 좋아서 뭔가 견딜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영화 내내 감탄할 장면들도 어찌나 그리 많던지요...
특히나 그 엔딩 장면에 이르러선 거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연출을 해놓아서...
줄거리만 보자면 지극히도 평범한 두 주인공 미아와 세바스찬의 이야기를 이렇게나
다채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펼쳐 놓는 재주에... 새삼 다미엔 감독이 천재이긴 천재구나 싶었습니다 ㅋㅋ
<위플래시>보다도 먼저 데뷔작으로 찍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영화라는 얘길 들었는데,
그만큼 자신의 영화적 야심 혹은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했던 작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