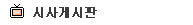IT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다닐 때였다.
1년에 한두차례 KOEX에서 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이었다.
전기.전자 관련한 큰 전시회에는 대통령도 오기도 하고,
선거철에는 후보들도 오곤 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대통령이었을 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참여한 전시회에 참관하러 왔다.
그 둘이 참관할 때의 분위기를 쓰고자 한다.
전시회 참여 기업들은 자신의 자리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전시회 전날이 가장 바쁘다. 전기, 전화, 인터넷 상황을 확인하고,
포스터를 붙히거나, 전시 물품을 시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삼이 대통령이었을 때의 일이다.
여느 전시회 준비 때와 마찬가지로 난 전날에 엄청 바쁘게 일했다.
대통령이 전시회 첫날 온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인지 분위기가 살벌했다.
경찰견과 경찰, 그리고 요원같은 사람들이 기계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폭발물 같은 걸 찾고 있었다.
예전에도 경찰견이나 경찰 정도는 제법 온 적도 있어서 인지
나는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 좀 더 신경쓰겠지' 정도 생각하고 나와는 무관하게 여겼다.
더구나 나에게는 참가업체를 표시하는 목걸이도 있으니까, 인증된 사람이라고 여겼다.
일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했다. 전시할 물품들을 누가 가져가면 안되니
창고 비슷하게 마련한 빈공간에 물품을 넣기 위해 빈공간을 열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다.
빈 공간을 열려는데 얇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붙인 듯 보였다.
나는 '왜 남의 부쓰에 이런 걸 붙여?' 라며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결국 그걸 뜯어 빈공간을 열고 물건을 넣았다.
그리고 스티커를 보니 거기에는 "떼지마시오" 같은 글이 써져 있었다.
아 떼면 안되는 구나 생각하며 원래 붙어있는 곳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소리친다.
"이거 누가 뗐어?"
돌아보니 사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아마도 내가 다시 붙여놓은 것이 티가 났나보다.
"제가 뗐는데요"
나중에 내 짐작으로 안 것은 스티커는 폭발물이 있지 않다고 확인한 후 붙이는 스티커이고,
그걸 떼려면 누군가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했고, 몰랐다고 했다.
그는 왜 몰랐냐고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 다시
그걸 일일이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냐고 화를 냈다.
그는 시종일관 반말이었고, 소리를 질렀고, 고압적이었다.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었고, 다시 확인한 후 스티커를 다시 붙히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를 내며 소리만 질렀다.
난 억울했고, 급기야 화가 났다. 그래서 항변했다.
얘기도 안하고 붙히고, 글씨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상대는 더 화를 내고 '시팔 시팔' 거리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난 좀 무서웠지만 억울한 게 더 컸다. 다행히 옆의 동료가 처음부터 계속 말렸는데
이쯤에서 고개까지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료도 와서 그를 데려가며,
다음에는 꼭 말하라고 하는 것 정도로 사건이 무마되었다.
다음날 김영삼은 오지 않았다.
몇 년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 무슨 전시회에 그가 오기로 되었다.
마찬가지로 전시회 전날이었다. 경찰견과 경찰이 역시 왔다 갔다 했지만 김영삼 때보다는 살벌하지 않았다.
뭔가 스티커를 붙히거나 하지 않았다. 예전의 전시회에서 조금 더 많은 경찰이 보이는 것 정도였다.
다음날 전시장에 김대중은 오지 않았다.
전시가 끝나고 전시장 밖 복도에 쭈구려 앉아 아직 나오지 않은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무슨 요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서 말한다.
"저 일어나 주시겠어요. 대통령께서 오셔서요"
정중하게 부탁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났고, 곧이어 김대중이 멀리서 걸어와 내 앞을 지나갔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난 지금도 그때 그의 미소를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