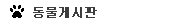2012년 5월...
내 삶 속에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던 동생이 떠났다.
나이든 개였다. 게다가 많이 아팠다.
병원에 가보면 나이가 많아서 병을 고치기도 힘들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면 안락사를 하는게 좋다고 했다. 하지만 도저히 그 말을
따르진 못했다. 아니 안했다. 내 결정으로 나의 가족인 녀석을 보내기 싫었다.
기침을 힘겹게 하는 녀석을 그냥 안아주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다. 이 당시의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을 지도 모른다.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이었던 동생이 휴가를 나왔다. 동생과 밥을 같이 먹기 위해
엄마와 시간을 맞춰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 우리가 웃고 떠들며 즐겁게 있었을 때
녀석은 어두운 집에서 힘겹게 기침을 내 뱉으며 우리를 기다렸겠지.
가볍게 술을 몇잔 하고 온 엄마와 동생과 나는 녀석의 반가움을 뒤로 한채 휴식을 취했다.
나에게 와서 헥헥 거리며 머리를 부빈 녀석에게 귀찮다며 개껌을 다른곳으로 던졌고
나의 무관심함을 느꼈던지 녀석은 동생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부볐지만 이미 두 사람은
잠이 든 후였다.
나도 피곤 했지만 컴퓨터를 컸고 녀석과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게임을 했다.
그때도 녀석은 나의 뒷모습을 웅크린채 보고 있었겠지. 내가 자길 봐주길 바라면서.
새벽 4시쯤었다.
게임이 길어져 그 때까지 안자고 있던 나는 이상한 소리에 뒤를 돌아봤다.
녀석이 낑낑 되며 나를 애타게 보고 있었다. 마침 게임도 끝이 난 터라 녀석을 안으며
심심했었지? 라고 말하며 쓰담아주었다. 녀석은 내가 안아주자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는
몸을 바둥거리며 내려 달랬다. 배가 고픈건가... 생각하며 내려줬더니 천천히 엄마와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면서도 나를 몇번 뒤돌아 보며 따라오라는 듯 짖듯이 낑낑
되며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서 걷고... 몇발자국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를 힘겹게 걸어가더니
엄마와 동생 사이에 쓰러지다 싶이 누워 버렸다.
뭔가 이상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 날인가 싶었다. 서둘러 엄마를 깨웠고 동생도 나의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깼다.
평소엔 자던 사람을 깨우면 짖던 녀석이 가쁜 숨을 쉬며 기다리더라. 모두가 자길 바라볼때를...
엄마를 보고 동생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더니 녀석이 잠들듯 고개를 자기의 앞 발 사이에 묻었다.
그리고 몇 초... 빠르게 요동치던 녀석의 배는 점점 느려졌고 숨소리도 가냘퍼 지더니
이어코 모든게 끊겼다...
이런 위기는 몇번이나 있었고 그때마다 녀석은 우릴 놀렸다는 듯이 깨어나서 손가락을 핥아주며
안심시켜 줬는데...
굳어가는 다리와 몸뚱이를 흔들며 빨리 병원에 가자며 우는 나...
찬물을 먹이면 일어날 거라며 벌어지지 않는 입을 벌리는 엄마...
그저 눈물을 글썽 거리며 지켜보던 동생
모두 알고 있었다... 녀석이 떠난 거란걸...
마지막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 준 녀석에게 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죄책감에...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때문에 놓아주지 못했을 뿐...
녀석의 이름은 대박이. 14년을 한 가족이 되어 행복을 주었던 녀석.
너 갈때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이 말 못해준게 너무 아쉬워서...
대박아 정말 고마웠고 사랑해. 잘 가라 우리 걱정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