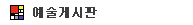달의 눈동자
“바라건데 내일의 태양이 나를 비추지 않게 하소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채 열살이 지나지 않아 보이는 앳된 그 소년은 길거리에 앉아있었다. 곰팡내 나는 골목은 어둡게 드리워진 밤의 장막으로 그를 껴안고 있었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따스해보였지만 소년은 거기에 닿을 수 없었다. 밤은 길기만 하고 달빛은 차갑기만 하다. 달빛을 받은 소년의 머리칼만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슬슬 움직여도 되겠구나.”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때에 찌든 얼굴에 크고 흐린 눈동자를 가진 노인은 소년을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리로이, 집안을 비추는 불빛은 따뜻하겠죠?”
소년은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노인은 암갈색 재킷의 옷깃을 정리하며 그 큰 눈을 끔뻑거렸다.
“레로. 불빛이 왜 골목을 비추지 않는지 아느냐?”
“사람들은 하수구를 기어다니는 시궁쥐를 보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소년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하였다.
“불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그녀석들이 없어지는건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어차피 자기들은 집안에 있으니까요.”
“시궁쥐라. 그녀석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거구나.”
노인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레로. 그 시궁쥐가 우리라고 생각하니?”
“.......”
소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시궁쥐라.. 틀린 표현은 아니겠구나. 하지만 기억하렴 우리는 밤을 망토삼아 모습을 숨기는 손님들이지. 네 말마따라 잠을 자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게 옳겠지.”
소년은 노인을 따라나섰다. 검은 골목에서 은은한 달빛만이 춤추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하렴 레로. 시궁쥐는 그 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탐하지는 않는다. 그날 먹을 한 조각의 치즈만이 사는 이유란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굳게 닫힌 상점의 문틈을 흔들기 시작했다. 소년은 불안한 듯 모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옳지. 이 아이는 쉽게 우리를 허락해 주는구나.”
쩔꺽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노인이 문틈사이로 들어가고 소년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달이여. 바라건데 내일의 태양이 나를 비추지 않게 하소서. 햇빛 아래의 치즈처럼 내가 녹아내리지 않게..”
소년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노인이 두손에 빵 한덩이씩을 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다.
“레로. 시궁쥐들은 오늘 먹을 한조각의 치즈를 찾은 것 같구나.”
노인이 웃었다. 주름살이 한층 더 깊게 입꼬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리로이. 이제 곧 이쪽으로 순찰이 올 시간이에요. 이쪽 골목으로 가야해요.”
소년은 아직도 불안한 눈빛이였다. 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레로. 조금만 천천히 가자꾸나.”
노인은 소년의 뒤를 따르기 조금 벅찬 눈치였다.
“미안해요 리로이.”
소년과 노인은 골목의 가장 으슥한 곳에서 쭈그려 앉았다. 곰팡내가 더욱 짙어졌다.
“아니다. 나도 나이가 먹기는 했구나.”
노인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소년에게 빵 한덩이를 건넸다. 때묻은 거친 손을 바라보며 소년은 빵을 받아들었다.
“리로이.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나요?”
“아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남들에게 우리는 시궁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멋지게 포장해봤자 문 틈 사이로 들어와 재산을 가져가는 좀도둑 아니겠느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거라. 이 빵이 그들에게는 선반에 얹어놓은 비축물이지만, 시궁쥐들에게는 목숨을 이어가게 해 주는 생명줄이란다.”
밤은 깊어갔다. 소년은 노인이 잠든 사이 골목을 지나 언덕 위 공터로 올라갔다. 달은 금방이라도 움켜 쥘 수 있을것만 같았다.
“달이여. 바라건데 내일의 태양이 나를 비추지 않게 하소서. 햇빛 아래의 치즈처럼 내가 녹아내리지 않게. 달이여. 바라건데 이 밤이 끝나지 않게 하소서. 얼어붙은 내 몸이 이대로 잠들 수 있게.”
소년은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달을 쳐다보았다. 한창 길거리에서 많이 불리던 노래였다. 유명한 극단이 이 도시에 와서 공연한 곡이라는데 동네 아이들이 부르던 것을 소년은 귀동냥으로 조금이나마 따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밤은 깊어져만 갔다. 소년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물음에 답을 소년은 찾고 싶어했다. 동이 틀 때가 돼서야 소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노인이 있던 골목으로 굽이굽이 들어갔다.
골목은 소년의 집과 같았다. 여기저기 굽이친 골목 길 구석구석을 소년은 전부 꿰뚫고 있었다. 이 모퉁이를 돌아서면 매일 술주정하는 아저씨가 있다거나, 넓은길로 나가면 마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여인들은 하나같이 산만한 모자를 쓰고 종종걸음을 걷고 있다거나, 이쪽 길로 가면 순찰을 도는 순사들을 피할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을 소년은 전부 다 알고 있었다. 넓은 도시가 소년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소년은 쏜살같이 골목을 내달렸다.
“거기 너, 이리 와 봐.”
예상치 못한 부름이였다. 소년이 대로를 지나던 도중 순사가 한 말이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순사님?”
노인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순사에게 최대한 공손히 대하라.
“너 말야, 최근 부자들만 털어간다는 도둑패 아냐? 옷입은 꼬라지를 보니 저 골목에 사는 녀석같은데..?”
“그럴리가요. 순사님. 저는 그저 구두닦이 소년일 뿐입니다.”
이것도 노인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소년은 구두약이 잔뜩 묻어있는 상의를 보여주고 말하였다. 물론 골목에서 주은 약을 옷에 묻힌것이었다.
“수상한데.”
“이봐 뭘 또 그리 그러나. 저 어린애가 뭘 할수 있다고 그래?”
순사의 동료가 말하였다.
“요즘 체구가 어린 아이를 동반해서 도둑질 하는 도둑패들이 있잖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예비 범죄자들이라고.”
소년은 고개를 숙였다.
“구두닦이 소년이라고 하지 않나. 원 자네는 왜이리 의심이 많아?”
순사의 동료가 걸음을 제촉하며 말하였다.
“뭐 아무튼, 꼬마. 조심해라.”
소년은 순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다. 그리고 순사들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빠르게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것만 같았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되뇌이며 소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오늘 갑자기 삘받아서 적은 소설입니다
스토리나 그런거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글에 보이는 문제같은것도 알려주시믄 좋구요.
왜 예술에 올렸나면...이거 어디다가 올릴지 몰라서 ㅠㅠ
암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