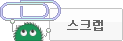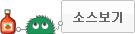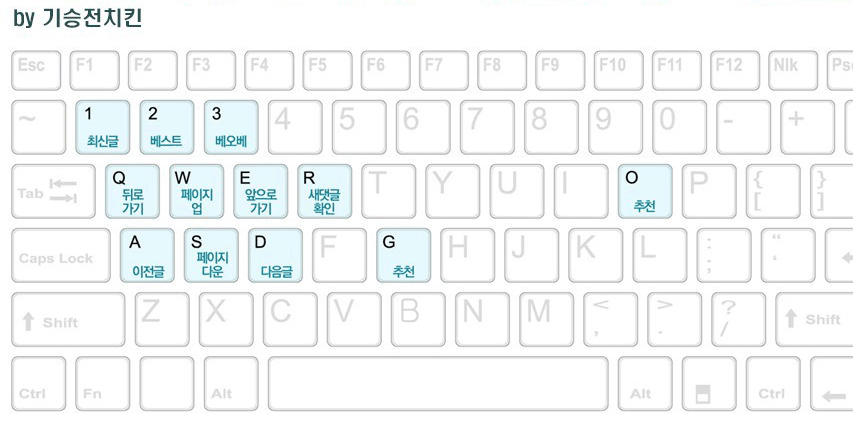길이상 2~3 파트로 잘라 업로드 하겠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shogun/1Db/2800 
사람들은 대개 각 지역과 문명권에는 그에 맞는 군사 문화가 발전해 왔다는 점을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물론 그 군사문화가 상당한 보수성을 띄긴 합니다만, 그 초기에는 분명한 효용성을 찾을 수 있었겠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초기 그리스의 방진, 혹은 무거운 판금갑옷을 껴입은 기사들, 모두 일련의 합리성을(물론 그 중에서 기득권을 향한 의도적인 선택도 있습니다만, 그 선택들도 모두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지형은 기병이 활동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리스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 지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병 동원 자체가 힘들고, 설사 기병을 동원할지라도 그 기동력을 손쉽게 발휘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따라서 기동력보다는 힘과 방어력에 기본을 둔 방진이 발달하게 되었고, 활이 오래 전부터 소개되어 왔음에도 보병전의 라인 배틀에 적합한 투창병이 경보병의 대세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것을 키건이나 데이비드 핸슨의 주장처럼 서구권의 동양에 대한 우세로 이끌어가는, 적어도 동양인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주장과 동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키건이나 핸슨의 주장대로, 동양이 서양 내부에서 서양을 결정적으로 격파한 전투도 없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천재를 제외하면, 서양도 근대 이전에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 전제를 기본으로 삼아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몽골의 유럽 공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오고타이 칸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바투의 원정이 유럽을 초토화시켰으리라는 주장, 흔히 자주 보는 주장이지요. 물론 몽골 원정이 유럽에 미쳤던 격렬한 공포나, 그 군사적 탁월성을 부정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는 설사 오고타이가 죽지 않았더라도 몽골이 서유럽의 심장부까지 진격하여 이를 초토화시켰으리라고 보는 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가정을 고려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몽골군의 동원군을 바투의 군단으로 한정하고, 이 군단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몽골이 강대했던 중국을 거꾸러트린 것은 정복이 완료된 북중국이라는 후방과 그 생산력, 이들에게 축적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실제 역사의 바투의 군단이 서유럽에 대한 공세를 펼쳤을 때 갖는 효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칼카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는 중기병)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자면, 몽골은 1223년 칼카 전투에서 키예프 루스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격파했고, 1240년에 키예프를 점령하여 러시아 정복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동부-중유럽에 대한 공세를 제기하여, 군대를 둘로 나누어 리그니츠에서 폴란드군을, 모히에서 헝가리군을 격파합니다.
유럽은 공포에 떨었고, 몽골군은 계속 전진하려던 와중에 오고타이 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군을 뒤로 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몽골이 유럽을 공격하여 불바다로 만드는 일은 썩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러시아는 정복은 했지만 전체 러시아가 몽골에게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타타르의 멍에는 이반 뇌제의 시대까지 이어지지만 타타르의 멍에를 벗어던지기 위한 러시아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몽골은 이들의 반란을 끊임없이 제압해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폴란드로 진출한 몽골군은 리그니츠에서 승리하고 어떠한 정복작업도 마치지 않고 바로 헝가리로 되돌아왔고, 모히 전투에서 패배한 벨라 4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몽골군을 저지했으며, 방어선이 돌파된 뒤에도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몽골군의 후방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상황으로 볼 때 몽골군은 분명히 폴란드와 헝가리의 주력군단을 격파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정지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당시 몽골군의 후방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몽골군이 서유럽으로 전진해 들어갈수록 보충병이나 원군을 받을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몽골군에게 무슨 보급이 필요가 있냐?”
“피해를 받지 않고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
전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보르츠입니다. 몽골 특유의 건조식인 보르츠 덕분에 보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많은 보르츠를 만들었는지의 문제는 전혀 밝힐 수 없으니 차치로 하고서라도, 무기와 갑옷의 낭비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몽골군이 제 아무리 탁월한 군단이라도 전장에서 수 천, 수 만발의 화살을 써야합니다. 당연히 상당수는 부러지거나 촉이 나가겠죠. 이 화살들의 보충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서유럽으로 돌입할수록 수많은 말을 먹일만한 대초원은 줄어드니 말먹이도 구해야죠. 전투 중에 부러지거나 잃어버리는 무기는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갑옷이 녹슬지 않게 칠할 기름도 구해야 되겠죠. 즉, 아무리 몽골군이 탁월한 군대라도 보급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