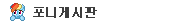“하하! 멍청이!”
“멍청이 아냐...”
“그럼 널 뭐라고 부르니? 트루시! 아니. 이젠 트레쉬[쓰레기]인가? 하하하!!”
포니빌.
사랑과 우정이 넘쳐나는 마을이다.
하지만 모든 것 이 검게 물들어 무엇이 내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쿵
“죄송합니다...”
우당탕
“아야야... 죄...죄송합니다!”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않았다.
날면 은 더 부딪히는 건 물론이고 내가 어디까지 가버렸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느낄 수는 있다.
왜인지 나를 자꾸만 바보라고 몰아가는 포니들과,
가끔 지나가면 입가에 빵을 물려주는 컵케이크설탕 냄새를 풍기는 포니.
아무 말 없이 목에 무언가를 둘러주는 향수 냄새나던 포니.
또닥또닥
흙길에 돌멩이가 박혀있다.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서 오른쪽.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이다.
나무가 너무 많은 숲이라 좀 그렇지만.
“어! 트루시! 왔어?”
수풀사이에서 부스럭대다 말고 재빨리 튀어나오는 어린 포니 한 마리.
갈라진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럽혔다.
“응. 나 왔어.”
“네 하얀 꼬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니?”
“꼬리? 뭐 어때.”
난 내 꼬리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다듬어줄게! 엄청 예쁘게 말이야!”
“넌 수말이잖아”
“수말은 예쁘게 하면 안 되나 뭐?”
서로 웃음이 터졌다.
이 포니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지만 행복했다.
유일하게 날 알아주었다.
유일하게 나와 말해준다.
유일하게 나만을 봐준다.
언제나 이 축축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자. 다됐다! 이젠 예뻐졌어! 정말 부러운데?”
“정말? 그렇게 예뻐?”
“내 멋진 꼬리만큼은 아니지만! 히히!”
“네 꼬리는 어떤데?”
“어...어! 너랑 닮았어!”
난 언제나 언덕위로 뛰어올라가고 싶었다.
“지금 우린 언덕이야”
“응.”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다.
“지금 우린 넓은 하늘을 보고 있어”
“으응~”
그리고 하늘에 별이 얼마나 떠있는지 보고 싶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떠있는지 보고 있니?”
“어?? 어! 보고 있어!”
알고 있다. 그는 다른데 신경을 팔았었다.
괜스레 웃음이 나왔다.
“히힛... 난 저 별들의 숫자를 세보고 싶어, 그게 내가 씹을 수 있는 양보다 많다 고해도 말이야.”
“... 넌 할 수 있을 거야 트루시.”
그는 단순한 내 꿈인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언제나 내 하루하루를 채워주는 포니.
언제나 내 희망들을 일깨워주는 포니.
“있잖아. 난 네 이름을 아직 모르는데.”
“난 이름이 없어. 언제나 여러 마리 사이에 끼여 불렸으니까.”
“정말 닮은 것 같아 너랑 나.”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부드러운 바람에 넘어가 그에게 기대어 잠에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감한 귀에 여러 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여왕님 이건...”
“넌 배고프지 않더냐. 형제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더냐.”
“그녀만큼은 안 됩니다 여왕님 부디!”
“비켜서라. 저 사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군단의 오늘 내일을 견디게 해줄 것 이야.”
“부탁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여왕님!”
“음? 잠깐, 너에게도...”
여왕님? 셀레스티아님일까? 아냐. 뭔가 무서운 목소리니까 나이트메어 문 인걸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어 감았다.
그에게서 이제까지 느껴지지 않았던 다급함, 간절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너에게도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어째서...!?”
잠시 멈칫하던 목소리 사이에 내가 끼었다.
“무슨 일 있나요...?”
“트루시...”
갑자기 콧바람이 느껴져 깜짝 놀랐지만 그땐 이미 입술을 맞닿았을 때였다.
“어...어브...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두근거림에 가슴이 터질 듯 기분이 부풀어 올랐다.
또박또박
그가 어디론가 걸어갔다.
“여왕님, 제 것을 드세요.”
“... 진심이냐. 사랑을 얻으면 그 달콤함에 빠져 잃을 때 아픔이 더 큰 법이다. 그리고 그 아픔을 저 망아지에게 주고 싶지는 않을 텐데?”
내 입술에 닿았던 건 분명 그 아이의 입술일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특별하고 소중한 포니...?!
“부디 제 것만...”
“...좋아. 청이 간절하니 들어주마.”
무언가 반짝인다.
초록색으로.
아무 것 도보이지 않던 눈앞에
초록색 광채로 무언가 보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사랑해 트루시”
얼마나 지났을까? 난 마을에서 일을 구했다.
꼭 눈이 보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부탁해서 하고 있다.
더 이상 그 수풀에, 그 축축했던 나무 옆에는 그 아이가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그 초록색 광채가 남아있다.
난 그만의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그는 나만의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그런 포니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