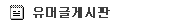가을을 타는 건지, 어쩐건지 몸이 계속 좋지 않았다.
컨디션이 뚝뚝 떨어지더니 추석 전 결국 앓아 눕고 말았다.
밤에 잠을 자다가 열이 나서 깼고, 형제님들이 잠든 방문 앞까지 네발로 기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몇 번을 두드리면서 "오빠아ㅠㅠ" 하고 말을 했는데, 기척이 없었다.
끙끙거리고 있는데 잠귀 밝은 큰오빠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나왔을때까지만 해도 이제 살았다 생각했는데) 내 손을 밟았다.
아무튼, 잉잉 거리면서 아프다고 했더니 큰오빠는 내가 손이 아픈줄 알고 손을 열심히 주물러 주었다.
나: 아파. 아프다고.
큰오빠: 좀 있으면 괜찮아져.
나: 아니, 아프다니까.
큰오빠는 거실 불을 켜고 체온계를 들고 나왔고, 체온을 재면서 집에 약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비상약도 없었고 정확히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결국 응급실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작은오빠와 막내가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새벽 기상을 했다.
큰오빠는 지갑과 차키를 챙기고, 작은오빠는 담요를 챙겨서 내 몸에 둘러줬다.
막내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번거로우니 큰오빠만 가겠다고 해서 일단 둘만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더니 별 이상은 없었다. 몸살기운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과 함께 해열제 처방과
링거를 맞고 아침에 귀가를 할 수 있었다. 큰오빠는 집에 오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고,
복학을 한 막내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방문을 열더니
막내: 나나, 이따 올때 뭐 사올까? 나나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사올까?
나: 아 됐으니까 제발 그냥 좀 가.
막내: 이따 봐. 푹 쉬어.
하고 집을 나갔다. 작은오빠는 오늘 집에서 쉬겠다며 쿨하게 죽을 끓여 시간 되면 먹였다.
아프다는 소식에 엄마가 한달음에 왔다. 평소에 잘 아픈 내색 않는 씩씩한 딸이 아프다니 걱정이 되셨는지,
오셔서 반찬도 좀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작은오빠랑 면담도 하고 '동네 친구들 모임'에 간다며 일찍 나가셨다.
그렇게 오후가 되어 갈 때쯤 방문을 열고 작은오빠가 들어왔다.
작은오빠: 체온 재. 체온은 정상이네. 뭐 먹고싶은거 없고?
나: 치킨
작은오빠: 아직 안 될 거 같은데.
나: 근데 먹고 싶은 건 치킨이야. 그거 아니면 별로 안 먹고싶어.
작은오빠: 먹고 안 아플 자신 있습니까.
나: 네, 있습니다!
몇 십 분 후, 우리는 치느님을 앞에 두고 있었다.
작은오빠: 아프긴 아픈가보다. 속도가 떨어지네.
나: 그냥 둬. 두면 계속 먹을 거야. 속도가 떨어진다고 안먹는게 아니거든.
작은오빠: 마니 드세요.
저녁시간이 되자, 막내가 바나나 우유를 열개나 사들고 왔고, 열이 제법 떨어진 나는 그것을 참 맛있게 먹었다.
저녁으로 먹고 싶은게 있냐고 묻는 큰오빠의 전화에, 오빠들이 끓여주는 라면이 먹고 싶다고 말했고,
속도 안 좋은게 라면에 치킨에 가지가지 한다고 욕을 먹었지만 결국 큰오빠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사들고 왔다.
조건은 라면보다 공기밥을 더 많이 먹을 것.
이 형제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오자마자 내 체온을 갖가지 방법으로 재보았고 아침보다는 열이 덜 난다는 것에 안도했다.
(큰오빠는 체온계를 찾았고, 막내는 손으로 짚어보았다)
막내 두개, 작은오빠 두개, 큰오빠 두개, 나 하나. 사람은 넷이지만 라면은 일곱 개, 계란은 세개.
이상하게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끓이는 라면엔 별거 들어가지 않는데도 입맛을 돌게 한다.
한동안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과 오빠들이 정성껏 끓여준 라면과 밥을 뚝딱하면서
나는 그날 그냥 그렇게 나아버렸다.
우리는 넷이고, 아플 때도 함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