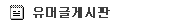작년 날씨 좋았던 가을로 기억한다. 아빠의 전화를 받은 큰오빠.
아빠: 내일 결혼식을 참석해야하는데, 못 가게 됐어.
큰오빠: 대신 가도 되는 자리예요?
아빠: 어, 뭐 사람 많을테니까 가서 내이름으로 축의만 해줘. 돈 계좌로 보냈어.
큰오빠: 예.
아빠: 시간 되는 애들 있으면 데려가서 밥 먹이고.
통화를 마친 큰오빠는 내게 "내일 결혼실 갈래?" 라고 물었고, "뷔페래? 뷔페야?" 라고 되물었더니
"아마도..." 라고 말을 했다. 그렇다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망설임 없이 옷을 꺼냈다.
버건디 색 미니스커트.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했던 H라인의 쫙 달라붙는 치마.
여성스러움의 극치, 어디 입고 나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만 가끔 입어보던 옷. 이거다.
셔츠와 가디건을 준비하고 치마까지 매치해보니 역시, 너무 예뻐서 숨을 쉬지 못했다. (ㅋㅋ)
작은오빠는 밥한번 먹으러 가는데 대체 왜 저 난리냐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예쁜 옷을 입는 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오래간만에 높은 하이힐 까지 준비를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큰오빠가 전화를 해서 (방에 잘 안들어오고 핸드폰을 이용한다) 잠에서 깬 뒤,
씻고 머리도 열심히 말고, 여자로 변신을 했다. 스타킹에 셔츠에 다 입고 마지막으로 치마를 입어보는데,
음? ㅎㅎ 좀 끼네. ㅎㅎ 역시 가을엔 먹성이 좋아진단 말이야.
숨을 참고 지퍼를 올리니 가을내 묵힌 살들이 치마 속으로 쏙 숨었다. 완벽해.
약속이 있는 막내를 제외하고, 큰오빠와 작은오빠와 함께 식장에 향했다.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의 결혼이라 인사만 하고 축의를 하고, 식 중간에 밥을 먹으러 갔다.
오래간만의 뷔페에 가슴이 선덕선덕했지만 보고있는 눈이 많아서 도도하게 고개를 들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정말 훌륭한 식장이었다.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물론 내가 입맛이 좋아서 그럴수도 있지만,
평소 식사량을 훨씬 뛰어넘게 맛있었다. 갈비찜에 초밥에 각종 튀김에, 디저트까지 완벽했다.
오빠들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차를 가져오지 않길 잘했다며, 평소 많이 먹지 않던 작은오빠도 과식을 했다.
작은오빠: 여기 진짜 맛있다.
나: 그러게. 결혼은 여기서 해야겠다.
작은오빠: 할 수 있을 것 같지? 못해.
나: 닥쳐.
큰오빠: 이제 슬슬 다른 사람들 내려오겠다. 커피는 나가서 마시자.
나: 오빠가 사주는 거야?
큰오빠: (작은오빠를 보고) 오빠가 사주시는거에요?
작은오빠: 살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기분 좋게 식장을 나서서, 우리는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좋은 날이었다. 가는 카페마다 만석이라 조금 많이 걸었더니 발이 아팠다.
간신히 카페를 하나 찾았고, 우리는 야외석에 자리를 잡았다.
신발을 벗어두고 구겨진 발에 자유를 주고 있었고, 그 사이 우리는 커피와 수다를 즐겼다.
오래간만에 오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다. 별 것도 아닌 말에 우리는 빵빵 터졌다.
웃음만 빵터지면 좋았을 텐데...
작은오빠가 막내가 억울할 때 짓는 표정을 따라했는데, 과장된 표정이었으나 자리에 없는 막내가 생각나서
웃음이 터졌는데, 피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뒤 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
그 순간 옆구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인사 한마디 없이 자유를 찾아 떠난 느낌이 들었다.
큰오빠: (바닥을 보며) 무슨 소리 안 났어?
작은오빠: 무슨?
큰오빠: 뭐 떨어졌어. 동전같은거.
나는 시원해진 내 옆구리를 문질러봤다. 방긋 입을 벌리고 있는 치마 지퍼.
달려있던 단추가 우드득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살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시작했던터라 가녀린 콘솔 지퍼는 견디지 못했다.
아... 아... 준비 못한 이별에 나는 그저 웃기만했고, 큰오빠는 계속해서 바닥을 두리번 거렸다.
나: 오빠.
큰오빠: 응.
나: 나 치마터졌어.
작은오빠: 뭐?
나: 치마. 치마터졌다고. 볼래?
큰오빠: 그게 왜터져?????????
그걸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다. 눈치없는 오빠같으니.
작은오빠: 일어날 수 있어?
나: 아니. 일어나면 흐르겠지.
작은오빠: ...
내가 미친듯이 웃기 시작하자, 오빠들의 안면근육이 긴장한 듯 팽팽해졌다.
큰오빠는 의자 옆으로 고개를 돌렸고, 옆구리를 보고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고 (가망없어) 곧 자신의 재킷을 벗어주었다.
큰오빠: 이거 덮고 있어.
나: 택시 불러줘. 나 집에 가고 싶어. 발도 아프고... 혼자 있고 싶고...
작은오빠: 너 우냐?
나: 내가? 허, 내가 운다고? 안우는데.
큰오빠: 우는거 같은데.
진짜다. 안 울었다. 가을 햇살이 좋았을 뿐.
큰오빠가 준 자켓을 두르고 화장실로 갔다. 치마 상태를 보니, 이것은 이제 다시 살릴 수 없겠구나 하고 알아챘다.
어떻게 잘 가리면 될 것도 같은데, 일단 치마가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 되지가 않으니까 나갈 수가 없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작은오빠한테 전화가 왔다.
작은오빠: 화장실 앞으로 나올 수 있어?
나: 나갈 순 있겠지. 대신 누가 보겠지.
작은오빠: 울어?
나: 안 운다니까.
작은오빠: 앞으로 나와봐. 전화 끊지 말고.
화장실 문을 빼꼼열고 보니, 앞에 작은오빠가 서있었다. 주위를 심하게 두리번거리는게 여자 화장실을 엿보는 변태같았지만,
나를 보고는 이내 입꼬리가 (비웃음에 가까운) 올라갔고, 동시에 쇼핑백을 쑤욱 내밀었다.
작은오빠: 평소에 넌 치마를 소중히 다루지 않았지.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나: 이거 뭐야.
작은오빠: 바지. 얼른 갈아 입어.
나: 사왔어?
작은오빠: 어. 큰형 춥대서. 빨리 자켓 돌려줘.
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은오삐: 안맞으면 어쩌냐.
즐거움에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작은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한켠으로는 소문이 나겠구나,
막내도 알고 아빠도 알고, 엄마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지를 받아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베이직한 청바지였다.
그래도 츄리닝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갈아입었고, 치마는 어쩔까 하다가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왔다.
어찌저찌 잘 마무리는 됐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날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버건디색 미니스커트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넷이고, 가끔은 빵 터지기도 한다. 다른 것도 터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