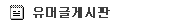그해 겨울은 따뜻했다.
마치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줄 때처럼..
6.
가끔 주말 그녀는 일거리를 들고 나의 자취방으로 찾아와 함께 일을 하고, 내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돌아갔다. 토요일 아침이면 혹시 그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평소 하지 않던 청소를 하고, 밀린 빨래를 세탁기안에 구겨 넣어 두고는 했다.
그리고 그녀가 찾아오면 내가 혼자 듣던 낡은 LP의 노래들을 함께 듣고 그녀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행복했다. 물론 혈기 왕성한 남자로서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엉큼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성성아. 너 이 문맥 한 번 읽어봐. 아무리 봐도 이상한 데..."
"괜찮은 거 같은데,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거 같아. 그런데 너 내가 자취방에서 너한테 혹시라도 덤비면 어떻게 할 거야?"
"뭘 덤벼? 네가 덤비면 내가 가만히 '아~ 수고하세요.' 이럴 거 같아? 네 불알 두 쪽 날아가는 거지."
그녀의 눈에 살기가 느껴졌다. 이 여자 정말 최소 몇 개는 박살 내 본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 뒤 그녀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밖에는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아.. 어떻게 가지' 하며 걱정하는 그녀에게 몇 해 전 어머니께 선물로 받은 목도리를 둘러줬다.
"추우니까 이거라도 두르고 가. 근데 그거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준 거니까 꼭 돌려줘야 해."
그녀는 목도리를 둘러주는 나를 보며 웃음기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야.. 너 잠깐 무릎 꿇어봐."
"왜?"
"꿇어. 꿇으라면.."
"남자가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라면서..." 라고 했지만,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잘했어. 기특해.' 라면서 평소대로 머리를 쓰다듬겠지 하고 생각했다.
작은 손으로 내 양쪽 볼을 잡은 뒤 그녀의 입술이 나의 두툼한 입술에 다가왔다. '이게 바로 첫 우리의 첫 뽀뽀구나....'
"잠깐! 나 한 번 안아봐도 돼?"
그녀는 나의 질문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날 처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녀를 처음으로 안고 서로의 입술이 닿았다. 그녀의 입술은 보드라웠고, 숨소리조차 달콤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많은 연인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해의 시작을 함께하듯 그녀와 함께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도 야근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야근이라니...하긴 선배는 아직 우리가 사귀는 것을 모르고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겠지' 생각하며 선배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까지 야근을 시키는 선배도 야근을 하는 그녀도 야속했다.
저녁 9시... 늦은 저녁을 위해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다. 또 주인집 아줌마의 음식물 쓰레기 잔소리인가 하며 문을 열었을 때
자신에게 버거워 보이는 큰 가방과 한 손에 초밥 봉투를 들고 있는 그녀가 서 있었다.
"어.. 오늘 야근 때문에 못 만난다면서..."
"야근하는데 내 새끼 굶지는 않을까 걱정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 너 밥은 먹었어?"
"아니, 지금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네 것도 끓일까?"
"내가 타이밍 잘 맞춰서 왔네! 오늘 같은 날 라면은 무슨, 이거나 먹어."
나는 사실 초밥을 아니 생선회를 먹지 못한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나를 위해 들고 온 그녀의 정성에
못 먹는 초밥을 그녀 앞에서 열심히 먹었다. 나를 쳐다봐 주는 그녀의 달콤한 눈빛은 생선 특유의 비린 맛을 없애주고 있었다.
"너도 좀 먹어."
"난 내 새끼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많이 먹어 내 새끼..."
"우리 정동진에 해뜨는 거 보러 안 갈래?"
나는 초밥을 먹다 말고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같은 날 가면 사람에 치여서 해뜨는 거 못 봐. 가는 데도 고생, 가서도 고생이야."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너랑 같이 해뜨는 거 보고 싶어."
"됐어.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 바로 집에 가야 해. 너 먹는 거 보고 바로 갈 거야."
"아.. 그렇구나." 나와 다르게 그녀는 서울에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르게 얌전한 새색시처럼 천천히 초밥의 밥알 하나하나를 씹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내 새끼 다 먹은 거 봤으니까. 가야지. 청승맞게 혼자 술이나 마시지 말고. 일찍 자!"
"응 그래야지. 이따 연말 연기대상이나 보고 잘 거야."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과 함께 문밖으로 나섰다. 10년 넘게 혼자 연말을 보냈는데, 외롭고 허전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다. 창문에 기대 담배를 피웠다. ' 제길 눈이라도 내리지.....그래야 눈내려서 못 나갔네 하는 생각이라도 드는데...'
"띵똥.."
이번에는 정말 주인집 아줌마겠구나 싶어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내게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하고 '외박 성공'하는 그녀가 서 있었다.
내가 정말 외로웠나. 마치 엄마를 며칠간 보지 못하다 본 아기처럼 눈물이 나려 했다.
"너 집에 가야 한다며..."
"너도 오늘부터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너 나한테 설마 밀당한거냐?"
"미친.. 이미 넌 내게 잡힌 고기인데, 내가 너한테 밀당을 왜 해. 찌질하게 혼자 궁상떨고 있을 거 같아 와준 건데, 나 그냥 갈까?
집에가다가 네 생각나서 **이 집에서 놀다가 자고 온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아니.. 아니야.. 가지마."
그녀를 안았다. 추운 밖에 있다가 온 그녀인데 작은 그녀의 품은 너무 따뜻했다. 자연스레 나의 입술이 그녀에게 향했다.
"널 안으니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가 생각난다."
"훗. 내가 너한테 나타샤야?"
"아니 흰 당나귀?"
"뭐야.. 나 그럼 진짜 간다."
"넌 나한테 나타샤도 돼고, 흰 당나귀도 돼.."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지으며 말했다.
누추하고 작은 방에 그녀의 등이 닿았고, 곧 나의 어깨는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내 등을 어루 만져주는 그녀의 손길도 그리고 그녀의 숨소리도 좋았다.
"우리 내일 만날까?" 그녀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응.. 내일도 모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