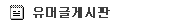제 글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 남자가 있었다.
첫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끌려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려서 그 남자를 만났고, 언제나 애걸복걸 하는 쪽은 나였다.
이걸 인정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당시 따로 살던 두 오빠들은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큰오빠: 그렇게 한쪽이 기울면 오래 못가.
작은오빠: 얘 연애할 줄 모르네. 니가 안달복달 하면 되겠냐?
나: 그게 뭐가 중요해.
큰오빠: 적당히 좋아해. 뭐든 지나치면 마음 다치니까.
작은오빠: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빠들이 걱정할 때, 막내는 항상 물었다.
막내: 잘 생겼어? 잘생겼냐고?
오빠들의 염려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걸렸다.
봄이 되었고, 벚꽃놀이를 가자 했던 약속은 처참히 깨졌다.
나는 혼자가 되었고, 내 일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가 없어졌다는 것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감정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일상이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밥을 먹다가도 울었고, 양치를 하다가도 울었다.
수업시간에 숨죽여 울던 날도 있었고, 영화관에 혼자가서 슬프지도 않은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기도 했다.
막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개인적 사생활에 대해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는 상대는 단연 막내였다.
한강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힘겨운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막내였다.
내 자존심에 친구들에게 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죽는 것 만큼이나 어려웠기 때문이다.
밥을 한 동안 먹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리 유난을 떨었나 싶지만
그 때는 밥이 모래알 같았다. 주인 없는 마음이 커져서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봄, 학교에 막내가 찾아왔다. 쩌렁쩌렁 복도를 다니면서 나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막내가 창피했다.
나: 핸드폰 뒀다 어디다쓸래?
막내: 이 건물에 있다길래, 부르면 나오나했지.
나: 진짜 멍충이.
막내: 밥 안 먹었지? 밥 먹으러 가자.
나: 안 내켜. 안 먹을래.
막내: 안돼. 큰형이 돈 줬단 말야. 나나 밥 먹이라고.
막내를 데리고 내키지는 않지만 학교 근처에 있는 벚꽃나무 아래로 갔다.
막내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잔뜩 꺼냈다. 열어보니 각종 과일이었다.
막내: 나나 과일 좋아하잖아. 밥은 안 먹을 거 같고 이거는 먹을 거 같아서.
나: 이거 어떻게 먹어. 칼도 없는데.
막내: 칼이 왜 없어.
막내는 가방에서 자연스럽게 식칼을... 꺼냈다.
흉기를 꺼내는 해맑은 막내의 표정에 지나가던 사람이 흠칫 놀랐고, 내 얼굴은 아마 화끈거렸을 것이다.
막내: 집에 과도가 없더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과일들을 깎아내는 막내를 보자니 갑자기 피식 웃음이 새나왔다.
막내: 웃었다. 그치?
나: 안 웃게 생겼냐.
막내: 웃었으면 됐지. 형들이면 더 많이 웃겨줬을텐데.
나: 됐거든요.
깎아 놓은 과일들을 입에 넣었다. 뭘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신맛이 단맛이 느껴졌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누나니까 울지 않기로 했다.
막내가 칼을 씻어야 한다며,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지만 않았어도 울뻔 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지만, 혼자가 아닌 채 봄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새벽이고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글을 썼다.
지금은 웃으며 말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단지 헤어진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고, 막내는 빨리 참외를 깎아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