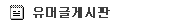베오베간 ”한국사람 정 많다는 개소리는 질린다”란 글을 보고
캐나다 5년 생활하면서 겪은 썰을 좀 풀어 볼까한다.
자유가 없어 없슴체로 쓸가 했는데... 잘모르겠다 필력이 없으니
그냥 내맘대로 쓰고 또 아무 반응 없으면 조용히 자삭이나 해야겠다.
2001년 6월 1일 6개월만 영어하면 생활영어가 가능하다는 출처 불분명한 찌라시를
듣고 이억만리 캐나다 밴쿠버로 무작정 여정을 떠났다.
6개월에 생활영어가 가능하다면 1년 있으면 영어 마스터 하겠네 하는 순진한 생각 반에,
외국에 살면 영어가 저절로 늘거라는 무지 반에
사전에 준비도 없이 글자 그대로 겁없이 뛰어든 어학연수길이 어떻게 펼쳐 질지 짐작도 못한체....
첫관문인 이미그레이션에서 맨붕에 바찔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ESL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토론시간 주제로
자기가 가본 외국이나 여행 뭐 그런 경험을 얘기할 때 안거지만...
캐나다가 난생 처음 하는 해외여행인 사람이 같은 반에 오직 나 혼자였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내 손에 들려진 알아먹지 못할Declaration Card에
어벙벙하는 모습은 응상의 삼천포의 첫 상경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소심한 성격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쉽게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남들 조렇게 간단하게 작성 하는 거 왜 나만 못할까” 하는 자괴감에
거의 한 시간쯤 쩔쩔 매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래도 좀 친절해 보일 것 같은 한국인 남자를 하나 골라
나: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한국인 남자: (Declaration Card를 뒤집으며) 여기 그냥 없다고 다 체크하세요!
그제서야 한 면은 영어와 다른 한 면은 불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 맥도날드에서 빅맥하고 오렌지슈를 주문했는데 음료수로 커피가 나왔지만
쪽팔려서 그냥 먹은 일화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쩌는 포스로 위화감조장하는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들을 클리어 하고
입국장으로 나오는것은 그당시 정말 살떨리는일이였다.
입국장을 나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사서 동전으로 바꾼 뒤
알려준 데로 X옥X 유학원에 전화를 걸었다.
택시타는 곳으로 가서 조금 기다리고 말한 그 짧은 한국말 한 마디가
무슨 무인도 같은 곳에 한 10년을 갇혀있다
처음 타인과 하는 대화인양 무지 반갑고 또 울컥하기 까지 했다.
난관을 해쳐 나오느라 미쳐 의식하지 못했던 통증이 귀속 뇌까지 파고 들기 시작했다.
물론 비행기가 밴쿠버 도착 할 때쯤부터 아프기 시작했었지만
타이밍을 놓쳐 이제서야 언급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2학년때 처음 귀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귀가 마치 찟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물론 엄청 큰 면봉을 귀속으로 쑤셔 밖은 고통을 한번더 껵어야 했지만....
어찌됐든 그때의 고통보다 지금은 고통은
불안감과 낫 설음 등 의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 첫 날인데... 쓰고 보니 쓸대없는 내용에 장황하기까지 하네요...
반응바서 뒷이야기도 하겠스니다.
퇴근시간이 다되서 오늘은 여기까지마 쓰겠습니다.
반대주시면 상처받는 소심한 오징어 입니다.
재미없으시면 그냥 가볍게 뒤로가기 버튼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