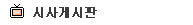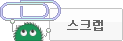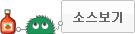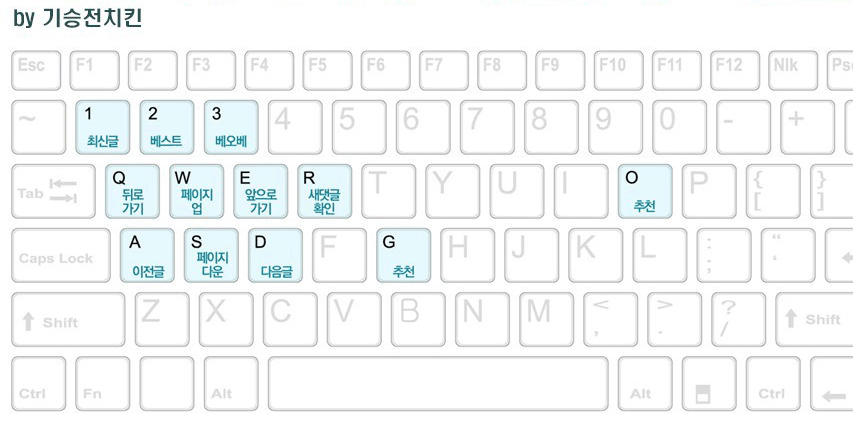나꼼수는 진보 특히 입진보를 깔 때 베충이와 유사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정치를 신념이나 이념의 실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의 역학 관계로 보지요. 근본적 마키아벨리즘의 군주론이나 들뢰즈식의 우파적으로 전유 된 '욕망' 따위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나꼼수)의 시선에서 보면 신념이나 이념에 묶여 힘의 역학 관계를 보지 못하는 진보는, 힘의 현실을 모르는 입만 산 진보가 됩니다. 비웃음 거리죠.
김어준은 자신의 저서에서 꼴에 진보에게 이런 충고를 늘어 놓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그는 이렇게 충고 한 거 같습니다. 정치는 사랑이야.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훔치냐. 기술.. 이거라고. 아가페 사랑? 꺼지라고 그래. 기술이라고! 근데 이런 논리를 극단적으로 보면 10선비라고 비꼬는 베충이들의 태도와 그리 다를바 없습니다. 아니 베충이야 말로 냉소주의의 극이죠.
냉소주의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냉소주의는 기존의 상징적 질서 그 밑에 숨겨져있는 더러운, 그 상징적 질서 속에 감춰진 간 욕망들을 들춰내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예를들면 조선시대의 봉산 탈춤이나 그리스 고대 문명에서 견유주의 학파를 이끌었던 디오게네스나 심지어 기독교 문명에서도 이와같은 냉소주의가 기록되어 있죠. 조선시대의 풍자 문학이란 것도 비슷하고요. 까 놓고 보니 거기에 세속적인 욕망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걸 폭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대까지는 이런 태도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징적 질서 속에 위선을 까면서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보면 종종 너는 이데올로기에 미쳐서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이런류의 주장들이 이데올로기 비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과거의 냉소주의와 현대의 냉소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꼼수(김어준)과 베충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과거의 냉소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현실이라는 것 그 밑 바탕에 왜곡되고 모순적인 욕망들을 들춰냈다면, 오늘날의 냉소주의는 그 현실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꼼수에는 양당 구조가 현실이고, 베충이들에게는 국가=대통령론이 현실이겠지요. 핵심은 근래의 냉소주의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자는 윤리적 언명에 냉소적으로 대응하는 논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현실인데 선동 당하고 이념적 색체가 강하고 그런류의 태도들에 냉소지으며,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게, 즉 이데올로기가 비록 거짓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게 뭐 어떠냐?뭐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나꼼수가 말하는 힘의 관계라는 것도(들뢰즈식 욕망론이라고 썼지만, 들뢰즈는 절대 요런 수준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양당이라는 하나의 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여당을 누를 것이냐... 요 수준이지, 절대 상징적 질서 아래 있는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드러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즉 그들이 알고 있는 현실은 상징적 질서 밑에 있는 노마드가 아니라, 상징적 질서 놀음(양당 구조)을 그 자체를 두둔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베충이도 보면 온갖 할 말은 다 할 거 같으면서 정작 박정희 발전론 같은 관념적인 역사론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가=대통령이라는 기호를 전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상징적 질서를 의심하지 않는(아니 의심은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비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상주의자라고. 허나 역사는 계속 변해왔고, 현실이 계속 그 현실로 있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들이 관념주의적 태도라면?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즉 과거의 냉소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태도였다면(그래서 상징적 질서 밑에 본질을 드러내 충격을 줬다면..), 오늘날의 냉소주의는 이데올로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진보나 좌파겠지요)을 비웃고 냉소하는 그런 역전된 태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나꼼수를 듣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나꼼수는 절대 베충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윤리적이라는 것은 옳다의 문제지만, 나꼼수는 기본적으로 명박이를 까고 있어도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로 봅니다. 옳다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 유용하냐~ 이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꼼수는 옳음을 견지하려는 진보를 냉소하고 싶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태도는 베충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