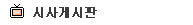평서체로 쓰겠습니다.
우선 ‘평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자.
평ː론評論〔-논〕 [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사물의 질이나 가치 따위를 비평(批評)하여
논함, 또는 그러한 글.(다음 국어사전 참조)
이것을 하는 사람을 ‘평론가’라고 하며, 특정분야로 한정될 때 그 앞에 분야의 이름을 쓴다.
‘영화평론가’라 하면 영화의 질이나 가치 따위를 비평하여 논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평론가의 기본적인 의무가 ‘질’과 ‘가치’를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질’은 ‘질’대로 ‘가치’는 ‘가치’대로 따로 떨어뜨려놓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질’과 ‘가치’의 상호보완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과 파급력,
그로 인해 예상되는 미래 영화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등을 하는 것이 이 ‘평론가’의 역할이다.
D-WAR와 관련한 문제의 촉발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평론가들이 D-WAR에 대해 ‘25자평’형식을 빌려 ‘질’을 ‘비판’했을 뿐
조금 더 지면을 할애해서 행해졌어야 할 ‘가치’에 대한 ‘평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직업인데도 말이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평론가들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가치’를 외면하는 행태를 두고
네티즌들은 ‘충무로의 음모’ 또는 ‘기득권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논의를 옮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일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관점이 읽히기도 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자.
‘평론가’들은 - 최근 읽은 하재봉씨의 평론을 제외한곤 - 대부분 D-WAR는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한다.
영화의 내적인 측면에서의 ‘평론’이다. 스토리, 연출, 연기력 모두가 조잡하다고 한다.
이것을 ‘비난’할 순 없다. 아무리 ‘평론가’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니까.
또한, D-WAR를 옹호하는 많은 네티즌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스토리부분의 개연성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평론가’들이 딱!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이다.
‘질’을 평론한 다음에는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순서를 빼먹었는지, 잊어먹었는지
‘가치’에 대해선 제대론 된 ‘평론’이 전무한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다. -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음모론’이 파생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이 ‘발견’한 영화적 ‘가치’가 ‘평론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가치’의 ‘평론’이 다를 순 있을지언정 ‘가치’에 대해선 언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반복하지만, 못 본 것인가?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D-WAR를 악평한 ‘평론가’들이 외면한, 아니면 배제한 D-WAR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미 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거론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면,
700억이라는 저예산(?)으로 완성한 독자적인 CG기술력의 가치.
심형래가 개척해 온 ‘어린이영화’ 또는 ‘가족영화’로서의 영화적 의미.
한국 영화로서는 가장 많은 미국 1500개 극장에서의 개봉에 대한 의미와 분석.
그것이 성공 또는 실패했을 때 가져올 국내외 영화시장에서 파급효과.
향후 국내 영화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장르의 다양성 또는 한국블록버스터에 대한 펀딩 등등
‘심형래감독’개인에 대한 ‘평론’은 배제하고서라도 영화적으로 논의 돼야할 많은 ‘가치’가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평론’이 아주 쏙! 빠졌다는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평론가’뿐만 아니라 논란의 한 축이 된 영화감독 ‘이송희일’씨나 영화 제작자
‘김조광수’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욱이 ‘평론가’들과는 달리 ‘심형래감독’과 비슷한 처지(제작자와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를 분석하고 봐라봤어야 함에도 - 그들이야 말로 제작비를 모은다거나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영화를 만든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텐데도 - 불구하고 오로지 영화의 ‘질’과 ‘애국주의’마케팅이라는 시각으로만
영화의 흥행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영화의 ‘가치’적인 면을 애써 외면했다는 것은
그들이 D-WAR의 흥행을 ‘시기’하고 있거나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공격했다.
첫 번째 논의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촉발됐음을 인지했다면 ‘평론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
당연히 자신들의 부족한 ‘평론’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시의적절한 ‘평론’을 내 놓았어야 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네티즌들의 ‘항의’를 ‘애국주의’의 기인한 집단행동으로 폄하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두 번째 논란이 촉발된다. 바로 ‘애국주의 마케팅’에 대한 날선 비판이다.
네티즌들이 ‘평론가’들에게 가진 불신의 감정이 위에 글의 내용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은 애써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진의’를 무시하고 네티즌들의 ‘평론가’들에 반발을
‘애국심 마케팅’에 기인한 ‘집단행동’으로 몰아붙였다. 진중권씨 조차도 말이다.
이것에 대한 논란은 많은 글들에서 거론되고 있으니 따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하겠다.
문제는 그들의 임기응변식 대처로 거론한 D-WAR의 ‘애국주의 마케팅’에 대한 ‘비평’이
그들 스스로를 옭아매는 오라줄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벌써 많은 네티즌(미래의 영화 관객)들은 앞으로의 한국영화에서 철저히 ‘애국심’을 배재하고
작품성으로만 영화를 선택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웠지만
‘한국영화’라는 애정 섞인 감정으로 영화를 선택하고 그 영화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격려’해 왔던 네티즌들은 앞으로 ‘한국영화’에게 보냈던 ‘따뜻한 시선’을 거두어들일 태세다.
‘평론가’들의 저급한 ‘평론’과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 그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애국심 마케팅’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이 상당히 ‘차가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평론가’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평론’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D-WAR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들이 꺼내 놓은 편협한 ‘평가’가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몰아놓고 있다. ‘직무유기’는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