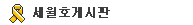말 잘 듣는 교육의 대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09093608322&RIGHT_REPLY=R2
이제 서서히 잊혀갑니다.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 이 거짓말에 대한 혹독한 대가 말입니다. 눈앞에 물이 차오르는 걸 보며 유리창을 긁었던 아이들, 발을 동동 구르며 끝내 자리를 지켰던 그 마지막 말입니다. 온 나라가 그토록 분노했지만, 참사 60일 가까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일상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재난사의 한 획을 그은 세월호 참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잔혹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에 대한 적나라한 은유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받아 왔나요. 멋 좀 부리겠다고 머리 좀 길러도, 좀 튀는 잠바를 입어도, 교복 좀 줄여 입어도, 모자를 써도, 모든 게 다 일탈입니다. 규정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신체까지 통제했습니다. 머리 좀 기르는 게 어떠냐고 따져 물으면 버릇없는 녀석이 됩니다. 선생님의 말은, 어른들의 말은 무조건 옳았습니다. 그 말을 의심하는 게 반항이라고 치부될 정도로.
이것뿐 인가요. 평가와 서열 속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시험은 아이들을 1점 단위로 미세하게 갈라 놓습니다. 아이들도 이게 맞는 걸까 의심하면서도 그 틀 안에 철저히 예속됩니다. 앞만 향해 달립니다. 우리 교육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길은 오직 성적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말고는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됐습니다. 아니,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은 남과 다르게 사유하는 방식을 강탈당했고, 그렇게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어른 말이라면, 선생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교육의 대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이들이 토해냈던 비명은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4년 전 출간된 독일 전문가 박성숙의 '독일 교육 이야기'는 세월호 이후 우리 교육에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20세기 초반, 독일은 주입식 국민 교육제도의 수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키운 건 전쟁과 인종 우월주의란 괴물이었습니다. 전후 독일 교육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쟁은 필요 없다, 한 두 명의 뛰어난 사고보다 모두의 깊이 있는 사고를 원한다는 해법입니다. 알파벳을 배우는 데 1년,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 데 1년. 손가락을 사용하던 발가락을 사용하던 어른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행학습은 다른 아이의 질문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회,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사회, 이게 독일 교육이 말하는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독일 아이들이 세월호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으라는 어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독일이 부러운 건 경쟁이 없는 교육만큼이나, 참사의 원인을 교육 때문이라고 과감히 인정하고 개조해나가는 시대정신과 그 출발점부터 고민하는 철학입니다. 참사 이후 우리 권력의 해법은 어땠나요. 수학여행 전면 중단과 안전 교육 강화입니다. 권력에게 되묻습니다. 수학여행을 중단하면 정말 참사가 예방될까요. 그건 참사 예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참사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 모면책 아닌가요. 안전교육은 또 어떻게 할 요량인가요. 침몰하는 배에 타면 가만히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물에 뛰어들라고 교육시킬 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식대로라면, 차는 차대로, 배는 배대로,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지진은 지진대로, 홍수는 홍수대로 아이들에게 매뉴얼을 보급해 암기시키고 시험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영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따져 묻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존재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사육하고, 1점 단위로 서열을 매기는 우리 교육은 이런 아이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