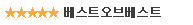MB의 반말과 노무현의 ‘막말’
[기자칼럼]
2009년 09월 21일 (월) 17:56:13 김세옥 기자
[email protected]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가장 불쾌한 부류는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이들이다. 어느 정도 친밀함이 쌓인 윗사람일지라도 공적 공간에서 공적 업무를 할 때 반말을 하면 인격이 훼손되는 것 같아 유쾌하지 않은데, 처음 만난 이가 다짜고짜 반말부터 내뱉는다면 두고두고 ‘재수 없는’ 인간으로 기억되기 십상이다.
반말, 특히 초면의 반말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뭘까. 말은 하는 자의 품격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상대의 위치를 규정하는 기능도 한다. 통상 조직에서 새내기가 선임자에게 공적 공간에서 반말 비슷하게라도 하면 세상이 뒤집힐 듯 난리가 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아래도 모르는 ‘싹수없는’ 인종이란 낙인찍기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시나마 관계의 전복이 재미의 핵심인 ‘야자타임’에서도 적정선을 지키는 중용의 미가 덕목으로 꼽힐까.
이처럼 ‘반말’이 한국 사회에서 마주 선 이의 (신분·계급과 같은) 위치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서민 행보’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말 퍼레이드’와 이에 눈감고 있는 언론의 태도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모습. ⓒ청와대
열흘 전 쯤 뉴스에 나온 이 대통령의 모습을 한 번 복기해보자.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상황을 점검한다며 지난 10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동원 논란이 일 만큼 많은 인파가 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여 들었고, 한 상인이 이 대통령의 입에 자신이 파는 음식을 넣어준다.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인파 속 하나의 목소리가 튀어 나온다. “맛이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이 대통령이 대답한다. “아직 안 넘어갔어.”
화면 속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필자의 눈살은 찌푸려지고 있었다. 어쩌다 나온 ‘분위기 띄우기용’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반복된 장면이었고, ‘친밀함’으로 해석하기엔 인터넷 공간에서 불쾌감을 표시한 누리꾼들이 이미 여럿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 당시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내가 젊었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할 땐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라며 거침없이 반말을 사용했다. 이에 앞서 5월 20일 모내기 행사에서도 새참 시간 옆에 앉은 주민에게 “아줌마도 한 잔 해” 등 반말로 일관했다. 그리고 해당 모습이 두 차례에 걸쳐 YTN <돌발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 무시’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말’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경우 일련의 논란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이 더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본 걸까. 언론관계법·4대강 살리기 등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줄곧 반대하는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국민을 대통령 ‘아래’ 신분으로 늘어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반말’에 대한 다수 언론의 불감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2003년 5월 21일) 등의 발언을 앞뒤 잘라 보도하며 국민 무시의 ‘막말’로 규정했을 만큼 ‘막말 감수성’이 예민한 신문들이 ‘존중’의 기본 잣대인 ‘반말’에 대해선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긴,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영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영어가 모국어인 부시 대통령도 틀릴 때가 있다’고 위로(?)하면서 되레 이 대통령을 ‘실용영어의 대가’라고 치켜세우던 언론들에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대통령의 반말 행보에 대한 다수 언론의 침묵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이 국민과 마주한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등의 존댓말을 사용할 줄 알았음이 그나마 다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스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