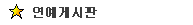[A : 너의 XX가 불편해. 짜증나. 그리고 이건 내 취향이야.
B : 그래? 난 네 말투가 졸라 짜증나고 불편하다.
A : 뭐야? 내 말투는 내 취향인데 넌 무슨 상관?
B : 내 XX도 내 취향이거든?
A : 아 어쩌라고. 내 눈에 보이잖아.
B : 니 말투도 내 귀에 들리거든?
논의의 장에 '취향'이 끼어들면 이야기는 대개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마치 유치원 다닐 즈음 애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반사 놀이'가 떠오르지요. "너 바보", "헐, 반사.", "반사", "반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번 해보다가 노잼인 걸 깨달은 애들이 그냥 관두죠. 헌데 이 반사를 둘만 하지 않을 때는 양상이 좀 변했습니다. 한 놈이 반사를 외치는데 반대편에서 열 명이 반사를 외친다고 생각해보죠. 아니면 열 놈과 열 놈이 그 짓거리를 하거나요. 금새 '왕따 놀이' 혹은 '패거리 싸움' 둘 중 하나가 되어버릴 겁니다. 놀이가 놀이로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반사 놀이' 안에서 '반사'의 사기적인 성능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지껄이든 반사만 외치면 땡이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취향 존중에도 있니다. 어떤 논쟁의 영역이든 "이건 내 취향이고, 취향은 존중받아야해!"를 외치는 순간 모든 게 뒤틀립니다. '취향'이라는 성역에 논리가 접근할 여지가 없고, 그 이후부터 논의는 철저하게 '어떤 취향이 더 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가'라는 패싸움으로 번져요. 즉, '논의'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전 여럿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는 공간에서 '취향'이라는 표현을 끌고 나오는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공론장에서 특정 발화가 의견으로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 다들 나름의 논리와, 대상에 맞는 사례를 끌고 옵니다. 하지만 취향은 상대 의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면서도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단순한 '거수 대결'로 양상을 바꿔버리고요. 무엇보다 말하고 있는 대상과의 거리감과 대상 자체가 자기가 느낀 반감의 이유와 정도 또한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화자 자신에게도 말이죠.]
[pgr21의 자유게시판 `팟저`님의 `취향 존중과 시민 문화`] 글중 일부입니다. (위낙 좋은글이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혼란한 오유를 보며, 같이 보면 좋은 글의 한부분 같아 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