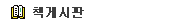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인 남편에게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문판을 선물했습니다.
반년이 훨씬 지난 얼마 전부터 남편이 읽기 시작했고, 저도 한글판을 사 놓기만 하고 읽지 않았던 터라 뒤이어서 읽었어요.
별 대단한 대화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눈으로 읽은 채식주의자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써봅니다.
대화1.
남편: 이 소설을 읽다보니 내가 그래도 다른 서양인들보다 한국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 ?
남편: 여기 보면, 채식주의자 남편이 "(일때문에)몇달동안 자정 전에 집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거야. 근데 나는 한국에 대해 아니까, 이게 모든이의 일상은 아니라하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건 알잖아. (뿌듯!)
나: 아... 네... 그러십니까...
남편: 그리고, 채식주의자 아버지가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장면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면 "이 소설은 공포소설이야?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어! 그리고 주변에 가족친척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도 알지.(뿌듯!)
나: 네... 훌륭하십니다...
대화2.
남편: 자기 아직 채식주의자 안읽었지?
나: 어, 이제 읽으려고.
남편: 이 책을 읽고나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채식주의자와 그 언니의 남편들에 비하면 우리남편은 참 착하다"라고 생각해줄테니까. 데헷!
나: .... 비교 대상이 그 수준이 되어야하는거야?
대화3.
남편: 으....
나: 왜그래?
남편: 그럴 때 있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저 시간이 지나서 집에 갈 수 있는 때가 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
나: 어...?
남편: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게 그 느낌이랑 비슷해. 등장인물들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아악!! 그러지 마!! 아악!!"이란 느낌이 드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거든.
나: .... 그정도로 이입이 됐어?
남편: ㅇㅇ. 그래서 차라리 빨리 이 책을 끝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빨리 읽으면 그런 상황이 더 가속되니까 더더욱 고통스러워.
나: ... 너 생각보다 감수성이 예민했구나...
남편: 너도 빨리 읽어서 나의 고통을 느껴봤음 좋겠다.
*하지만, 전 남편만큼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았기에,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화4.
나: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남편: 그게 왜?
나: 김치에는 젓갈이 들어가거든.
남편: 그게 뭔데?
나: 생선 엑기스 같은거.
남편: 젓갈이 안들어가는 김치는 없어?
나: 굳이 젓갈없이 담글수도 있긴한데... 장면상, 채식주의자 언니가 만든 김치라 일부러 젓갈을 빼고 담그진 않았을거 같거든. 마요네즈에 들어간 계란 때문에 샐러드도 못먹는다고 하면서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먹는 게 뭔가 이상해. 차라리 "밥이랑 나물만 먹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남편: 흠... 김치가 너무 일상적이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
나: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아이스크림도 먹어.
남편: 아니야. 아이스크림 안먹어.
나: 지금 읽고 있는 장면에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남편: 아이스크림 아니고 갈은 얼음shaved ice이야.
나: "그녀는 혀끝에 흰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눈을 떴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 영문판에서는 팥이 들어간 갈은 얼음shaved ice(팥빙수??)이라고 나와.
나: 오... 진짜네...
남편: 그리고 한국에서는 크림이 안들어간 셔벳 종류도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거 아닐까?
나: 아냐, 여기에 "핏기 없는 입술가에 흰 크림이 묻었다"라는 표현도 있어. 셔벳이라면 크림이라고 쓰지 않겠지.
남편: 아무래도 서양사람들이 이런 채식주의자에 대해 더 익숙하니까 번역자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바꿨나보다. 근데 확실히 이 책 영문판 번역이 정말 잘되어있어. 번역된 책이 이렇게 흡입력이 있기 쉽지 않은데, 완전 빨려들어가면서 읽었어.
나: 어, 번역이 아주 잘되었다고 하더라.
내용 좋고 번역 잘 된 한국 소설 있으면 더 추천해주고 싶긴 한데, 저도 책을 그리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 쉽지 않네요.
하버드와 공동으로 만들었다던 바이링궐 에디션 한국대표소설 시리즈 세트 선물했는데, 번역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하다(너무나 학구적이다?)라고 했고,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도 평범했다고 하더라구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같은 책은 신파조를 증오하는 남편이 엄청 싫어할 종류라서...
김영하 작가의 작품은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 남편도 좋아할 것 같아서 영문판 나온 책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번역이 잘 되어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