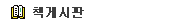참으로 어렵다, 고 적요(赤銚붉을적냄비요)는 생각했던 것이었다. 근래 들어 찬찬히 읽지 못하고 여러 책을 쌓아둔 채 휘적휘적대는 못된 습관이 생긴 그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해 머리를 곪아댔던 것이다. 해방 이후이니 근대 작품이라 해도 될 법한데 읽히는 리-듬 자체가 매우 낯선 것이어서 도저히 가까워지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땅의 근대문학에 대해 (아직 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자신의 무지 탓이 아닌가라며 습관적인 자책보다도 심한 이갈이같은 자책을 해대며 때로는 스스로를 ‘bottle god'이라고 욕해대며 그는 그렇게 읽어나갔으나 사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리라 아마도 이 책은 해설과 함께 읽어야 할 것이라고, 또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다면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게으르게도 수업시간에 꿈 속을 헤매이느라 그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을 수도 있을 테다. 그렇다면 그가 이 21세기 첨단의 시대에 제 밥벌이 하나 건사하지 못해 비척비척대는 것에 남 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날 이후, 달수(達壽)는 자기가 살아 있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대량 살육이 자행되었던 6·25 때가 아니라 그러한 불안은 실로 그날부터였다. 따라서 자기는 왜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을까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이 bottle god아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함께 광장에 나와서 사회 탓을 하자 라고 함부로 (정답을) 말하지 말라 나는 지금 6·25 직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적요(赤銚)는 텅 빈 건넛방에 대고 강변하였다. 심지어 박정희가 등장하기도 전이다. <혈서>에 등장하는 이 좁고 시끄럽고 칙칙한 집의 벽지가 무슨 색이었을지도 그는 감히 상상해내지 못했다. 참말로, 참말로 그는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간신히 <오발탄>(유현목,1961)등의 영화에서 본 몇몇 장면을 떠올려 볼 뿐이었다. 아직 백년은 커녕 겨우 반백년 좀 넘게 지난, 자신이 한 번도 벗어나보지 못한 한반도 땅의 지난 시간이 생성해 온 공간의 ‘원광경’에 대해 그는 참말로, 참말로 무지했던 것이었다. 차라리 존 포-드와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들을 통해 생성된 양키의 19세기 개척시대 양옥집의 벽지나 일제의 20세기 중반 다다미 방의 원광경-이미지덩어리들이 그에게 더 익숙함을 깨닫고 그는 망연자실하였던 것이었다.
“(중략)지구상에 있는 이십여 억 인류의 그 누구와나 꼭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우연히 살아 있는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적요(赤銚)는 적요 속에서 다시금 생각하였다. 그는 이 가까우면서도 먼 시대의 입구를, <혈서>의 도입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척비척대며 집으로 돌아오는 달수(達壽)가 골목에 드리운 그림자 속을 더듬거리며 찾고 있다. 참으로 멀면서도 가깝다. 왜 이토록 가까이 있었는데도 멀어져 버렸던 것인가.
<비 오는 날> (손창섭,문학과지성,2005)
* 책 끄트머리에 수록된 ‘작품 목록’에 따르면 <혈서>는 1955년 1월 ‘현대문학’을 통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