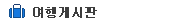태평양을 지나면서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서쪽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더니 영종도 앞바다를 가까이 한 바퀴 돌더니 이내 방향을 바꿔 동해로 향했다. 샌프란시스코까지는 10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단다. 비행기는 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지났다. 금새 동해의 푸른 바다가 나타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 비친 비행경로는 독도 바로 아래를 지나 일본의 허리를 가로 질러 태평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독도ㅡ
참으로 억세고 질긴 땅 독도.
그 억세고 질김이 꼭 이 땅의 민초를 닮았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 섬을 지금 옆으로 지난다.
야심한 시각 탓이기도 하거니와 좌석이 비행기의 한가운데여서 독도 아래 너른 바다는 보지 못했다. 깜빡 잠이 든 시간 동안 비행기는 일본 열도 허리를 가로질러 태평양 너른 바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일본 열도의 허리는 마치 개미허리 같았다. 그 좁고 긴 땅의 사람들은 한 시도 우리를 편안케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보는 대륙은 늘 한반도의 너머였다. 까치발을 들고서야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이 보이니 늘 한반도가 눈에 거슬릴 수밖에.
두 나라는 가까워질래야 그럴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난 모양이다. 조금만 양보하고 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을 터인데 두 나라는 그런 것에는 침묵한다. 사실 그건 순전히 정치인들의 몫이다. 그들은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정치인들이 보는 모든 상황은 득표와 연결된다. 어느 쪽으로 행동해야 표가 모이는지 그것 만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독도도, 위안부도, 세월호도 모두 그들에게는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표다. 이러한 표는 개개인의 표의 합보다 늘 많았다. 우리는 군중일 뿐이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군중일 뿐이다. 정치인들은 진작에 그걸 간파하고 우리를 양떼 몰듯이 몰아간다. 우리는 몰림을 당하면서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위대하다. 반대로 우리들은 우매하다.
비행기가 일본 열도를 지난다. 시쳇말로 제팬 패싱ㅡ
그러나 이제 겨우 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아직 샌프란시스코는 6시간도 더 남았으며 지금은 태평양 한가운데이다.
비행기 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다.
남한산성ㅡ
신기하게도 영화를 보면서 당시의 국난에 분개하기보다 원작자의 입심(글심)에 내심 감탄하고 말았다. 그러다 나도 내 글을 되돌아보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봐야겠다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남한산성이 전혀 엉뚱하게 내게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줄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한산성은 버팀의 자리가 아니라 은폐의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바 치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치욕을 안긴 자는 치욕을 받은 자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마침내 임금은 남한산성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재판이라는 합법을 외피로 한 것을 제외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조선은 치욕이지만 청나라는 그것이 곧 합법이었을 것이다.
메모를 하는 지금도 여전히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 어디쯤이다. 깜깜한 밤이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한낮이라면 가물거리는 저 아래 푸른 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 쯤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은 극에 달한다. 얼마를 더 가면 하와이 근처 어디쯤도 지나지 않을까 모르겠다 싶다.
하와이-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으로 내년 가을에 함께 가자던 곳이다. 그러고 보니 아들 내외가 참으로 고맙다. 우리 내외는 그런 멋진 아들 내외를 만나러 태평양을 건너는 중이다
날짜선을 지나자 시간은 다시 거슬러 오후 4시경ㅡ
금요일 저녁 9시에 인천을 출발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요일이다. 지구를 거꾸로 돌고 있다. 그럼 그만큼 젊어진 것일까?
마침내 지루한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 상공에 이르렀다. 우리는 길게 목을 빼고 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쪽은 도시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비행기는 한동안 공중을 선회했다.
착륙허가를 기다리는 중-
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도시는 온통 음울해보였다. 공항은 바닷가에 있었다. 비행기 창으로 내다보이는 바깥풍경은 여전히 도회분위기와는 딴판이었다. 마치 낯선 사막에 당도한 느낌마저 들었다. 비행기가 천천히 승강장을 향해가는 중에 내다보이는 바깥풍경 역시 황량함을 떨치지 못했다. 한쪽으로 짓다만 것인지 짓는 중인지도 불분명한 건물 뼈대가 흉물스러워 보이기조차 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힘센 나라의 모습이라니.
창밖으로 보이는 멀리 야트막한 산에 듬성듬성 집들이 박혀있는 것이 보였다. 인천공항에 익숙한 내겐 도무지 생소해보였다. 그래선지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 이 도시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비행기가 승강장으로 들어서고 승무원이 육중한 문을 열어젖혔다. 마침내 우리는 세상을 나갈 수 있었다. 이제 잠시 후면 짐을 찾고 아들 내외를 만날 것이다
잘 지냈는지, 어디 상한 데는 없는지, 그 동안 힘들지는 않았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새삼스레 들었다. 서서히 기다림의 끝이 다나오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공항 출국장으로 나가면 아들 내외를 만날 것이다. 한 해 동안 보지 못한 아들 내외에게 우리는 처음 무슨 말을 할까? 그저 맹숭한 인사말로는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다 큰 녀석들을 부둥키고 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행기가 움직임을 멈추자 스마트폰이 요동을 쳤다. 아들 녀석이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