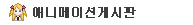현관문 손잡이를 굳게 쥔 손에 땀이 고인다.
잠시 뒤, 자동 도어락이 삐빅 소리를 내며 다시 잠기지만, 그때까지도 내 손은 굳어버리기라도 한 듯 문을 열지 못한다. 마치 석고가 되어버린 듯, 꼼짝하지 못한다. 문을 열어버린 후에 마주할 그 광경을, 차마 두 눈으로 바라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포. 고요한 일상을 뒤덮어버린 검은 베일.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마땅할 내 자취생활을 비극으로 휘저어놓은 잿빛 요동.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음모에 휘말려버린 듯 하다.
솔직히 그 시작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마저 감조차 잡히지 않지만, 그 마수가 수면 위로 고개를 쳐든 시점은, 즉 이 기묘한 역사는 약 한달 전, 개강총회가 있던 3월의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아직 행복했다. 비록 지방대이긴 하지만 재수까지 해서 간신히 얻어낸 대학생활, 그리고 자유의 단맛을 품은 투룸에서의 자취생활, 그 모든것이 상쾌한 시작점에 있었다. 아무것도 그 행복을 막을 수 없었다. 물론, 몇가지 작은 문제점이 있긴 했다. 별건 아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쓰이던 것은 안방(투룸의 그것을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창문에 방범창이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방충망도 없어서, 사실상 창문을 열면 바로 바깥으로 뻥 뚫린 모양이 되어버리는데, 그나마 지상 3층인데다가, 원룸촌의 외곽에 자리한 건물인지라 약 10m 거리에 작은 레스토랑을 포함한, 유동거리가 꽤 되는 상점가가 있는것, 결정적으로 바로 건너편에 마주보는 다른 방이 있기에 도둑이 들 위험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위안이었다. 오히려, 그덕에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월세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던 차였다. 이 창문은 독특한 방식으로 내게 새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는데, 찬 봄비가 내리던 날, 상점가의 레스토랑에서 도망친듯 한, 상당히 큰 달팽이 한마리가 창문 위를 기어가고 있는것을 발견한 것이다. 신기해서 한번 방 안으로 들이고 나니 다시 내다놓기도 뭐해서 집 근처 작은 수족관에서 3000원짜리 플라스틱 어항을 사고, 꽃집에서 부식토까지 사서, 꽤나 그럴듯하게 꾸며주고 그 안에서 키우기로 했다. 작은 방이긴 하지만, 갑자기 혼자 살려니 은근히 외롭기도 해서 애완동물 삼기로 한 것이다. 달팽이를 애완동물 삼다니,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뭐 어떠랴 싶었다.
그래. 여기까진 행복했지.
문제는 얼마 후, 개강총회(를 빙자한 술고문자리)에서 나타났다.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나의 순수한 간을 과량의 에탄올로 괴롭힌 후, 그새를 참지 못하고 분해된 아세트산에 고문받으며, 동아리 선배 한명의 차에 수송되어 집에 온 그날 밤. 그냥 곱게 들어가 사망하면 됐을 것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 앞 편의점에 들러 인스턴트 북엇국 하나를 사서 들어왔다.
내 기억은 거기까지.
다음날 아침 늦게 눈을 뜬 나는, 솔직히 조금 놀랐다.
전날의 기억은 거의 기억에 남질 않았지만, 말끔히 씻고 옷은 다 벗어서 정리해 두었으며 심지어 북엇국까지 끓여서 아침상도 차려놓은 채로 침대에 곱게 누워 자고 있던 자신을 발견한다면, 누구든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살림의 본능에 놀라고 말겠지. 나의 살뜰함에 감탄하며, 애완 달팽이(아직 이름도 정해주지 않은)에게 분무기로 물을 약간 뿌려준 뒤, 사막처럼 갈라진듯한 식도를 생수로 적시고 깨질듯한 두통에 괴로워하며 약간 식은 북엇국을 한숟갈 떠 먹은 순간.
다시 한번, 내 기억은 거기까지.
그날 저녁 눈을 뜬 나는, 공포에 떨었다.
처음엔 과다한 알코올에 사리분별을 잊은 어느 자취생이 창조해버린 핵폐기물인줄로만 알았다. 허나, 진실은 조금 더 막나가는 듯 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나의 내면을 괴롭게 하는 모든 번뇌를 맑은 물에 쏟아버린 뒤, 비로소 이성적 판단력을 갖춘 나는, 분명히 아침상과는 구성요소가 다른, 어디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겠느냐는 듯한 저녁상을 마주하였고, 척수로부터 솟아나는 공포심은 안방의 무방비인 창문을 떠올렸다.
누군가 있다.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
그대로, 잠들지 못한 채 나는 주말을 극단적 공포에 내몰려 달팽이가 든 어항을 끌어안고 벌벌 떨며 20년같은 이틀을 보낸 것이다.
그날 이후, 놈은 몇번 더 나의 목숨을 위협해왔다. 심지어 암살에 쓰인 식재료는 대여해 온 냉장고 안에서 빼내 씀으로써, 나의 물리적 목숨과 재정적 생명까지를 한번에 노리는 악랄함까지 보여줬다. 두려움에 몸서리치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황당해 보이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성토하지 못한 나는, 서서히 말라죽어가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한달만에 건물 주인 아저씨네 딸을 포함해(그리고 나의 월세는 0원이 되었다.) 2개의 과외를 맡게 되어, 패닉과 안도의 경계선상을 아슬아슬하게 휘청이는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고3인 건물주네 아가씨의 과외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열기 위해 나의 모든 용기를 짜내고 있는 것이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그 질문만을 받아준 터라 평소보다 일찍 끝난지라, 평소의 배 이상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후우..."
깊게 심호흡을 하고, 결심을 다지며,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친 순간.
나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장면을 마주하였다.
여자. 필시 20살정도 되었을 어린-혹은 젊은- 여자. 눈길을 끄는 엷은 갈색-아니, 금발에 가까운, 가슴께에 찰랑이는 머리칼-을 가진 여자가-
밥을 하고 있다.
-저여자구나.
그간 내 목숨을 노려왔던 사람이 저여자구나, 라고 느끼며-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고 다시 나가버린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도무지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 환각이다. 착시일 뿐이야. 그동안 극한으로 몰린 나의 두뇌가 착란을 일으킨 것일 뿐이야- 라며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여자가 한복을 입고 앉아있다.
아니, 한복도 그냥 한복이 아니다. 마치 전통혼례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복장. 심지어 머리는 비녀로 쪽지고, 살포시 숙인 얼굴의 양 볼에는 연지곤지까지 찍어 놓았다. 다시보니, 얼굴 윤곽은 분명 한국인이, 아니 동양인이 아니다. 금발에 가까운 머리를 조합해보면, 분명한 서양인. 이쯤되면,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도무지 뭐라 할지, 말을 잃어버린 나를 향해, 그 여자, 아니 소녀는 고개를 들고 푸른 눈을 빛내며 살짝 미소를 짓더니,
"오셨습니까, 서방님."
이란다.
그렇게, 내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마땅한 자취생활은,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00화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