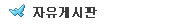신료들이 물러간 저녁나절에 임금은 때때로 나루를 불러들였다. 수라간 상궁이 씻기고 입혔고, 김상헌이 마루로 데리고 오라갔다. 계집아이는 입술이 붉고 눈이 맑았다. 아이는 추위 속에서 영글어가는 열매처럼 보였다.
- 편히 앉아라.
임금이 곶감을 내렸다. 아이는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 곱구나. 몇 살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상헌이 말했다.
- 열 살이라 하옵니다.
마루가 어두워질 때까지 임금은 아이를 앉혀놓고 들여다보았다. 김상헌은 백성의 자식을 글 읽듯이 들여다보는 임금의 모습에 목이 메었다. 임금이 물었다.
- 아이의 아비는 찾았는가?
송파나루에서 언 강을 건네주고 돌아서던 사공의 가는 목이 김상헌의 눈앞에 떠올랐다.
- 성 안에는 없는 듯하옵니다.
- 이 아이의 아비가 얼음 위로 길을 인도해준 사공이 틀림없는가?
- 밤에 강을 건너실 때 나루터 마을에 사공이 한 명뿐이었으니, 아마도 그 사공일 것이옵니다.
송파에서 강을 건널 때, 어둠 속을 휘몰아 오던 눈보라와 얼음 위에 주저앉아서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지 못하던 말들을 임금은 돌이켰다.
- 영리해 뵈는구나. 네가 다 자란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 전하의 백성들이 스스로 고우니 종사의 흥복이옵니다. 고운 백성들과 더불어 회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눈이 녹고 언 강이 풀려서 물은 흐를 것이옵니다. 신은 그 분명한 것을 믿사옵니다, 전하.
임금의 눈꺼풀이 떨렸다.
- 저 아이를 보니 그렇겠구나 싶다.
임금이 아이에게 물었다.
- 아비가 사공이니 물가에서 자랐겠구나, 송파강에는 물고기가 많으냐? 무슨 고기가 잡히는고?
아이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 쏘가리, 배가사리, 어름치, 꺽지........
임금이 웃었다. 성 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임금은 소리 없이 표정만으로 웃었다. 임금의 눈이 먼 곳을 보듯 가늘어졌다.
- 아하, 그러냐. 그게 다 생선 이름이구나. 이름이 어여쁘다. 꺽지란 무슨 생선이냐?
아이가 팔을 뻗어 생선의 길이를 가늠해 보였고, 입 속으로 뭐라고 종알거렸다. 아이의 말은 임금에게 들리지 않았다.
- 강 가장자리 쪽에서 사는 생선인데, 꼬리가 둥글고 아가미가 무지개 빛이라 하옵니다.
임금이 또 웃었다.
- 아하, 그렇구나, 맛은 어떠하냐?
아이가 또 뭐라고 종알거렸다. 김상헌이 아이의 말을 임금에게 전했다.
- 아하, 그러냐. 너는 열 살이니 먹어도 되겠구나.
임금이 아이를 가까이 불러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김상헌은 뜨거워지는 눈을 옆으로 돌렸다.
임금이 아이에게 물었다.
- 송파강은 언제 녹느냐?
- 봄에......, 민들레꽃 필 때......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스며 나왔다.
- 전하, 이제 안으로 드시옵소서.
행궁 굴뚝에서 저녁연기가 퍼졌다. 수라간 상궁이 닭다리 두 개를 간장에 졸였다. 상궁이 저녁상을 안으로 들였다. 번을 교대하는 군병들은 행궁 뒷담을 돌아서 서장대로 올라갔다. 산길이 미끄러워 군병들은 나무에 매어 놓은 줄을 잡고 올라갔다. (소설 남한산성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