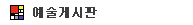| 분류 | 게시판 |
| 베스트 |
|
| 유머 |
|
| 이야기 |
|
| 이슈 |
|
| 생활 |
|
| 취미 |
|
| 학술 |
|
| 방송연예 |
|
| 방송프로그램 |
|
| 디지털 |
|
| 스포츠 |
|
| 야구팀 |
|
| 게임1 |
|
| 게임2 |
|
| 기타 |
|
| 운영 |
|
| 임시게시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