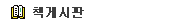욕조 수도꼭지를 왼쪽 끝으로 밀어놓고 당신과 대화를 이어가는 일.
사실 뜨거울 물이 식어버릴걸 아니까. 왼쪽 끝으로 밀어논 셈이다.
오늘 정오엔 누추한 집에 어울리지 않는 고양이발이 달린 작은 욕조에 물을 담았다.
흰색, 짙은 파랑, 엷은 분홍색이 섞인 야들야들한 체크파자마와 보풀이 가득해도 부드러운 카키색 반팔티를 벗고
아이보리색 작은 대야로 흰 욕조에 담긴 물을 몸에 준다. 그새 미지근해진 물도 괜찮다.
욕조에 앉아서 당신에게 읽어준 시를 다시 읽는 일. 머리를 흠뻑 적시는 일.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담는 일.
오래 앉아서 그런 시간을 보낸다. 십년도 전엔 머리 끝까지 물에 담그고 따뜻한 욕조 속에서
엄마의 뱃속을 그리워했었다. 괜히 그러고 싶은 시절이 있었다.
젖은 손으로 사진기 셔터를 누르며 그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담아보기도 하며.. 순간을 남겨놓고 싶은 때가 있었다.
천천히 골고루 목욕을 끝내고 젖은 몸으로 할머니와 마주보는 일은 민망하다.
등을 돌리고 '으어-' 소리내면서 방으로 들어와서 빨간색 체크파자마와
회색바탕에 네이비 줄이 촘촘하게 들어간 목이 늘어난 긴팔 티를 입는다.
욕실 문을 빼꼼 열어보면 아까의 정리한다고 해놨는데도 머리카락이며 거품이며 잘라낸 수염들이
여기저기 묻어있다. 물이 잘 안빠지는 욕조를 몸을 닦던 바디워시로 닦아낸다.
목욕탕을 어릴때부터 잘 가지 않고 집에서 한다. 여행을 다녀도 거의 샤워만 하는 편이다. 오래된 습관이다.
젖은 긴 머리를 풀어두고 말리는 일. 아마 거실 바닥에 우수수 떨어질 머리칼들은 내가 치워야하리라.
매트위에서 몸을 구부렸다가 폈다를 반복하며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듣는다.
몇번이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솔직히 좀 지겹지만 '아-' '정말요?' '그래서요?' 맞장구치며 몸을 굽히고 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할머니의 삶을 떠올린다.
당신과의 삶을 그려본다. 몸을 굽히고 편다.
당신도 아침에 몸을 움직이며 나를 그려보고 있을까? 확실히 그럴테지.
면허가 없는 나는 자주 스쿠터를 탔지만 사고 이 후에 타지 않는다.
무서워서라기보단 조각난 스쿠터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하늘색의 작은 스쿠터였다. 원래 50cc이지만 살짝 75cc의 엔진으로 튜닝한 작은 베스파.
그런 것을 생각하며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과 마트에 갔다.
주말에 아이들에게 먹일 것과 월요일에 집에 올 세 명의 가족에게 먹일 전골재료를 사러 온 거다.
종이에 써온 목록을 들고 하나하나 연필로 지울때마다 카트는 무거워진다.
매끄러운 마트의 바닥을 밟으며 네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나온 것을 반성한다.
설마 기다리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종이에 적힌 것을 바삐담는다.
양손 무겁게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거실에 앉아 할머니의 부어오른 무릎을 만져본다.
퇴행성관절염. 팔십칠세의 노인치고는 매우 건강한 몸.
소녀의 눈을 하고 앉아서 '고통없이 죽었으면..' '벽에 똥칠하지 않고 죽었으면..' 바라는 할머니가 귀엽고 가엾다.
-수술을 하는게 어때요?- 물으면 -얼마나 더 산다고 괜찮다.-
수술받을 때 고통을 무서워하는 걸 안다.
자식들과 병원을 오가며 고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도.
저녁을 간단하게 해먹고 일찍 잠을 잤다.
얼마나 단 잠인지 설명할 수 없어서 잊혀진 꿈은 깨어도 꿈 하다.
흰 문을 열고 나가면 흰 거실에 아빠가 앉아있다.
거실 시계는 새벽 1시 20분정도를 가르키고 있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며 노트북에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드는 아빠의 등에
말들을 던진다. 그러다 새벽 3시가 금방 지났다.
아빠 옆에 낮에 목욕하며 읽던 시집이 놓여있다.
아빠는 등 돌린 채로. 오른손으로 책을 집으며 -이거 재밌네. 옛날 말들의 정취가 느껴진다. 재밌더구나.- 한다.
시인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약간은 잰척을 흘리며..
-이 시도 좋아요.- 페이지를 펴서 들려준다. 눈으로 읽는 아빠의 뒤에서
내 거칠고 힘없는 목소리로. 도톰한 입술을 벌려 시를 뱉는다.
읽다가 -아 아빠가 읽어요.- 한다.
아빠는 군말없이 바로 소리내어 이어서 읽는다.
나같은 것과는 비교 못할 그런 울림을 내며 시를 읽는다.
시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그런 낭송이다.
그리고 짧게 그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한다.
아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리내어 읽는다.
나는 소리내 읽기 힘든 시를 아빠는 끝까지 잘도 읽어낸다.
갈매나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하고 나자.
이번엔 아빠가 읽은 페이지를 펴더니. -여승. 이것도 좋더라.- 한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준다. 약간의 자신감을 담은 목소리가 점점 나긋나긋해진다.
좋은사람을 알게 됐다고 내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주던 이야기를 내가 하나하나 꺼내놓을 때 마다.
자세를 고쳐가며 들어준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한다.
-그냥 지지해달라고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한다. 내가 늘 바라던 것은 그냥 지지해주는 것이였다.
늘 말없이 지지해주던 아빠였으니까. 그래줄거라 믿는다. 믿어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산으로 갔다.
신과 종교 한국교회. 세계사라는 잘 쓰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기를 꺼내들고
한참을 조곤조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한다.
그리고 혼자 옥상에 잠시 올라가서 검은 하늘을 보며 새삼 떠오른다.
'아, 내가 바벨탑이구나.'
그런 얘기를 이어서 나눈다.
이런 말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적는다.
떨리는 손끝으로 너를 사랑한다 적기 위해 오늘들을 살고싶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