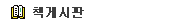집에 피아노가 없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집안 곳곳을 옮겨다니던 피아노가 집을 나갔다.
깊은 검정색을 입힌 피아노가 사라진 건 왜 일까.
학교를 다녀와서 현관에 있는 작은 고리에 실내화 주머니를 걸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놔야지.' 생각할 때에 거실 벽 코너로 빼꼼 보이는 피아노가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자주 가구를 옮기는 타입.
언젠가는 두개의 침대를 한방에 밀어넣는 일을 혼자 해놓기도 했고
빼곡한 책장을 거실에서 안방 또 작은방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그날의 타겟은 피아노였던 셈이다.
바닥이 쓸리지 말라고 수건을 고이 접어서 도톰히 깔아놓고 앙닫은 그 작은 입.
신발을 가지런히 벗지를 못하고 가방도 던져놓고 작은 힘을 보탰다.
집안을 떠다니던 음표들이 사라진 건 언제부터일까.
엄마와 형이 피아노를 치다가 "도대체가 그렇게밖에 안돼?!" 소리치며
묵직한 수동카메라를 집어던져 유리로 된 큰 문이 와장창소리를 낸 날이었을까.
아, 그 파편들을 울먹이며 자신의 힘으로 모아 담아야 하는 수치심을 나는 모른다.
아니다. 그때 나는 아주 어렸고 형도 그랬으니까. 그때가 아니다.
엄마는 형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때론 소리치고 가끔은 손이 올라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닥에 누워서 손에 쥔 플라스틱 인형들을 춤추게하는
음표들이 멈춘 것이 아쉬웠고 형이 불쌍했고 엄마가 무서웠다.
나는 걸을 때마다 두가지의 빛이 세어나오는 운동화를 신고 동네 이곳저곳을 쏘다녔다.
그편이 아름다운 선율보다 눈부셨다. 집 뒤로는 깊은 숲이 있었다.
아낙네들은 고무 다라이에 빨래를 담고, 투박하게 깎인 나무방망이를 들고 숲 속 개울가로 모였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치마를 움켜쥐고 모아올려서 허벅지 사이에 끼운 채 방망이질을 해댔다.
나는 개울 물을 따라 비누거품을 따라 북쪽 하류로 걸어갔다.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려진 굴로 물은 흘러들었다.
어둡고 스산한 그 굴에 "아ㅡ 아ㅡ 아ㅡ" 소리만 쳤을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들어가고 싶기도 했고 들어가고 싶지 않기도 했다.
그저 "아ㅡ 아ㅡ 아ㅡ" 울림을 흘려보냈다.
손으로 풀을 뜯으며 비탈길을 올랐다. 시멘트인지 아스팔트인지 기억이 희미한 길을 따라 집으로 갔다.
때때로 손에는 잠자리, 가재, 봄맞이 풀, 고들빼기, 코스모스..
고양이가 뜯어 먹는다고 '괭이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작고 노란 꽃이 피는 풀들 따위를
꺾어 작은 손에 쥐고 뉘엿뉘엿한 하늘을 아쉬워하며 걸어서 걸어서..
놀며 돌아온 아이에게 내 집 등불은 밝아라.
엄마는 형이 음대에 들어간 것을 결국 볼 수 없었다.
오페라 박쥐 공연은 꽤나 훌륭했었지만 엄마는 공연석에 앉지 못했다.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만 엄마가 느낄 크기엔 비할 기쁨이 못 된다.
과거를 꺼내들고 이리저리 만져보고 닦아보고 윤기가 나게 하는 일은 달달하고 찌르르하다.
순간은 꺼내 닦을 수는 없으니까. 순간은 빈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니까.
승패가(결론이) 없는 복기를 괜히 하게 된다.
엄마의 검정색 피아노를 쓸어주고 싶다.
비가 사선으로 뿌려졌기 때문이고
학교운동장에 흙탕물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우르르쾅으르르- 르르쿠앙- 천둥이 두번 울렸기 때문이고
곧이어 아이들의 꺄르르르 하핫- 하는 소리가 빼꼼 열린 창문으로 투두두둑 섞여 흘러왔기 때문이다.
아니다. 피아노를 어딘가 필요한 곳에 줘버렸기 때문이다.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런 선택을 한 게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으므로 우린 공범인 셈이다.
집에 피아노가 없다.
집에 아무도 없다.
집에 스피커를 창문 밖으로 돌려놓고 음표들이 허공을 떠다니게 하고 싶다.
우리는 한 번도 꽃이 아닌 적이 없다
밝은 밤
잘 보내야지
선물하고 싶은 기분이다 아무거라도 좋으니.
그걸로 때워질 구멍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라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억지로 웃어본다 미소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하니 괜히 으쓱으쓱
입꼬리를 올려보며 창밖 프러시안 블루색 하늘을 올려다본다.
다리에 느껴지는 찬 기운 따가운 기운
호-
호-
호ㅡ
분명 집에 있는데
열쇠 없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 같다
잘 보내야지 잘 보내야지
마음으로 안아야지
흐르는 물로 씻겨줘야지
둥실둥실 흘러가야지
숨길을 걸어 햇살을 받으며 손잡고 길을 걸어야지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이 있기를.
그 생명들
우리 삶을 축복해 주기를.
은총을 온몸으로 받으며 구석구석 마음을 닦으며 가벼운 발걸음을 떼어봐야지
밝은 마음으로 경쾌하게
어려운것도 쉽게
쉬운것은 깊게
깊은것은 유쾌하게!
우리의 생명에 아름다운 빛깔을..
아름다운 향을 가져오기를..
우리의 시간아 우리의 달빛아, 햇살아
모든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축복하소서ㅡ
다시,
우리는 한 번도 꽃이 아닌 적이 없다.
2016.02.12 PM06:26:05 - PM06:33:33
순간을 칠하는 붓이 언제나 사랑이면 좋겠다
너는 내게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네가 얼면 녹이고 울면 같이 울고 눈물 닦은 눈물의 흔적에 입맞춤을.
네가 시들면 나도 시들테요 어차피 시들 운명을 타고난 우리지만 자주 건강해야 해.
얼지 마, 죽지 마. 부활은 우리 몫이 아니니 저만치 밀어놓고 1초,1초,1초 ... 부둥켜안고 안기자
그때에 백만만개의 단어가 쏟아지며 흩날리기를..
모아서 주섬주섬 담지내지 않아도 잠깐, 완벽하기를..
아무도 없다
아니다 있다
있다없다있다있다있다있다설마하니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