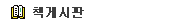즐거운 나의 집
언니가 돌아왔다.
내 쌍둥이 언니는 이 년 전에 집을 나갔다. 그날은 우리의 열세 번째 생일이었다. 내가 그때껏 살아온 십삼 년의 인생을 곱씹는 동안, 언니는 그녀의 십삼 년 하고도 오십삼 초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그 오십삼 초가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언니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나는 남게 되었다.
아직 이른 새벽이었다.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는 중이었다. 평일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교복을 챙겨 입는 것이다. 그다음엔 교복을 입은 채로 아침밥을 먹고 이를 닦는다. 딱히 우리 학교 교복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디자인도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주름이 진 치마는 햄스터를 닮은 연한 회색이고 무릎 아래까지 오는 양말은 젖은 청바지 같은 진한 남색이며 셔츠는 여느 셔츠와 다를 바 없는 흰색이다. 조끼와 스웨터도 남색이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언니가 나타났을 때 나는 치마의 지퍼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치마에서 얼굴을 들었을 때, 언니는 이미 여기 내 앞에 서 있었다는 얘기다. 언니에게 묻고 싶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지만 나는 더 적절한 말, 언니가 예상하지 못할 그런 말을 찾아본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한 후에 나는 입을 연다. “키가 컸네.”
“응. 이제 백육십 센티야.” 언니가 말한다.
“나는 최근에 키를 재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말한다.
“내가 보기에 나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언니가 다시 말한다. “이 센티 정도.”
“원래 동생이 항상 더 큰 법이잖아.” 내가 말한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래.”
“있잖아, 지금 학교에 갈 준비 하는 거야?” 언니가 묻는다.
“응,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가 답한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언니가 말한다. “네 교복 좀 빌려주라. 너 대신 학교에 가보고 싶어.”
나는 몇 초간 입을 다문 채로 언니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본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왜 나 대신 학교에 가고 싶은 건데? 언니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거야? 나는 내 교복이 언니에게 맞을지 고민한다. 언니를 머리부터 발까지 찬찬히 보자니 그녀의 체형이 나와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나처럼 긴 앞머리에, 어깨에 닿는 머리 길이는 나보다 조금 짧을 뿐이다. 우리의 얼굴은 언제나 닮아 있었으니, 얼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가슴이다.
“그런데 내 셔츠가 언니한테 맞을지 모르겠어.” 내가 말한다.
내 두 눈은 언니의 가슴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
내 시선을 따라 언니도 자신의 가슴을 보고 그다음엔 내 가슴을 본다. 갑자기 부끄러운 기분이 든다. 가슴 크기의 차이라든지, 그런 일차적인 게 아닌 무언가 때문이다.
“더 큰 셔츠는 없는 거야?” 언니가 묻는다.
나는 없다고 답한다. 언니는 내 가슴을 보며 계속 곰곰이 생각한다.
“우선 입어보자. 단추가 안 잠기면 위에 뭘 걸쳐도 되니까. 스웨터, 재킷, 조끼, 아무거나.” 언니가 말한다.
그럴듯한 제안이다.
그렇게 나는 셔츠 자락을 치마 안에서 끄집어내고 단추를 푼다. 그동안 언니는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둔다. 언니에게 내 셔츠를 건네자 바로 받아들고는 입기 시작한다. 언니의 티셔츠를 입어야 하는 걸까.
나는 끝내 그걸 입지 않는다.
단추는 다 잠길 수 있었지만, 가슴 부분이 보기 싫게 벌어지고 만다. 그쪽에 달린 단추가 언제든지 셔츠에서 퉁겨져 나올 것 같다. 언니는 셔츠의 벌어진 부분을 내려다본다. 정확히는 벌어진 구멍을 통해 보이는 그녀의 가슴을 말이다. 아주 잠깐, 나는 그 구멍이 블랙홀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것이 언니나 나를 삼켜버렸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우리 둘은 이곳에 계속 서 있을 뿐이다. 둘로 나뉠 수 없는 무언가를 나누려 애를 쓰며.
“조끼를 입어야 할 것 같아.” 언니가 말한다.
언니는 이제 내 치마로 시선을 옮긴다.
나는 치마와 양말을 벗어 언니에게 건넨다. 그리고 조끼를 꺼내기 위해 옷장으로 향한다. 가을옷과 겨울옷이 가득한 서랍을 열고, 그것이 마치 한밤중의 검은 호수인 듯, 그 속에 두 손을 푹 담근다. 스웨터의 부드러운 표면이 나를 위로하고자 내 팔 위를 조심스레 스친다. 위로? 도대체 무엇에 대한 위로인 걸까. 불현듯 몸이 떨린다. 내가 지금 속옷 차림이라는 것을 인식해서가 아니라 어떤 틈의 존재를 알아차려서이다. 여름과 스웨터를 이루는 두꺼운 실 사이의 틈. 언니와 내가 있는 내 방과 아무도 없는 이 집 안의 나머지 공간 사이의 틈. 교복을 입은 언니와 거의 벌거벗은 채인 나 사이의 틈.
“못 찾았어?” 언니가 다가와 묻는다.
“여기 있어.” 내가 말하며 언니에게 조끼를 건넨다.
언니가 조끼를 입는 동안 나는 편안한 옷을 꺼내 입는다. 내가 옷을 다 입기 전에 언니는 이미 조끼를 입고 반바지에 다리를 한쪽씩 끼워 넣는 나를 가만히 본다. 그런 시선을 옆모습으로 느끼며 나는 언니가 조금 전에 바닥에 벗어둔 옷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에서 자신의 옷을 개고 있는 언니를 발견한다. 언니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것의 연약함이 우리의 침묵에 대해, 그리고 틈에 대해 날 미안하게 만든다.
“아침은 먹었어?” 언니가 묻는다. 무릎 위엔 그녀의 옷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다.
“아침 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대답한다. “혹시 배고파?”
“그냥 네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서.” 언니가 말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안 먹는 게 더 낫겠다.”
“뭐 먹고 싶은데?” 내가 묻는다.
“시간 없다고 하지 않았어?” 언니가 말한다.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놓으면 되잖아.” 내가 말한다. “지금도 고등어구이 좋아해?”
언니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기만 한다. 마치 자기가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은 건 언니 자신이라는 듯이. 하지만 곧 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에 나는 슬퍼지고 만다. 그리고 슬픔을 숨기기 위해 언니를 향해 마주 웃는다. 언니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미소를 짓는 게 아니길 바라며.
“나 뭐 잊어버린 거 없지?” 언니가 묻는다.
“책가방 어제 쌌어.” 내가 말한다. “내 자리가 어디라고?”
“교실 딱 가운뎃줄,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왼쪽엔 ‘홍두’라는 멋진 남자애가 앉지.”
“멋지다고 한 적 없는데.” 내가 말한다.
“멋지다고 생각하면 더 두근거리잖아.” 언니가 말한다. “그런데 진짜 안 멋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너, 그 애 좋아하는 거 아니냐?” 언니가 묻는다.
“늦었어.” 내가 말한다. “빨리 학교나 가.”
“내 동생이 사랑에 빠졌다니!” 언니가 놀라워하며 소리친다.
나는 언니가 빨리 집을 나서도록 그녀를 대문 쪽으로 밀어버린다. 왠지 아까보다 언니의 미소가 더 커진 것 같다. 내 얼굴엔 더 열이 오른다.
“나 다녀올게.” 언니가 말한다.
“이상한 짓 하지 마.” 내가 말한다.
“무슨 이상한 짓?” 언니가 묻는다. “내가 그 멋진 남자애한테 뭐라고 할까 봐?”
“그 애한테 쓸데없는 말이라도 했다간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카레 만들어버린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서 바로 그런 말을 한 걸 후회한다.
“네가 만들어 주는 음식이라면 뭐든 좋아.” 언니가 말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는 뒤를 돌아 걸음을 옮긴다. 언니가 돎과 동시에 빙그르르 원을 그리는 교복 치마를 보며 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 다름아닌 나라는 걸 깨닫는다.
언니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치 나에게서 멀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 년 전, 언니가 집을 나간 날, 지금과 똑같은 장면을 보며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그날 나는 언니에게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
“조심히 잘 다녀와!” 나는 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온 힘을 다해 소리친다.
언니가 멀리서 내게 손을 흔든다.
00. 영어로 썼던 단편입니다. 제목은 <Home Sweet Home>이었어요. 대사 후에 따라붙는 “she says”나 “I say”를 어떻게 한국어로 옮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번역 투 같을까 싶네요.
01. 고등학생 때부터 왠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확률상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니까 ‘그래, 그러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입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친구들한테 얘기해줬더니 그건 그러면 쌍둥이가 아니지 않으냐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쌍둥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뜻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ㅠㅠ
02. 이야기에 나오는 ‘홍두’라는 남자애는 제가 두 번째로 쓴 소설에 나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작품들 사이에 겹쳐지는 인물이 생기면 그냥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03. 저는 고등어구이도 좋아하고 카레도 좋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