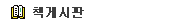그 때 이미 상처로 가득했다고 생각했다. 작은 일 큰 일 나눌 것 없이 모두 상처로 남아 벌건 핏덩이가 가래 끓듯 올라오는 거라고 웃었다. 일부러 더 호탕하게 큰 소리를 내었다. 거기에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던 사람이 그였다. 내가 내민 손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잡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빨 끝까지 보이게 웃던 그 얼굴을 일기장에 그려 넣었다. 그 날 헤어지기 전에 그는 내게 안아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무슨 첫 날부터 안을 수가 있으며, 그걸 또 물어가며 안아야 하는 건지 내심 비웃으며 당혹스러웠다. 사실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일년이 지나도 나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은 크게 변하고 있었다. 약국에서 사온 하얀 막대에 빨간 선 두 개가 그려졌다. 자고 일어나 첫 소변이어야 한다기에 기절했다가 두 시간 만에 일어나 머리가 흔들렸다.
“나 아이 가졌어.”
그는 표정의 변화를 빼면 기뻐했다. 생각을 지우면 좋아할 수 있었을 테지. 우리는 돈이 없었고, 미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낳아 키우고 싶다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그가 부러웠다.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이를 지우기로 결정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에도 바쁜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엄마’라는 단어가 ‘만능’이라는 것처럼 보아 왔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는 지 자신할 수 없었다. 다만 내가 그 때 자신할 수 있었던 건 아무런 현실감 없이 아이를 지울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때 지독한 입덧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저 맨밥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렸다. 그가 바깥바람을 맞고 방 안으로 들어와 나를 껴안으면 겨울비린내로 인한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것은 아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주려던 것이었으나 오히려 내겐 빠른 시일 내에 그 존재감을 지워야겠다는 다짐을 안겨주었다.
“너 비린내 나.”
“어, 정말? 미안. 나 씻고 나올게.”
그것은 아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주려던 것이었으나 오히려 내겐 빠른 시일 내에 그 존재감을 지워야겠다는 다짐을 안겨주었다.
“우리 아이 보러 가자.”
“누가 보면 어떻게 해.”
“조금 멀리 가면 괜찮을 거야. 걱정 돼?”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는 말을 참았다. 그가 날 미워하길 바라지 않는 이기심에 허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고, 어쨌든 얼마나 큰 지 봐야 했다.
함께 산부인과에 들렀다. 아이는 작았다. 빠르게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7주라는 시간은 작은 점으로 내게 나타났다. 그 날 밤에 나는 여자아이를 물 속에 밀어 넣는 꿈을 꾸었다. 그 아이는 작은 손을 애써 내밀고 있었다.
“나, 아이 지울거야.”
그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하지만 곧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우리, 우리 아이야.”
“응. 미안해. 난 키울 자신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그는 한참을 내 품에서 울며 말했다.
“아냐, 아냐.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 때까지도 내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어디선가 물비린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