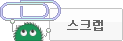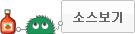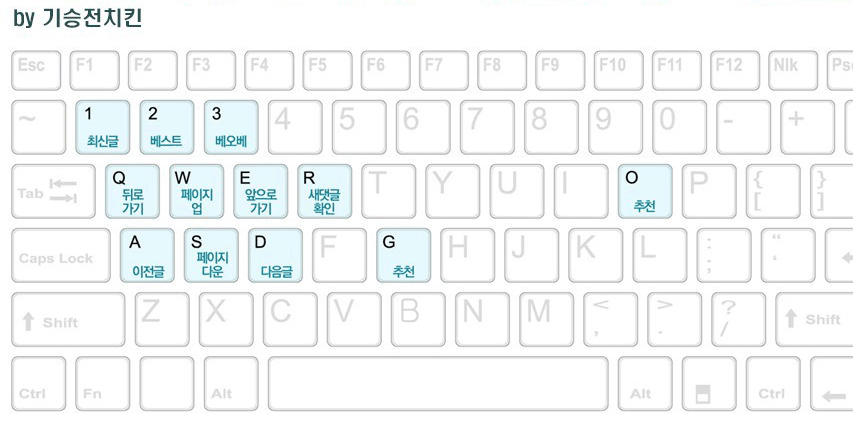주식투자하신분들은 요즘처럼 힘든 나날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ㅡㅜ
들리는 소식은 더 암담하니 이를 어찌할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2769&RIGHT_DEBATE=R0 2008년 9월 18일
가. 미국 경제 상항
미국 정부가 주택보증회사에 2천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데 이어 AIG 보험 회사에 대하여 850억 달러 주식 담보부 대출까지 하기로 했으나, 리먼 파산 등으로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파산 정리절차에 들어간 투자은행 리먼과 기타 부도 위기에 직면한 투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CDS(크레딧 디폴트 스왑)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 유가 급락 및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헤지펀드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대형 금융회사 부도위기직면 사태는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거품이 붕괴되면 대출은행과 보험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데, 미국은 부동산관련 파생상품까지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 당시에 준하는 경제전반에 걸친 거품붕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인들 다수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 모기지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고, 주택가격에 거품이 발생하자, 마치 재산가치가 영원히 증식될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빚을 내어 소비를 한 결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였으나, 주택가격 급락과 주식투자 손실로 남은 것은 ‘빚(부채) 잔치’뿐인 것도 문제다.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결과 시중 자금이 석유 등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헤지 펀드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나, 지난 달 이후 이들 상품가격이 급락함으로써 헤지펀드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석유 등 원자재에 투자했는데,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1998년도 롱텀 펀드와 타이거 펀드와 같은 헤지펀드 파산의 계기가 되었던 일본 엔화 급락과 급등 과정에 미국 주식시장이 초토화 되었던 것처럼 2007년 9월 이후 석유등 원자재 시장에 뛰어든 헤지펀드들도 파산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또 한 차례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우지수 1만선과 코스피 지수 1300선 붕괴는 시간의 문제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사태는 1998년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다우지수 1만 선 붕괴는 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당시보다 파생상품의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충격도 훨씬 클 수밖에 없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일본보다 충격이 클 수 있다.
2008년도 미국은 1990년대 일본과 달리 매월 대규모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재정적자도 GDP의 5배 규모인 약 7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 당시의 시장충격보다 클 수 있다. 금융시장의 규모도 1990년대 일본부동산 및 주식시장거품 붕괴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위기가 초래할 증권시장 충격은 메가톤 급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 펀드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 동반하여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계 투자자들은 코스피지수 1450선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채권시장에서도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언론과 정책 당국은 지난 9월 11일 자로 미국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 만기 도래 금액을 국내 시장금리보다 2.3% 높은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개월 연장한 것을 두고 “‘9월 위기설은 말 그대로 ‘설’로 끝났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나, 9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시장을 강타할 ‘9월 말 이후 위기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스피지수 역시 9월 말 이후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전문가들이 지금까지처럼 호주머니가 텅텅 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가지수 1400선은 진정한 바닥수준이라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증권 정책 당국이 연기금을 동원하여 주가지수 하락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과 내부 환경은 주가지수 1300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한국경제도 9월 말 이후부터 2007년 9월 이후의 미국처럼 본격적으로 숨겨진 악재들이 터질 수 있다. 소득대비 140%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가계 발 한국경제 위기’로 발전할 수 있고, 예금보다 40% 이상 많은 은행대출 때문에 은행이 위기관리에 들어갈 경우, ‘은행 발 한국경제 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고, 금리상승과 환율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건설회사 발 한국경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증시 등 해외 주식투자 손실 및 국내 증시 투자손실이 확대되면서 ‘증권시장 발 한국경제 위기’도 가능하고,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수준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 및 주식투자손실 등으로 재산가치가 급감한 상태에서 대출 금리까지 상승하면 9월 말 이후부터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발 한국경제 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외환시장 발 한국경제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도 미국경제처럼 경제전반에 걸쳐 거품이 지나치게 발생한 상태이고, 국민성 또한 미국의 헤지펀드처럼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도 얼마든지 상기에 열거된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참고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9월 17일자로 '실물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지적재산권자 :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