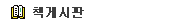음... 뭐라고 홍보해주고 싶지만 저도 등신백일장으로 처음 알게 된 게시판이라 뭐라고 해야 할지...
책 게시판에 놀러 와주세요!
현아는 웃을 수 있음을 감사했다.
어떨 때는 여지없는 불행보다도 불행과 행복 사이의 줄타기가 더 고통스럽기도 했다. 아니, 사실은 현아에게는 '어떤 때'가 아니었다. 막연한 그리고 먼 심경이나 감정이 아니었으니까. 현아에게 그 '어떤 때'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즉 지금이었기에.
지금은 그저 막막했다. 희망의 빛 한 줄기는 심연의 나락보다도 잔인한 법이었고, 그 잔인한 희망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야 성이 찰 듯 달려들더니 갑자기 또 간질였다. 간질이니까 어쩌겠는가, 웃어야지.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다. 웃으면서 울었다. 아니, 차마 울지 못해 삼켰고 삼키니 또 목이 써서 웃었다. 그걸 웃으면서 울었다고 말해야 할지 사실 그녀는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 밝은, 과일 풋내 날 것 같은 웃음이 한 입 깨물면 토할 듯 쓴웃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얄궂을 정도로 몇 없었다.
단 한 입이라도 깨문다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기름이 물에서 떠오르듯 떠오르는, 도출되는 사실은 그 과일 풋내조차 괜히 역겨워질 정도로 얄궂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다. 다만 성현이 그 웃음을 단 한 입이라도 깨물어주길 원했다.
이유는 만연치 않았다. 그녀가 그를 감히 마음에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를 악의 없는 괴로운 나날로 몰아넣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성현이었으므로.
그녀는 자신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자위했다. 그다음은 지나친 요구라며 받아들였다.
성현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아니, 굳이 정정하자면 그 요구를 '듣지조차 못했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현아에게는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실수였지만.
그녀는 화장을 고치듯 웃음을 씻어내고 다시 웃음을 덧그렸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웃음을 덧그렸다. 그 알량한 웃음 언젠가 눈물에 지워지더라도 그것이 지금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았다.
현아는 오늘도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음을 그려낸 웃음 아래로 감사했다.
그걸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지 사실 그녀는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