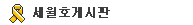지난 토요일(26일), 친구놈 한 개랑 같이 장례식장 봉사 다녀왔습니다.
야간 조가 부족하다고 해서 야간으로 신청했었구요.
야간 조는 9시부터인데 저희는 8시쯤 상록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니 기분 탓인지 공기가 쎄~ 하게 느껴집니다.
역 앞에 임시분향소도 설치되어 있었고,
조문 플래카드도 잔뜩 걸려 있고, 노란 리본도 줄줄이 묶여 있고,
마음이 좀 무거워 지더군요.
병원 장례식장은 역에서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간도 좀 남고해서
가서 누구처럼 밥 먹는다고 퍼질러 앉아 주접떨지 말자고,
근처에서 간단히 요기 좀 하고
8시 40분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좀 긴장이.... 되더군요.
학생들 조문 먼저 하고, 유가족께 인사를 드리는데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조문객들이 꽤 많았는데,
노란 조끼를 입은 안산시 학부모회에서도 여러분 자봉을 나오시고 하셔서
막상 저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치껏 부지런히 신발 정리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남은 그릇도 치우고, 비닐보 갈고
장례식장 바깥에 설치된 흡연소에 재떨이도 비우고,
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그러면서 담배 한 개피도 피우고 -_-)
사람 많아지면 입구에서 빈소 안내도 하고.
그런데
내 살아평생에 아버님들 우시는 모습,
그렇게 많이 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수 천 미터 아래 묻은 자식들 때문이었겠죠.
초로의 남자들이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어깨로 온몸을 꾹꾹 눌러가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먹게 되더군요.
그런 저를 보고 친구 놈은 “지1랄 싸지 말고 상이나 닦아!”
그랬지만요.
여튼 자봉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장례식장이 한산해졌습니다.
잠깐씩 눈을 붙이는 어린 유가족들도 있고,
저희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유가족분들이 저희 신경 써주시는 것도 죄송하고
더 이상 있는 건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원래 야간조 시간은 PM 9~12시였습니다.)
첫 차도 기다릴 겸, 근처 포장마차에 들러 우동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우동을 후루룩 흡입하는데
그제서야 갑자기, 뭔지 모를 서러움에 울음이 왈칵 터졌습니다.
우동을 문 채 갑작스런 눈물을 손등으로 쓱쓱 닦고 있는데
친구 놈이 뒤통수를 갈깁니다. “병신아, 우냐?”
그래서 친구 놈을 쳐다봤더니
이 놈이 시뻘게진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 깐에는 울음 좀 참아보겠다고,
아... 이런 완두콩보다 연약한 세퀴...
시커먼 수컷 두 마리가 마주앉아 질질 짜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소주 일 병 시켰습니다.
눈치 보여서 안주도 아무거나 하나 시키고.
장례식장에서는 건배를 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을 위한 술잔이니까요.
친구 놈이랑 저도 건배 없이 그렇게 한 병씩 마셨습니다.
안주에는 거의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아.. 나란 남자.. ㅜㅠ)
술기운이 달달하게 오르는데
안취한 척 하고 싶은 건지 마음속 슬픔이 점점 더 명징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차를 타고 집에 왔고
“가서 쳐자라.”
“내 꿈꾸고 급체해라.”
할 말은 많았지만 별 말은 없이, 그렇게 친구 놈과 헤어졌습니다.
슬픔에게 슬픔으로 다가가 더 큰 하나의 슬픔이 되는 건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슬픔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비참하리만큼 무능력한 당국,
썩어빠진 재난대처 시스템,
그리고 대통령의 비열한 책임전가,
하지만, 비록 제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
이 슬픔은 분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슬픔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이 정의가 되어
정부당국을 바꾸고 공무원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안일한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6월 4일.
아무 죄 없는 어린 영혼들에게 조문하는 심정으로
지금의 이 흐느끼는 심정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일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쓸데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