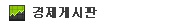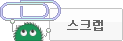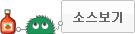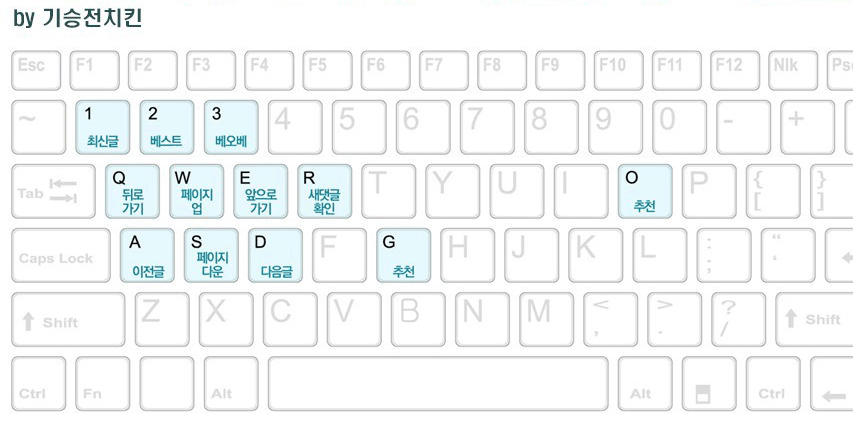사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도 터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조심하면 될 정도인 건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김동원 교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가계부채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가 있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계부채를 보는 정부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계부채가 기업부실보다 훨씬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문제로 보고 싶지 않은 것뿐 입니다.
김남근 변호사=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침체된 내수는 더 침체될 것이고 이 상황이 길어지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겁니다. 금융기관에 몇 백억, 몇 천억 손실을 안겨주는 대기업 부실과 달리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에 그렇게 큰 손실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도 부실화되면 얼마든지 금융기관에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잔액 1400조원
김동원= 3월 말 현재 카드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1,158조원입니다. 여기에 기업대출 중에서 가계대출 성격이 짙은 개인사업자 대출 243조원을 더하면 총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달합니다. 2006년부터 보면 가계소득은 연 평균 5%씩 늘었는데 가계대출은 8.3%씩 증가했습니다. 또 2006년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잔액이 107%였는데 작년엔 135%까지 치솟았어요. 소득보다 빚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빚에 중독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가 넘는 가구를 한계가구라고 부르는데 대략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연 27~29%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200만 명,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250만 명 역시 잠재적 위험군입니다. 중복된 가구를 제외해도 대략 300만 명이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가계부채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김동원= 정부는 가계부실이 은행부실로 이어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큰 위기는 아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가계부채 때문에 공적자금을 넣는 상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계부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2배나 되고요. 실물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부채보다 5배쯤 됩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갚아야 할 빚보다 훨씬 많으니까 도산위험은 없다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게다가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최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부채는 전체의 4.1%에 불과합니다. 대출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있는 소득계층에 집중돼 있는 만큼 못 갚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특히 가계대출의 75%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집값의 5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어떤 점에서 안이하다는 건가요.
김동원= 박근혜정부에서 여섯 차례나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2012년 연 5.17%였던 평균 가계대출금리가 최근엔 연 3.3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3분의1 이상 떨어진 거죠. 이건 사실상 정부가 빚에 대해 보조금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출 연체율도 개선됐는데 그건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져서이지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계가구 비중은 오히려 2012년 12.7%에서 지난해 14.7%로 점점 늘고 있어요. 연구결과를 보면 한계가구의 44%는 빚을 갚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 한계가구와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대출을 합치면 대략 253만명이 519조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 만기 때 원금을 한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 대출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안이하게 봐선 안됩니다.
김남근= 전체 가계대출의 60~70%가 소득이 많은 4~5분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듯 한데 그것도 달리 봐야 합니다. 가계대출 수치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합쳐져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고소득층 비율이 많지만, 주택대출만 따로 떼서 보면 약 40%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빌렸습니다. 이 분들은 경기가 악화되면 상당한 상환부담에 시달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봐야 합니다.
김동원 교수
김동원 교수
안심전환대출 한계가구부터 혜택줬어야
사회= 정부도 요즘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도 그렇고, 소득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일시상환대출 대신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을 의무화한 새로운 가계대출가이드라인도 그렇고요. 효과는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남근= 기존에 이자만 내고 있던 변동금리 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정부가 지난해 선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정책대상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급한 건 잠재위험군인 저소득층 대출인데,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대부분은 소득도 괜찮고 연체도 없는 우량대출자들이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인 대출자들을 우선적으로 안심대출로 갈아타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게다가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은 지금도 여전히 전체 대출의 61%에 달할 만큼 많습니다.
김동원=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은 거의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돼 있는데요.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이거든요. 5월 말 현재 이런 기타대출 잔액은 322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은행 기타대출은 16조원 늘었는데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권에선 51조원이나 늘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3배 이상 높은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빚을 내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겁니다.
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720200706300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파하면서 현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