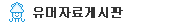나는 어릴적부터 수많은 별명으로 불리웠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빡빡머리 아니면
스포츠머리를 하고 살았다. 간혹 동네 아이들 중에서 머리가
길고 찰랑거리는 아이를 보면 몹시 부러웠고 나도 그렇게 긴 머리를 해보고 싶었지만,
말 한 번 꺼내지 못하고 빡빡이로 살았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20대에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장발을 하고 다녔었다.
잠시 얘기의 방향이 어긋났는데 내 빡빡이 시절 별명은
메주, 고구마, 망치등등이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 부모, 외할머니가
날 그렇게 불렀고 늘 못생긴 녀석이라고 했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정말 못생긴 줄
알고 있었다. 외할매는 왜 날 그렇게 미워했는지 ...
25살이 될 때까지 난 외모에 자신이 없었고 소심했고 소극적이며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했었다.
그래서 당시에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고고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거리에서
야전을 틀고 고고춤을 추는 또래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춤을 추면 마치 원숭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거야 하면서 춤은 배워볼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난 한 번도 춤 춘적이 없고 에어로빅조차 흉내 내본적이 없다.
참 불행한 기억이네.... 내가 그렇게 못 생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성당에 다니면서 해맑다, 부자집아들같다,
그런 말을 들었고 결혼 후에도 외모에 자신이 없다가 어느날 옛 앨범을 꺼내 보다가
깜짝 놀랐다. 옛 사진들을 보니 미청년이 보였다. 나는 미남은 아니지만 결코 추남이
아니었고 호감이 갈만한 외모였었다. 이제 생각하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날 그렇게 못난이 취급하지 않았더라면 난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싶다.
한 번도 나에게 잘 생겼다는 말을 해 주지 않은 아내는 표현을 잘 안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만 내가 못생긴 추남이었다면 애당초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든다.
난 별명으로 많이 불리면서 동네 아이들의 별명도 많이 지어 불렀었다.
본인이 들으면 유쾌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은 재미있어 하는 별명들
초등학교 때 내 별명은 이름과 비슷하다고 서귀포라 불리웠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취미를 가진 담임선생이 붙여준 별명은 “박사” 아마 선생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그 별명을 부르지 않았다. 반에서 늘 1등을 했지만,
기성회비도 못내고 늘 냄새나는 옷을 입은 가난한 아이였기에 그런 별명은
어울리지 않다고 여긴 모양이다.
시간을 많이 건너 뛰어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 별명은 “베짱이” 늘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대서 그랬다. 성당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기타아저씨”라고 불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도 그 성당의 기타아저씨가하고 부모님께 얘기하고 했단다. 또 하나의 별명은 “드럼아저씨”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신앙학교 갔을 때 인솔을 맏았던
보좌신부님이 내가 드럼을 친다는 걸 알고 드럼을 가지고 가자고 제안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아침 기상후 전원 모여서 아침 체조를 할때 드럼을 치고 거기에 맞춰 체조를 했었다
참 이상하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만, 그 당시엔 드럼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물론이고
학원에서 1년 배운 엉성한 드럼실력이었지만, 눈앞에서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 때는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
결혼 하자마자 병이 나서 투석생활을 하던 병원 원목신부님은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을 자는 투석 시간동안 늘 책을 읽고 있는 나에게 “박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지금은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신 그 신부님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100살쯤 되셨을텐데...
그 신부님은 나와 같은 미카엘이었다. 나를 보고 미국식 발음으로 마이클이라고 부르셨는데
참 그립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부터 내 별명은 “아야야아저씨”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사실 인생에 초등학교 졸업후에 지금까지 건강한 적이 없고 늘 아팠는데
우리 아가들 어렸을 때 읽던 동화 중에 그런 제목의 그림동화책이 있었다.
숲속의 동물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해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야야 하고
아픈 동물들이 아저씨에게 치료 받고 나아져서 고마워서 붙인 별명이지만, 내 경우
자주 아파서 나도 모르게 아야아야...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아빠는 아야야 아저씨야 하고 부르던 것이 별명처럼 불렸었다.
이제는 어른이 된 딸들이 그 별명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내가 아프면
장난스럽게 아야야아저씨 또 어디가 아픈가요? 하고 농담하는 아내가 그 기억을 일깨운다.
여러 벗님들은 어떤 사연의 어떤 별명을 가지셨는지 얘기해 봅시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