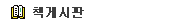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 띠리리리리링
똑같은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따가운 알람소리.
그는 힘겹게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전날에 과음 때문인지 방 안 어딘가에 있을 물병을 찾다
정리가 된 방을 본다.
평소 너저분 했던 방은 어젯밤 술기운에 정리한 탓인지 깨끗했지만
오히려 정리된 이 방이 불편한듯 느끼는것 같았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오히려 술에 취해 있을때 이 곳으로 오기 전 깔끔한 성격으로 돌아가곤 했다.
- 에휴....
곧 그는 화장실로 향했고 천천히 거울 속 이제 좀 적응된 모양새에 나름 만족해 하는듯 하다.
몸에 살이 오르고 검게 그을리긴 했지만 눈, 코, 입은 꼭 소년같이 순수한 수혁.
간단한 세면 후 출근하기 위해 어제 입은 작업 점퍼를 손에 들고 집 현관문을 나선다.
-1화 수혁 -
- 둘, 넷, 여섯 그리고.
똑같은 일상. 종일 주류박스와 씨름하며 땀 먼지로 찌든 수건과 함께다.
일렬로 늘어선 유리병들 그리고 하나같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작업 기계들까지.
매일 특별할거 없이 흘러가는 내 하루와 같다.
이 주류공장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6년. 초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법 일꾼다운 내 모습에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 왜 혼자 웃고 계세요 수혁이형?
같이 다니면 꼭 나와 형제 같다는 말을 듣는 민식이다.
나이는 올해 스물여덟, 내성적이긴 하지만 친해지면
곧 잘 어울릴 줄 아는 동생이다.
함께 꽤 어린나이에 여기까지 버틴 몇 안 되는 직장 동료이며, 하나 밖에 없는 이 동네 유일한 벗,
그리고 잘 따르는 동생이기도 했다.
- 아냐, 왜 무슨 일 있어?
- 네, 형 친구 분이 찾아오셨어요. 형 친구가 있었어요?
평소 농담을 직설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 오해를 많이 사는 동생이기도
하다.
물론 같이 생활해온 탓에 그의 장난을 이해한다.
- 글쎄.
- 아무튼 사무실에 계세요 그분.
누굴까.? 고향에서 내려온 지 6년, 얼굴을 마주 할 순 없었지만 간혹 연락해온 친구들이 몇 있긴 했다.
많이 변한 내 모습을 알아보긴 할까? 갖가지 생각에 금세 사무실 문 앞에
닿았다.
불쑥 누군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해본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가끔 어떤 말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연습하곤 했었다.
그러나 그 연습도 오래가진 못했다. 그래, 당장 내일의 일도 생각 않기로
했으니깐.
- 오랜만이다. 많이 변했는데 지금 너 모습도 나름 어색하지 않아 보기 좋네.
재우다. 내가 이곳에 온지 6년을 제외한 내 인생을 함께 해온 벗.
닮음이 많은 친구, 항상 밝고 누구에게나 웃음을 줄줄 아는,
그리고 6년 전 나에게 닥친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
순간 입술을 왼쪽으로 크게 올릴 뻔 한걸 겨우 참아냈다.
내가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 그리고 재우는 이 버릇을 분명히 알고 있다.
- 그래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 인마, 친구끼리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만나냐,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퇴근 후에 시간 괜찮지?
- 나야 뭐, 곧 퇴근이니깐 이 앞에서 기다려.
겨우 태연스럽게 그와 대면 해냈다.
-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트럭에 주류박스를 싣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항상 마지막
퇴근의 몫은 나 였지만 오늘은 조금 서두르기로 했다.
- 사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놈 하나가 찾아와서
- 너도 친구가 다있구나 그래 서둘러 퇴근해라.
턱을 매만지신다, 기분이 썩 나쁘지 않으실 때 나오는 사장님의 습관,
어두침침한 내게 고향친구가 찾아와줬다는것에 조금은 걱정을 덜었다는 안도의 표시 인듯했다.
-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공장밖엔 재우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재우와 나는 항상 만나기전 반가움의 표시로 저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서로에게.
그저 손을 흔들어 보이기만 했다.
지금의 나는 저 미소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지을 수가 없다 분명히.
- 친구, 간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 그래.
- 요 앞에 보니깐 삼겹살집 보이던데 거기로 갈까? 너 삼겹살 좋아하잖아.
- 아무거나.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불편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치도 못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계절의 변화. 가을이 찾아온 거 같다. 가을 저녁 냄새, 차갑지도 따듯하지도 붉고 높은 가을 하늘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진 내가 좋아하던 계절의 냄새다.
순간 몸이 쭈뼛하면서 오한이 왔다.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거 같다.
그때 그 날도 그랬었다.
재우와 그녀를 만나러 가는 그 때 이 냄새 그리고 높은 가을 하늘…….
아무렇지 않은 척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을 때 어느덧 우리는 동네 허름한 삼겹살집에 도착했다.
고요하고 적막하기 만 한 이 동네 에서 유일하게 북적이는 공간이기도 했다.
- 수혁이 왔구나.
주인집 아저씨다. 출퇴근길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푸근한 인상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차갑게 만 느껴졌다.
- 못 보던 친구도 있네?
- 예. 제 고향 친구 녀석 이예요.
- 그래? 수혁이 너랑은 다르게 훤칠하네. 아주.
- 아니에요~ 수혁인 저보다 훨씬 인기 좋아요.
그만,
- 사장님, 저희 고기 2인분이랑 소주 한 병 부탁드려요.
재우의 입을 막았다. 내 지난과거가 누구의 입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공장점퍼 앞주머니에 담배를 꺼내 건네고 나도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기분이 참 묘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재우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주하기 불편했다.
사람 감정이란 게 참 아이러니 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재우가 입을 먼저 열었다.
- 시간 빠르다 우리가 벌써 서른둘이야.
- 그러게, 다들 여전하지?
- 그렇지 뭐, 너는 괜찮은 거지?
- 그럼~ 나는 이 동네가 좋아.
우리는 지난 세월 지내온 특이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이야기들을
이어 나갔다.
그렇게 서로 취기가 조금 올라왔을 즈음 이었다.
처음부터 단순히 소식을 전하고 보러 온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다.
- 말해봐.
먼저 말을 열었다. 그 편이 재우가 조금은 편할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조금의 생각을 하는듯했다. 곧 눈을 뜨고 테이블에 놓여있는 담배 한 개 피를 입에 물었다.
- 해수. 내일 퇴소야.
왼쪽 입술이 크게 흔들리더니 올라가 버렸다. 재우와 대면한 아까와는 달랐다.
이번엔 제어 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숨이 턱하니 막혀왔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지우고 싶거나 혹은 잊고 싶은 과거가 머리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
또한 안간힘을 써서 떨쳐내려는 것들은 오히려 더 지독하리 만큼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깊게 박혀 버리곤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해수..6년 전 끔찍한 사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을 다시 되뇌고 있을 때 창밖을 보니
거짓말 같이 그 날처럼 가을비가 붉게 내리고 있었다.
- 노력으로 조금씩 써내려갔습니다. 주변지인분들께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가않더라구요 전부 꿀같이 달콤한말로 응원만 해주시니
조금이나 쓴 혹평과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