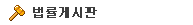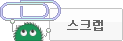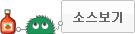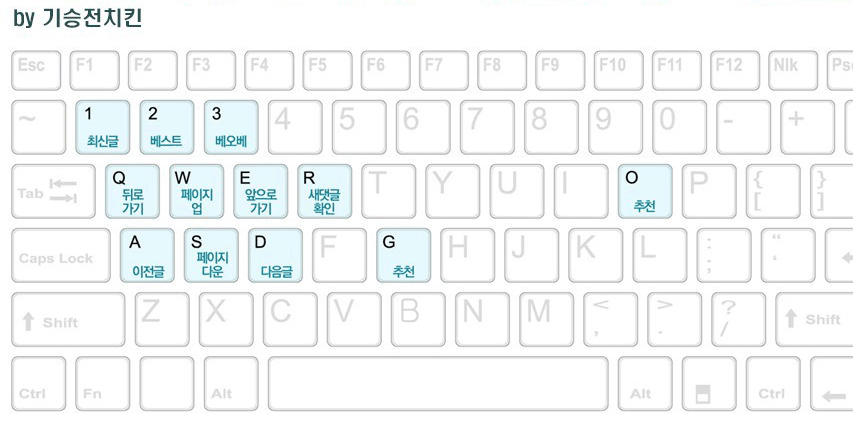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 본인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임을 밝혀둡니다. 각각의 개별사안에 따라 특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일반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포괄임금제 혹은 (포괄)연봉제라고 쓰고, 잔업수당 안주고 무급으로 당당하게 부려먹는 고용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일부(대다수라고 읽는다.) 회사는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제라 연봉안에 퇴직금이랑 기타 수당이 전부 포함이되어 있다, 고로 나갈때 퇴직금도 안주고, 6시 이후에 계속 일해도 수당을 안주겠다. 이 계약서는 노무사의 검토를 받은 합법적인 계약이다......라고 말이죠!!!!
일부는 맞고 다수는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는 (포괄)연봉제에 대한 사안만을 다루기에 퇴직금의 포함여부는 논외로 합니다.
(일단 퇴직금은 중간정산은 가능해도, 급여에 포함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월급에 포함한다고 계약서를 썼더라고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애초에 불법인 계약이기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의 논리는 포괄임금에 기초한 연봉제 계약을 했다는것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 임금에 기포한 연봉제는 무언인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일하는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일하는게 당연히 확정적인 경우(야간 경비를 포함하여 기타 저녁에 장사하는 업무 등)와 회사에서 혹은 관리자들이 저놈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직원의 외근 업무가 주류를 이루는 경우(즉, 사업장을 벗어나서 윗사람 눈에 벗어나 짱박히는 경우가 가능한 업종들 영업 같은 업종) 이것도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계약한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늬가 그 시간에 뭔짓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월급에 일정시간 야근 한다고 퉁치고 이걸로 끝내자.....라고 계약을 맺고, 이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어야 포괄임금제가 성립 가능 합니다.
(가령 이러한 경우에 속하더라도 야근을 4시간 더 할거라 예상이 되고 실재로 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지만, 포괄임금으로 2시간의 수당만을 계약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부분은 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회사 관리자가 일하는 사람과 하루종일 붙어있고,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이고, 나머지 특수한 상황에서 저런 포괄임금제의 적용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물론 회사가 미리 노동청에 신고했을 경우에 한해서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회사가 미리 노동청에 이번주는 우리회사 52시간 더 일 시킬겁니다.~ 라고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52시간이라는 개념은 최대 근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월급 줬으니 우리는 일주일에 52시간 이내에는 다른 잔업수당 안줘도 된다!!!!라는 개념을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 무식한 단위 사업장에서는 당당하게 일주일에 52시간까지는 일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연장근로 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는 괴랄한 논리를 펼치기도 하는데.....그저 답이 없습니다. 싸우기 보다는 그냥 노동청 가서 2010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을 말하며,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으세요)
또한 잔업 수당에 대한 근거는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게 일년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별일 없으면 그냥 계속 지급되는 여러가지 수당이나 상여들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월급보다는 그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볼때 월급을 기준으로 해도 최저 금액은 계산 가능하니 일반적으로 월급에 209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시급의 1.5배를 가산하고(대략 6시 이후 3시간), 이후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보아 시급의 2배를 계산합니다.(중간에 1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근태(출퇴근 기록)은 자신이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을 관리하겠지만, 이것을 근로자나 노동청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없다고 하거나, 분실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자신의 출퇴근 기록은 자신이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로그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해 놓는다던지, 회사메일로 개인 메일에 날마다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출퇴근시 회사 사무실 시간을 카메라로 찍어 놓는다든지 등등의 방법이 필요하면 GPS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옙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1. 윗 사람과(관리자급) 함께 회사에서 근무 한다면 닥치고 6시 이후부터는 잔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서나 기타 취업규칙등에 포괄임금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따라가야하고, 포괄임금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미리 명시한 포괄임금보다 더 많아서 잔업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