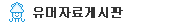고양이다!
두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차마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작은 아기 고양이. 지나가는 사람을 피해 쓰레기 더미 사이를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녀석. 구석에 숨은 녀석을 가만히 바라보니, 녀석도 나를 가만히 바라본다. 내 발 앞에 터져있는 쓰레기봉투가 아쉬운가 보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 자리를 비웠다. 아니 비우는 척 멀찌감치 떨어져 다시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상금 상금, 이란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나와 터져있던 쓰레기봉투를 마저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 든 무언가가 그렇게도 궁금했을까.
며칠 전부터 눈에 들어온 녀석이다. 사는 원룸 건물 옆 쓰레기장에 숨어사는 것 같았다. 저 조그만 녀석은 왜 혼자 저기서 살고 있을까. 문득 얼마 전 건물 앞에 널브러져 있던 고양이 시체가 생각났다. 정확히는 고양이처럼 보이는 시체였다. 어미가 옮기다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혼자 무리에서 이탈하다 그렇게 됐는지... 아마 이 녀석의 가족이 아니었을까. 주차장과 흡연구역 옆에 있는 쓰레기장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가 지나다닌다. 하루에 서너 번씩 담배를 태우러 가면 녀석은 나를 발견하고 후다닥 도망가 숨어버린다. 배고픔에 정신 팔려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참고 참다 도망가는 건지, 아직 어려서 조심성이 없는 건지, 언제나 먼저 도망가서 숨는 일이 없다.
비어있는 냉장고를 조금이라도 채워 볼 생각에 마트에 들렀다. 구석진 곳에 반려동물 제품 코너가 눈에 들어왔다. 반려. ‘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간 재밌는 단어다. 결혼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애완’이라는 단어를 밀어내고 동물 앞에 붙기 시작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기른다거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인권 수준으로 올라왔거나, 둘 다 일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아기 고양이. 녀석에게 간식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두리번 거린 결과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다. 고양이는 인터넷으로 배운 게 전부라 뭘 사줘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문득 사는 곳 건너편 버스정류장 바로 앞, 팻샵이 생각났다.
마트보다 훨씬 작은 팻샵 안에는 마트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 있었다. 사람 먹는 것만큼이나 동물 먹는 것도 다양하구나. 팻샵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니 이것저것 간식을 추천해 주셨다.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지만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다.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해 보이는 것들 몇 개를 집어서 계산했다. 나도 모르게 장난감까지 하나 골랐다. 반응이 궁금해 설레는 만큼 빠른 걸음으로 녀석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여전히 쓰레기 틈을 요리조리 기어 다니고, 뛰어다니며 파리와 놀고 있는 녀석. 가까이 다가가려 하니 구석으로 몸을 숨긴다. 아니, 머리를 숨긴다. 자그마한 엉덩이가 머리는 여기 숨어있다고 세상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간식 봉지를 뜯고 가만히 기다리니 녀석이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 아직도 안 가고 거기 있었냐는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손에든 간식을 조금씩 뜯어 녀석에게 최대한 가까이 던져줬다. 녀석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도망가 머리를 숨겼다. 잠시 뒤, 다시 살금살금 기어 나와 내가 던진 간식에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조그만 입으로 날름 집어삼킨다.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간식을 던져줘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간식을 모두 던져 준 후 허겁지겁 먹는 녀석을 보다 집으로 돌아왔다.
조금은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결국 장난감은 흔들어주지 못했다. 혹시나 공격하는 걸로 오해할까 봐. 아기 고양이. 매일 같은 삶을 반복하던 나에게 내일을 기다리게 만들어 준 녀석. 녀석도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