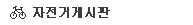건물을 나오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데 나 도와준 아줌마는 보이지를 않는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아줌마 '바이슬라~'(고맙습니다)
중국, 몽골 국경을 넘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베낭 하나 메고 넘었다면 별 고생없이 1시간 30분 정도면 될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데로 가면 된단 말이지?'
이제 막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덩치 큰 아저씨가 나를 보며 뭐라 뭐라 큰 소리로 얘기하며 다가온다.
몽골어는 전혀 모르지만 말투가 사납지는 않고 대충 느낌이 '여~ 너 자전거 타고 어디 가냐? 중국에서 온거야?'하는거 같아서
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몇개 알아온 몽골 단어로 손짓 해가며 얘기했다.
'나 "솔로고스"(한국사람), 나 "울란바트로"(몽골의 수도)로 고고중임' 하니 아저씨가 환하게 웃어주면서 엄지 손가락을 들어 준다.
뭐 계속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알아 듣지는 못하고 아저씨의 환영해 주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다.
'어라, 이거 반응이 괜찮은데. 역시 중국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어'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 사진은 몽골 출입국사무소에서 북쪽으로 3킬로정도 떨어져 있는 '자밍우드' 마을 가는 길.
옆으로 기차가 지나 가는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직선으로 쫘악 다 보였다.
'내가 정말 중국 국경을 넘어 몽골이라는 나라까지 와서 자전거로 달리고 있다니..'하는 생각과 '앞으로 몽골여행에는 어떤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하는 기대감, 그리고 처음 보는 주변 풍경이 나를 너무 신나게 만들었다. 햇볕이 따갑고 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좋았다.
자밍우드 마을은 기차역 앞 광장 앞으로 차들과 사람들이 좀 모여 있을 뿐 포장 된 도로를 따라 동네를 대충 한바퀴 휙 도니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특별히 볼것은 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차들 중에는 한국산 승용차, 승합차들이 많이 보였다.
우선 중국 국경마을에서 만난 낸시 누나가 알려준 대로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돌아 다녀 봤는데 당최 뭐가 뭐하는 건물이고 가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선 겨울의 심한 추위 때문인지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가게 안을 들여다 보고 뭐 파는지 알 수 있는 큰 윈도우가 없고
간판도 영어로된 몇개 빼고는 알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자전거를 묶어두고 낸시 누나가 자밍우드 가서 핸드폰 가게 찾을 때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수첩에 써준 메모를 들고
슈퍼마켓 정도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서 처음 보이는 아가씨한테 말을 걸어 보았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도 아가씨의 큰 가슴에 눈이 가서 순간 흠칫했다. 청으로 된 핫팬츠에 위에는 가슴 반 정도까지 올라오고 얇은 어깨끈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몸은 서양인처럼 발육이 좋았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저런 과감한 옷차림의 아가씨를 만나다니 좀 놀라웠다.
어쨋든 수첩의 메모를 보여 줬다. 대충 '저리로 가' 할 줄 알았는데 나보고 따라 오라는 손짓을 하더니 걸어 걸어서 핸드폰 가게까지 안내 해 준다.
고맙다고 인사하니 별 말없이 웃어주고 돌아갔다.
위 사진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구석 작은 가게에 유니폼 입은 여직원이 혼자 앉아 있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내가 내 스마튼 폰을 보여 주면서 통화 하고 싶다는 시늉을 하지만 의사 전달이 되지를 않는다.
자기 전화 번호라며 낸시 누나가 수첩에 써준 전화번호를 보여주며 전화해 달라고 해서 전화는 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는다.
울란바트로 본가 전화번호라고 적어준 전화 번호도 있었지만 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게를 나왔다.
위 사진은 자밍우드 기차역 건물.
전화 개통해서 낸시 누나한테 전화한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했지만 시도는 해 보았지만 안된거니 어쩔 수 없고
시간이 벌써 오후 3시가 넘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가야할 길을 빨리 가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물을 더 사기 위해 자전거 세워둔 곳에서 가까운 슈퍼로 들어가 봤다.
음료수만 있고 물은 보이지가 않아 아줌마에게 "오쓰? 오쓰?"(물) 말하니 없다고 한다.
'왜 없지?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던것 처럼 몽골도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선 생수는 취급을 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대신 환타 오렌지맛 1리터짜리 1,500투그릭(1,200원 정도), 사과맛 2리터짜리 2,200투그릭(1,800원 정도) 주고 샀다.
몽골와서 처음 물건을 사 보니 '우리나라 보다 조금 싸구나' 하는 느낌으로 몽골의 물가가 다가왔다.
마을을 거의 벗어나면서 큰 트럭들이 몇대 서 있는 곳을 지나다가 외국인 젊은이 2명을 만났다. 한달 동안 중국 여행하면서 외국인은 한번도
못 본것 같은데 이런곳에서 보게 되다니 신기했다. 걔네도 자전거 여행자를 보니 신기해 하는거 같았다.
안녕? 너네 어디가니?
응 안녕. 우리는 울란바트로 가. 너는?
응. 울란바트로. 너네 어디서 왔어?
이스라엘. 너는?
난 한국. 여기서 뭐하고 있어?
우리는 울란바트로 가는 트럭을 찾고 있어.
아, 행운을 빌게.
그래 너도. 또 보자.
너무 간단한 대화 였지만 내가 외국인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여행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한게 조금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역시 서툴러서 굳럭!(good luck)할때 버벅거리며 "구트럭"이라고 해버렸다. 그냥 '굴럭'하면 되는데..
위 사진은 자밍우드 마을을 출발해 30분 정도 가다가 뒤 돌아서 찍은 사진.
마을을 조금 벗어 나자 포장되어 있던 도로가 흙에 덮여 있는 것처럼 살짝 살짝 있다가 없다가 하더니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다.
차들 바퀴자국을 따라 비포장 길을 계속 가도 도로가 보이지를 않는다. 계속 두리번 거리다가 저 멀리 승용차 한대가 빠르게지나가는게 보여
그 쪽에 도로가 있나보다 하고 가보니 그냥 다른 흙길이었다. 차가 많이 다녀서 다져진 괜찮은 길을 골라 가며 계속 가는데 어느 순간 많은 길들이
전봇대를 따라 모여들었다. 그리고도 한참을 더 가다가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지들이 꼴리는 대로 이쪽길로 저쪽길로 다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도로가 없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몽골이 발전이 많이는 안된 나라인걸 얼핏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도에도 나오는 국경 마을에서 이 나라 수도로 가는 도로가 없을 줄이야.
'그럼 내가 구글 지도에서 본 길은 무슨 길이지? 철길이었나?'
나는 예전에 텔레비젼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자전거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여기도 도로는 있는데 모래 바람 좀 불고 바람에 날려온 모래들이 일부 일부 좀 쌓여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는 쌩다지 맨땅이었다.
사실 나는 알아보지도 않고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타클라마칸 사막이 여기 근처 어디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큰 걱정이 안 되는게 앞에 갈 길이 길게 쭉 보이고 흙길이라 속도는 느리지만 페달 밟는 대로 바퀴는 굴러가니 갈만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경이로운 이곳의 경치에 현실감을 약간 잃은 상태. 감기약 먹은 거 같은 약간 멍한 느낌..
계속 '저 멀리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20킬로, 30킬로..?' 이런 생각을 했다.
멀리 멀리 몽골 유목민의 전통 이동식 집인 '게르'들과 가축들도 군데 군데 보였다.
사진 좀 찍고 있는데 큰 트럭이 근처에 멈추더니 운전사하고 아까 그 이슬라엘 청년 두명이 내려 이리 저리 차를 살펴본다.
'어디 고장 났나?' 나를 혹시 부를래나 했는데 차 뒷편으로 가더니 보이지를 않는다.
계속 가다 보니 죽은지 오래된 말이 보였다. 뼈에 가죽이 말라 붙어 있었는데 더럽거나 무섭기 보다 그저 신기해서 살펴봤다.
근처에 대가리만 있는 것도 있었는데 아직 먹을게 남아 있는지 풍뎅이 비슷하게 생긴 큰 벌레 몇마리가 속에서 꾸물 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한마리는 콧구멍 사이로 기어 나오고..
기념으로 죽은 말 옆에서 사진 한장 찍고..
자전거도 세워 놓고 한장.
빵구다. 뭐에 찔렸나 살펴보니 저렇게 타이어에 가시가 박혀 있었다.
인터넷에서 저 가시 때문에 빵구 많이 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는 내 차롄가 보다. 금방 때우기는 했는데 역시 힘빠진다.
앞으로 갈길이 먼데 저런 가시가 널려있을 비포장 길을 계속 가야하니 걱정이 됐다. 최대한 차들이 많이 다닌 길만 따라 가야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작은 도마뱀이 옆으로 후다닥 도망치곤 했는데 100미터에 한마리는 보일 정도로 많았고
차에 깔려 죽은 놈들도 몇마리 있었다.
어찌나 빨리 도망가는지 사진 찍으려고 몇번 시도 하다가 한마리가 잠깐 멈춰 있는 동안 카메라 줌으로 땡겨서 찍었다.
저녁 8시 30분 정도. 그림자도 길게 늘어 지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오면서 몇번을 뒤돌아 봐도 보이던 자밍우드가 더이상 보이지를 않는다.
더 늦기 전에 텐트치고 잘 곳을 찾아 보는데 마땅한 곳이 없다. 여기는 차들이 따로 길이 없이 막 돌아 다니기 때문에 주의 해서 텐트를 쳐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좀 움푹 들어간 지형을 찾아야 했다.